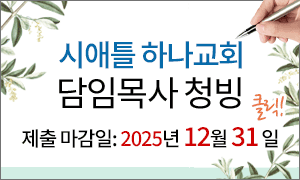"지난 생애를 돌아보면 내 처음 신앙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다. 내가 어딜 가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이걸 알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붙드는 신앙은 '주님의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사실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 그것이 바로 나와 우리 모두의 사명일 것이다."
기독교인이자 철학자인 김형석 명예교수(연세대)는 9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에 힘이 있었다.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신념과 확신이 말에 묻어났기 때문이다. 머리가 아닌 가슴,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전달되는 그의 신앙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재)여해와함께'가 주최하고 경동교회(담임 채수일 목사)와 크리스챤아카데미가 주관한 평신도포럼이 '지성적 신앙과 일상의 성화'를 주제로 8일 밤 서울 경동교회에서, 김형석 교수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노학자의 신앙과 일평생 철학을 탐구하며 그가 간파한 기독교 진리를 듣고자 많은 이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 사회는 역시 기독교인이자 철학자인 강영안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날 김형석 교수가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연한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누군가 당신에게 '까뮈'에 대해 묻는다면...
"기독교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교회에 나가는 이를 두고 흔히 기독교인이라 부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런 이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럼 누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다름 아닌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즉 그 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이는 엄밀히 말해 기독교인이 아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의 진리를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기독교인의 인생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진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예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닌 교리로 받아들인 자다. 중세 가톨릭이 그랬다. 진리보다 교리를 더 소중히 여겼다. 교리는, 가령 교단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즉 '진리로 더 가까이 다가가자'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교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것이 교권을 낳는다. 그러나 예수는 교권보다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십계명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것이다. 예수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계명과 율법이 신앙의 목적이 아님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달리 말해 '교리를 위한 신앙은 없다'는 것이다.
예수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교회)을 짓고 율법(교리)을 만들어 그 속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대형교회가 생기면서 다시 교회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 교회가 크면 그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를 위해 하는 기도는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회는 오히려 힘을 잃어가고 있다. 예를 하나 들겠다. 어느 대학교에 목사님 몇 분이 초청돼 강연한 적이 있다. 그러던 중 어느 학생이 질문을 던졌다. 까뮈나 사르트르 같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매우 진지하게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목사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 끝내 답하지 못했다. 까뮈와 사르트르를 몰랐던 것이다. 단면일 수도 있으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다.
질문을 던졌던 그 학생은 이제 누구를 찾을까? 목사에게 다시 갈까? 아니다. 교수나 철학자, 작가에게 답을 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교회에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기독교의 진리를 탐구하고 그 역사적 사명에 목마른 자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내 옛날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고 싶다. 6.25 전쟁이 일어나 부산으로 피난을 갔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어느 교회 앞을 지나다 그곳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총회를 지켜봤다. 한참 후 총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모였던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서 교권을 두고 다툼이 일어난 걸 목격했다. 차마 더는 지켜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 현장을 빠져 나왔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다니...' 실망이 컸다. 그런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순간 귓가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그 때 번뜩하는 깨달음이 왔다.
'아, 교회가 죽은 자들 장사 지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교회가 크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자기 인생과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너무 좁게 살지 않았나, 반성해 본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이젠 예수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 때다.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내가 동시에 이 역사 또한 변화시켜야 할 자라는 사명감과 책임감, 이것을 상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