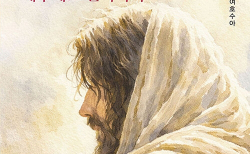지난 9월 열렸던 예장 합동 제100회 총회에서는, 교회 강단에 십자가 부착을 금지한 과거 총회 결의를 재확인했다. 합동측은 이 같은 결의를 지난 1957년 제42회 총회에서 했고, 이번 총회 전에도 재론한 적은 있지만 번복한 적은 없다. 이는 십자가를 '우상'(偶像)화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총신대 김길성 교수(조직신학)는 "개신교 전반이 구교, 즉 로마가톨릭이 갖고 있는 것들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강단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게 좋다는 견해들이 있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과거 공의회에서 일종의 '성상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아이콘'이라고도 하는 성상, 곧 예수님이나 성자들의 얼굴을 새긴 조각 등을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며 "강단에 십자가를 부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마 십자가에 담긴 신앙적 의미 이상으로 그것을 성상화하거나 그 외 다른 조각들이 따라서 들어 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십자가는 기독교만의 상징이고, 따라서 교회 첨탑 등에 십자가를 단 것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알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구 교수(합동신대 조직신학)는 이번 결정에 대해 "종교개혁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종교개혁 당시 개혁교회들이 예배당 내 십자가상을 포함해 로마가톨릭의 '가시적' 상징들을 모두 없앴다고 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 어떤 형상화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 그는 "따라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개혁주의 교회라면, 예배당에 십자가상 등을 부착해선 안 될 것"이라며 "10월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달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했으면 한다"고 했다.

신현수 교수(평택대 조직신학)도 "목회자 등 성숙한 신앙인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마치 십자가상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실제 종교개혁 이후에도 성상을 파괴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이는 꼭 강단 위 십자가만이 아니라 관련 용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위험성 때문에 부착 자체를 금하는 것은 자칫 반문화적이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칼빈의 개혁주의 전통은 반문화가 아닌,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변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본철 교수(성결대 역사신학)는 "결의 배경을 자세히 알지 못해 함부로 단언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말해 종교개혁 당시에도 '어디까지가 우상인가'를 두고 여러 견해들이 있었다"며 "우상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배 교수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당시에는 십자가상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날 십자가는 우상의 개념보다는 은총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