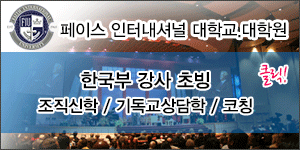한해의 마지막 날, 송년회 자리는 그리 즐겁지 않았다. 불판 주위로 둘러앉은 친구들은 벌써부터 "몸이 20대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술이 한 순배 돌자 불콰해진 친구들 사이에선 슬금슬금 시국 이야기도 흘러나왔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괴악한 노동조건의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하는 친구도 있었고, 일찌감치 자영업에 뛰어들어 "우린 이제 간신히 사원인데 너는 벌써 사장님"이란 부러움 섞인 놀림에 시달리다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속사정을 털어놓고 만 친구도 있었다.
건강, 연예, 취업, 생업, 경제, 정치, 사회,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분위기는 축축 처지는 방향으로만 흘러갔다. 서른의 밤이 그렇게 피폐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언뜻 1970년대 살기 빡빡했던 시절 서민들의 비애로 가득 찼던 포장마차속의 한 장면인 듯 한 이 광경은 지난 2013년 세모의 끝자락에서 술자리에 모여 앉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주고받던 내용을 한겨레신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다름 아닌 지금의 대다수 2,30대가 느끼고 있는 한국의 현 세태라는 것이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들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놀라운 경제성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OECD 경제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 몇째 안가는 신흥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의 최대 수혜자로서 오늘 행복해야만 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푸념은 하루 세끼만 제때 찾아 먹어도 행복하다고 느꼈던 아버지 세대들이 경험했던 빈곤의 정도보다도 더욱 암담하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부(富)가 어느 정도의 사회 안전망은 확충이 되어 최저생계비가 보장이 되며 인권이 보장되고 가리지만 않는다면 일자리가 남아도는 나라, 삼성과 현대 그리고 LG가 있는 나라, 그리고 각종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젊은이들의 입에서 마치 척박한 6,70년대에나 있을법한 헐벗고 굶주렸던 노동자들의 한숨 섞인 푸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어려웠던 그 시절을 얘기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과 목표가 그 시대의 것과 같겠냐는 주장이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과 대학교도 모자라서 대학원까지 나온 자기들의 처지가 그 삶의 질에 있어서 비교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일 게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역경을 체험하며 살아왔던 부모세대들로 부터 종종 자신들이 겪어왔던 그 어렵던 시절을 들을 때면 "아버지도 참! 아 지금은 세상이 달러졌단 말이예요!"라며 그저 아버지세대를 현실과 거리가 먼 구닥달이정도로 폄하했던 편견과 아집속의 모습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 보면 삶의 행복과 만족이라는 의미가 결국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한들 그 외부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다보는 사람들의 건강한 가치관이 근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말하고 싶었던 아버지세대의 교훈들을 이제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지금 정작 한국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엄청난 부를 그저 소비할 줄만 알았지 그것을 어떻게 재분배해서 그 사회 전체적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 축적된 파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적으로 많이 쟁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의 성공적 교육에 목숨을 바친다. 그러나 그 성공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삶의 비전을 빼앗고 있다. 그들은 이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며 성취하기 힘든 욕망에 허덕일 뿐이다. 지금 그대로의 삶에서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는데도 말이다. 지금 한국정가에 또다시 안철수 바람이 일고 있다.
하지만 그가 표방하는 이른바 '새 정치 구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앞으로 한국 사람이 원하는 새 정치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지금의 한국인의 욕망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새 정치가 과연 가능할까? 안철수는 바로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한국 사람의 욕구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그 길!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현재의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