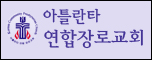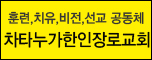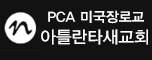정말 죽고 싶었을까 아니면 정말 살고 싶었을까?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50조원짜리 화려한 눈꽃 쇼에 빠져 있을 때, 작은 단칸방에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죽는 마당에 세상을 향해 원망을 하고 독설을 내 뱉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이 남긴 유서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란다.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아니 죄인처럼 죽어야 했다.
이를 시작으로 여기 저기서 안타까운 죽음이 하루를 멀다 하고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사람들이 새롭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우리가 그 동안 애써 잊고자 했던 적나라한 삶의 현실과 직면하게 된 것이다.
국민소득이 얼마니, 무역수지 흑자가 얼마니 하는 것과 같은 화려한 숫자놀음은 누구를 위한 꽃놀이패인지, 서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물가를 넋 놓고 쳐다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가계 부채는 1천조원에 이르고, 집을 가진 사람은 하우스 푸어가 되고 집 없는 사람은 치솟는 전세를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밀려난다.
생명을 살리는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은 그들의 죽음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류에 나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런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
이들을 돕는 사회 복지사들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이 죽음의 행렬에 브레이크가 되기에는 미약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이를 키워야 돌아갈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큰소리를 낸다. 하청에 재 하청으로 죽어가는 중소기업의 곡 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유명 대기업의 텔레비전과 휴대폰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며, 돈 잔치를 벌이는 대기업의 홍위병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편적 복지 같은 말은 아직도 이 나라에 발붙이기 힘들다. 노동의 '노'자만 들먹거려도 빨간 딱지를 붙이고,법에 명시된 권리인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겠다는 말만 나와도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운운하며 협박을 해 대니 어디에 호소할 길도 없다.
결국 이 약육강식의 낭떠러지에 떠밀린 사회적 약자들은 스스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밀려서 떨어질 것인지 하는 선택만 할 수 있을 뿐,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조차 연명할 수 없다.
국가란 국민이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우리는 연이어지는 국가의 장례식에 상주가 되어 이 땅에 서 있다. 이름 모를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죽음이요, 우리 가족의 비극이다.
이 애타는 통곡 소리가 끊기기 전에, 아니 새로운 곡 소리가 울리기 전에 우리는 이 비극을 멈추어야 할 책임이 있다.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이념을 넘어서, 정치적 이견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지역색을 넘어서 이 계속되는 국가의 장례식에 종말을 고해야 한다.
이미 떠난 가족의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할 수는 있다. 고통스러운 소식이 들려올 때 마다 채널을 돌려 작위적인 웃음에 영혼을 팔지 말고, 우리의 눈과 귀는 그들을 위해 계속 열어 놓아야 한다.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열리고 살 방법이 생긴다. 그러나 고통에 눈 감으면, 그들은 감은 눈을 다시 뜰 수 없다. 여론을 형성하고,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산다.
봄날의 꽃 향기가 코 끝을 스치는 찬란한 날에, 이제는 죽음의 향 냄새에 찌든 상복을 벗어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