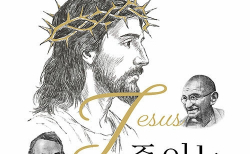1980-1990년대만 해도 목회자의 헌신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부목회자의 생활은 항상 5분대기조였다. 밤중에도 성도들 중 문제가 생기면 뛰어나가 일을 처리하고 기도해주고 후속 조치까지 완벽하게 처리하였던 기억이 난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고, 목회였고 헌신의 삶이었다.
요즘 젊은 교역자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다른 것 같다. 아마 꼰대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작은 실례를 들면 지방 교회에서 부목회자를 초청하는데 사모가 지방에는 갈 수 없다면서 매일매일 울더란다. 그래서 결국 지방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였다는 소리를 듣는다.
다음 후보자가 다시 왔는데,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을 보면서 좋다고 하였단다. 교회가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아 매우 깨끗하고 최신식이었기 때문이다. 거주할 사택을 함께 갔는데 개인 주택이 되어 새로운 교역자를 모실 생각으로 리모델링해서 잘 단장해 놓았다고, 그런데 사택을 보더니 말이 없었고, 결국은 오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한 것인가?
과거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밤낮 구별없이 수고하고 심방하고 성도들을 보살폈다. 목회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매우 컸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헌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노동 착취였고, 낮은 사역비는 임금 착취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전의 목회자들은 그것을 헌신으로 알고 충성하였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오늘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목회자의 헌신 개념은 사라지고,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사례비를 얼마 줄 것인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묻는다고 한다. 부차적으로 사택은 주는지, 여러가지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살핀다는 것이다. 교회 일도 정해진 자기 일만 하고, 그 외 일이나 시간이 지나면 수당을 요구한다는데, 이미 오래된 이야기라고 한다.
헌신의 삶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이 드신 목사들이 보면 참으로 기가 찬 노릇이라고 탄식하지만, 신세대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 아닐까?
그러면 여기에서 '헌신'이란 무엇인가? 종교적 의무감으로 일하는 젊은 세대 목회자들, 섬김과 헌신 봉사의 개념은 무엇일까? 의문을 가지게 된다.
교회는 여전히 섬김과 헌신을 필요로 한다. 주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듯, 주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봉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수고하는 일을 돈으로 따진다면, 일반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구태여 가식적인 헌신과 봉사는 피차에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도 교회의 헌신과 섬김이 없다면 밝은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 부르심 받은 종들이라면,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교회가 과중한 업무로 지나치게 교역자들을 부리는 것은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교회 일은 직장 일처럼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새벽기도부터 뛰어야 하는 목회자들의 과중한 업무, 지혜롭게 생각할 일이다.
신세대 목회자들이 권리를 찾는 동안,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떤가? 무보수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나아가 십일조 감사 주일헌금을 하고 있다.
그들의 시간은 어떤가? 일주일 직장생활하고 주일에는 일찍 와서 주일학교 선생으로,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각종 일에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 교역자들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신앙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세속화된 목회자들의 태도를 보면, 섬김과 헌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의구심이 생긴다. 자기에게 유익하거나 연관이 없으면 전혀 수고하려 하지 않는다. 규칙 속에 정해진 일만 하려는 태도는 신앙 세계에서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커피와 식사 대접이나 근사하게 받고, 절기 때마다 푸짐한 선물을 받는 것과 거마비 받는 것을 즐기려 한다면, 속히 생각을 바꾸어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 피차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방이라고, 사택이 좋지 않다고, 조건이 맞지 않다고 부목회자 생활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로 낯선 문화와 언어가 다른 환경에서 하루에 1,000km를 운전하라고 하면 목사직을 그만두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잘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현대 문화의 이기를 다 누리고 섬김을 받고 신사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삯꾼이 될 확률이 더 많다고 본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한국교회의 미래는 젊은 목회자에게 달려 있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 목회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고 선택한 사역의 길, 성직의 길이 아닌가?
세르게이, 모스크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