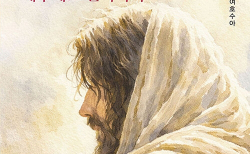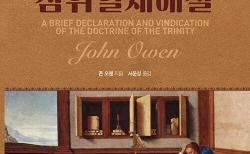지난 토요일 새벽기도회에 오는 길에는 오는 듯 마는 듯 흩뿌리던 눈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당을 문을 나설 때는 함박눈으로 자태를 바꾸어 위풍 당당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에는 벌써 눈이 제법 쌓여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하지? 바로 어제 그저께 눈을 치우는 부러쉬를 차에서 꺼내 놓았는데!'라는 생각이 들며, 부지런을 피운 것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지, 맨손으로 치워야지'라고 중얼거리며 자동차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눈을 치우려고 보니까 눈이 쌓였다기보다는 샅뿐이 앉아있다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창문에 살포시 앉아 있는 눈을 입으로 ‘훅'하고 불어서 가볍게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입김으로 눈을 치우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차가운 눈을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되었다는 작은 기쁨에 흡족해 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집으로 오는 길에 아름다운 함박눈에도 무감각해진 아니 오히려 귀찮아하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제가 봄을 몹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봄이라는 단어가 제 생각 속에 들어오자 갑자가 봄에 대한 기다림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도대체 봄이 어디쯤 왔을까?' 아마 제가 이렇게 봄을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아주 어린 시절에 봄이 저에게 주었던 아름다운 추억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 고향의 봄은 언제나 같은 길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의 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한다고 해서 이름을 붙인 꽃샘추위가 지나면 곧 봄소식이 화사하게 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소식은 제일 먼저 저의 집 울타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숙부님들이 결혼하여 분가하시기 전에 심어놓으셨다고 하는 울타리의 개나리가 잎도 피기 전에 샛노란 얼굴을 내밀고 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앞마당의 화단에 형님 심었다고 하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벌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누님들이 심은 산수유화가 앞마당 화단에서 노란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를 위한 봄의 향연은 성대해져 갔습니다.
경칩(驚蟄)이 넘어서면서 봄의 향연은 더욱 깊어 갑니다. 뒤꼍의 대나무 밭에서 산새 소리가 새벽을 깨우면 저는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앞마당에 나서게 됩니다. 아직은 선잠에 취하여 마당에 내려서면 매화 향기가 아침 공기 속으로 은은하게 밀려옵니다. 때로는 이른 봄비라도 밤사이 내리면 막 피어나기 시작한 매화와 산수유화가 비를 맞고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일어나자마자 앞마당 꽃밭에 가서 살펴봅니다. 꽃들을 보는 순간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이 쑥스러워집니다. 봄비에 꽃잎이 떨어지기는커녕 빗방울을 꽃잎 속에 품은 매화가 오히려 더 싱그러웠고, 물기를 머금은 노란 산수유꽃은 더욱 청초했습니다. 날마다 더욱 많아지는 꽃송이를 헤아리며 저는 봄날은 화사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오른 종달새의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며... 저의 어린 시절 봄 향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카고의 꽃나무들은 경칩(驚蟄)이 벌써 지났는데도 꽃눈을 틔울 꿈조차 꾸지 않는 것 같으니. "열흘쯤 더 기다리면 매화 향기 실바람 타고 오려나...”그러나 아직은 겨울 꽃을 즐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울 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봄의 향연에도 취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차가운 눈을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되었다는 작은 기쁨에 흡족해 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집으로 오는 길에 아름다운 함박눈에도 무감각해진 아니 오히려 귀찮아하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제가 봄을 몹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봄이라는 단어가 제 생각 속에 들어오자 갑자가 봄에 대한 기다림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도대체 봄이 어디쯤 왔을까?' 아마 제가 이렇게 봄을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아주 어린 시절에 봄이 저에게 주었던 아름다운 추억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 고향의 봄은 언제나 같은 길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의 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한다고 해서 이름을 붙인 꽃샘추위가 지나면 곧 봄소식이 화사하게 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소식은 제일 먼저 저의 집 울타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숙부님들이 결혼하여 분가하시기 전에 심어놓으셨다고 하는 울타리의 개나리가 잎도 피기 전에 샛노란 얼굴을 내밀고 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앞마당의 화단에 형님 심었다고 하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벌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누님들이 심은 산수유화가 앞마당 화단에서 노란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를 위한 봄의 향연은 성대해져 갔습니다.
경칩(驚蟄)이 넘어서면서 봄의 향연은 더욱 깊어 갑니다. 뒤꼍의 대나무 밭에서 산새 소리가 새벽을 깨우면 저는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앞마당에 나서게 됩니다. 아직은 선잠에 취하여 마당에 내려서면 매화 향기가 아침 공기 속으로 은은하게 밀려옵니다. 때로는 이른 봄비라도 밤사이 내리면 막 피어나기 시작한 매화와 산수유화가 비를 맞고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일어나자마자 앞마당 꽃밭에 가서 살펴봅니다. 꽃들을 보는 순간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이 쑥스러워집니다. 봄비에 꽃잎이 떨어지기는커녕 빗방울을 꽃잎 속에 품은 매화가 오히려 더 싱그러웠고, 물기를 머금은 노란 산수유꽃은 더욱 청초했습니다. 날마다 더욱 많아지는 꽃송이를 헤아리며 저는 봄날은 화사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오른 종달새의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며... 저의 어린 시절 봄 향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카고의 꽃나무들은 경칩(驚蟄)이 벌써 지났는데도 꽃눈을 틔울 꿈조차 꾸지 않는 것 같으니. "열흘쯤 더 기다리면 매화 향기 실바람 타고 오려나...”그러나 아직은 겨울 꽃을 즐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울 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봄의 향연에도 취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