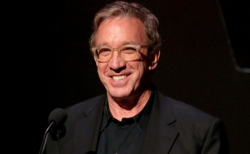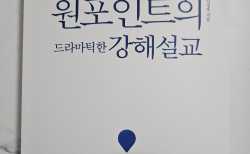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교회가 성도의 현재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문제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에 대응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회를 재조정하는 일, 곧 교회 혁신이 필요하다. 리더십과 목회 현장 전문가인 저자 스콧 코모드 교수(풀러신학대학원)는 교회 혁신을 위한 올바른 원칙을 찾아내고, 복음을 창의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풀러청소년연구소는 100여 개 교회 리더십 팀과 협력해서 이 책의 혁신 방안을 실험하고 효용성을 검증했다.
이 책은 성도를 돌봐야 할 리더로서 갖춰야 할 자질, 기독교의 역사적 실천을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법, 구글·픽사·디자인 기업 IDEO 등 여러 첨단 기업에서 가져온 혁신 원리, 교회 내 갈등 해결의 실제 사례, 교회 혁신 실행 단계 등, 교회 혁신의 이론부터 실제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교회는 엉뚱한 이유로 혁신에 힘쓸 때가 많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나 '젊은 층 가정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목표가 될 수 없다. 교회라는 기관에 초점을 맞춘 목표는 다 부적격이다. 혁신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자신이 섬기는 대상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 사회학자 로버트 우스나우에 따르면, 현재 많은 교회가 위기에 처한 이유는 엉뚱한 것을 듣기 때문이다. 대다수 리더가 듣는 내용은 교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교회의 관심사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려면 바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들어야 한다. 일과 돈, 건강과 가정 같은 문제야말로 인간 조건을 구성하는 보편적 주제다. 아울러 삶과 죽음과 관계에 대한, 그리고 이 모두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사람들을 잠 못 이루게 한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적 혁신 과정의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첫째로, 이 과정은 분별이라는 기독교 실천을 구현해야 한다. 앞장에서 강조한 기독교 실천들로 보건대, 우리의 과정에는 당연히 분별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로, 이 과정은 실천 신학의 윤곽을 따라야 한다. 여러 세기에 걸쳐 기독교 신학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함께 추론하여 상황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 과정을 실천 신학이라 한다. 우리의 과정도 실천 신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셋째로, 이 과정은 혁신적 사고로 이어져야 한다. 일반 혁신가들은 지난 20여 년간 인간 중심 디자인(HCD)을 개발했으며, 이는 특히 IT 세계에서 두드러진다. 덕분에 기업들은 혁신적 반응을 디자인하여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과정도 세상 최고의 통찰을 취해서 기독교 전통에 접목해야 한다. 요컨대 우리의 혁신 과정은 분별을 구현하고, 실천 신학의 윤곽을 따르며, HCD의 혁신적 사고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세대 전만 해도 신학교 교육의 목표는 어느 학자의 표현으로 '신학적 낙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학교는 학생에게 지식을 가득 채 워 넣은 뒤 사막으로 내보냈다. 이미 배운 것만으로 평생 충분하기를 바라 면서 말이다. 20세기에는 신학적 낙타들이 대체로 승승장구했다. 낙타는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동물이며,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잇는 예측 가능한 경로를 이동할 때는 안성맞춤인 수송 수단이다. 당연히 학교들도 한때는 예측 가능한 세상에 맞게 조정되어 있었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교회의 결정권자들이 공간 중심 세대의 산물이자 현 사역 모델을 개발한 리더라면, 아무래도 그들은 '기존 방식이 더 좋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세대에게 다가가려면 그들도 기민한 리더들을 길러 내는 법과 교회를 혁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밀레니얼교회는 무조건 청년들을 설득하여 주일 예배에 다시 나오게 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목표는 그들에게 주일 예배의 여러 요소(즉 기독교 신앙의 여러 실천)를 통해 그들 삶의 영적 의미를 해석하게 해 주는 것이다. 즉 이 교회도 공동의 희망 이야기를 창출하여 자신들이 맡아 돌봐야 할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의 영적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