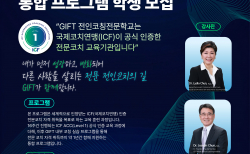나는 어릴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장애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홀로 걷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세수하고 목욕하는 것, 심지어 대소변을 보고 처리하는 것까지 일상의 거의 모든 것들을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피나는 노력(?)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늘었고, 특히 미국 유학을 오면서부터는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밖에 없어 거의 독립된 일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이 50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아주 사소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옷의 단추 끼기, 손톱, 발톱 깎기, 삶은 달걀 껍질 까기 등이다.
나는 손놀림이 어줍어 상의의 단추를 구멍에 잘 낄 수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티셔츠도 단추가 없는 라운드티를 즐겨 입었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부터 아내는 라운드티를 입으면 애들 같이 유치해 보인다며 보다 세련되고 중후한 멋(?)을 위해 칼라가 달린 티셔츠만 사주기 시작했다. 아내 말처럼 칼라가 달린 티셔츠를 입으니 훨씬 멋있긴 한데, 역시 단추 끼는 것이 몹시 어렵다.
아내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고 나 혼자 출근 준비를 하면 티셔츠 단추 2개 잠그는 데만 10분 이상이 소요된다. 어줍은 손가락으로 조그만 단추를 잡는 것조차 어렵고 그걸 작은 구멍에 밀어 넣자니 너무 힘들어 온 근육이 경직되고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구멍에 거의 다 밀어 넣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단추가 다시 풀리는 경우다. 이럴 땐 정말 푸념이 절로 나온다.
특히 겨울에 자켓이나 점퍼를 입을 땐 5~6개나 되는 단추를 간신히 다 끼웠는데 하나씩 밀려버려 다 풀고 다시 끼워야 하는 경우도 많다.^^ 덕분에 버스 시간을 놓쳐 사무실에 지각도 여러 번 했다. 단추를 끼기 어려우면 그냥 풀고 다니면 좋겠는데 나는 성격이 꼼꼼해 그렇게 단정치 못한 옷차림으로 밖에 나가는 건 싫다. 언젠가 글에서도 밝혔듯이 몸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데 성격은 결벽증이 의심될 정도로 깔끔하니 사는 게 피곤할 때가 참 많다.
단추를 끼기는 힘들어도 자꾸 시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데 비해, 손톱, 발톱 깎기는 이 나이가 되도록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유학을 와서는 기숙사에 함께 사는 한국 학생들에게 부탁을 하곤 했다. 그런데 손톱, 발톱까지 깎아 달래기가 너무 미안하고 자존심도 상해 아주 길 때까지 안 깎고 있다가 손톱이 부러지고 발등이 발톱에 긁혀 피가 나오기도 했다.
또 기숙사 학생들도 어떤 사람은 길게 깎아주고 다른 사람은 바짝 깎아주는 등 취향이 제 각각이었다. 차라리 네일샵에 가서 다듬어달라고 하면 모양도 예쁘고 훨씬 편했을 텐데 그땐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결혼한 후에는 아내가 손톱, 발톱을 깎아주는데 "나처럼 엄청 예쁘고 전문적인 간호사가 서비스해주니 자긴 얼마나 행복해? 영광으로 알아~" "수고비로 100불은 줘야 할거야~" 하며 온갖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낸다.^^ 또 손톱을 순서대로 깎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이 손가락, 저 손가락 깎는 것도 참 재밌다. 나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있어 커버해주니 참 감사할 따름이다.
삶은 달걀의 껍질을 까는 것 역시 나에겐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손이 말을 잘 안 들어 껍질만 까는 게 아니라 그 안의 흰자도 모두 부셔버리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도 냄비에 삶은 달걀 2개가 있길래 먹으려고 껍질을 까려는데 너무 단단히 붙어 있어 결국 흰자까지 다 으깨지고 달랑 노른자만 먹었다. 나중에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니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긴 공부 빼놓고 잘 하는 게 하나도 없어~"라며 무척 불쌍해 했다.
이처럼 50대 중반을 훨씬 넘겼는데도 난 여전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 예전에는 장애인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내가 못하는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감추고 잘하는 것들만 내세우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 나의 약점,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도 애정이 가고 이런 것들에 좀 더 정직하고 의연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잘난 면보다는 좀 어설프고 부족한 면, 꾸밈없는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욱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내 경우에도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나를 자꾸 왕따시키고 사사건건 괴롭혀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몸이 불편한데도 공부를 제법 하니 그게 거염이 났던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일부러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달라고 하고 도시락 뚜껑도 열어달라고 하는 등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 하고 집까지 초대해 속 깊은 얘기를 나누니 오해도 풀리고 서로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
자신을 낮춰 남을 높이는 겸손, 아프고 부끄러운 것이라도 당당히 드러내는 솔직함이야말로 보다 견고하고 풍성한 인간관계를 이끌어내는 지름길인 것이다.
현재 장애인으로서 나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참담'하고, 미래의 내 모습을 바라봐도 '암담'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런 참담과 암담이 '담담'으로 바뀐다. 또 더 나아가 담담함이 '당당함'으로 업그레이드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이다. 나 역시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잘 하는 것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훨씬 더 늘어날 텐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기 보다는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사랑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사람들에게도 보다 진실되고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가야겠다는 다짐을 하여 본다.
글 | 이준수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 영성문화사역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