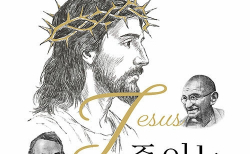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관심이 있기는 한 건가?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해 주시면서, 나에게는 항상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에 쉴 새 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그렇게도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 같던 격한 불만과 불신이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그 열기가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이었네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까지는 구원의 문제로, 그리고 선교사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로 씨름에 씨름을 더했지요.
이렇게 끙끙거리기를 어언 40년이 돼서야 그 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정답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뢰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고 또 물었던 시간을 그렇게도 오래 끌어왔었네요. 참 부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이렇게 부실한 데도 주님은 선교와 목회의 자리를 내게서 박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내게 주신 그 임무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탄성이 나올 수 밖에요. 그 은혜와 자비에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목회는 인생의 정답을 찾은 자의 몫이 아니라, 아직도 인생의 해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배웠지요. 또 하나, 이 여정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인생살이에 관한 명쾌한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선교지가 내게는 일터였다기보다는 내가 빚어지기 위한 훈련장이었다고 보는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해서 선교지에 정착하기까지 10여 년 동안은 선교사로서 생존하기 위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차 임기가 시작된 1991년부터는 내 신앙과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대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 같네요.
선교사라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선교지 가기 전에 해결했었다면 좋았겠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정석대로 가지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내 마음에 '목회'에 대한 부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내가 서른여덟이 되던 1993년 언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성경 번역을 시작한 지 칠팔 년이 되었던 시점이었던가 봅니다.
그 시점에 한 책을 통해서 목회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목회에 관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래리 크랩의 "영적 가면을 벗어라 (Inside Out)"가 바로 그 책이지요. 선교지에서 끙끙거리며 인생의 숙제를 푸는 중에 그 책은 나의 헝클어진 인생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자의 말 하나하나가 내게 시원한 생수가 되었지요.
그 바람에 그 책은 내가 두 번 이상 읽었던 몇 안 되는 책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책과의 두 번째 만남이 이뤄졌을 때, 나는 목회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목회를 말한 건 아니지만, 나는 그의 글 속에서 목회의 본질을 보게 된 거지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사이에 놓여 있는 영적 파이프라인이 막히지 않도록 돕는 일'이 바로 목회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에 파고들어 온 여러 상처와 아픔이라는 찌꺼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굳어지는 바람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영적 파이프라인 속에 쌓여 있는 왜곡된 상처의 찌꺼기가 제거되도록 돕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내 마음에 새겨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목회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나는 목사나 교회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질 않았습니다. 특히 선교에 관한 일로 내가 초기에 속해 있던 선교단체를 대표해서 여러 기관과 교단의 목사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목사 혐오증'이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평신도 출신 선교사였던 내가 목사에 대해 받은 인상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목사에 대한 혐오감이 쌓이게 되더군요. 일반 성도와는 다른 특별 신분인 '성직자'라는 태도를 풀풀 풍기는 경우에는 더욱더 거부감이 들곤 했으니까요. 교회를 목사의 전유물로 여기는 태도 또한 자주 목격하면서 부정적인 인상이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모든 목사가 그런 게 아닌데 말입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