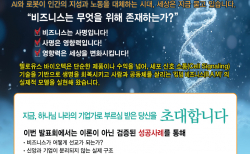본 서평은 페이스북 페이지 '신학서적중고장터'의 독서 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로마서(Der Roemerbrief)
칼 바르트 | 손성현 역 | 복있는사람 | 1,124쪽 | 60,000원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신학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자문해 보면, 그러하노라 떳떳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3년 남짓의 짧은 시간은 역사로부터 쌓아져 온 신학의 방대함과 깊이의 어떠함 앞에 좌절했던 기억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당대의 철학과 시대적 배경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학자의 사상과 그에 수반되는 신앙의 길에 대하여 배웠지만, 훌륭하게 정리된 2차 문헌들과 그 배가 넘는 논문을 따라가기에도 벅차, '신학생'이라고 하면서도 발췌된 것이 아닌 신학 문헌의 원문을 직접 접하여 제대로 이해하며 완독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부끄럽게 고백하건대 필자는 '신학함'에 성실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제서야 겨우 그 유명한 바르트의 로마서를 집어 들었으면서도 묻는 것이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est semper reformanda)'는 모토 아래 발전되어 온 것이 지금의 개혁신학이라면, 굳이 지나간 시대의 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저서가 이 시대에 던져주는 유의미한 것이 있을까?
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래적 내용"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성서 해석의 과제를 인식하고, 로마서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변증법적 해석으로 풀어내고 있다.
저자의 성서 해석은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분명하게 선 그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새로운 세계'에서만 가능할 뿐 인간적인 가능성이라는 원 안에 속한 모든 것은 불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당대의 기독교에 근본적인 비판을 가한다.
저자에 따르면 성서 해석의 과제는 성서가 쓰여진 과거나 그 일이 일어난 과거의 사실 이상의 것, 곧 지금 이 시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텍스트가 직접 말하게 하는 것(100쪽)"에 있다. 그것은 본문이 위치한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본문을 분석하거나 과거에 고정된 역사의 사안에 대한 가치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실제적 내용'을 알고자 하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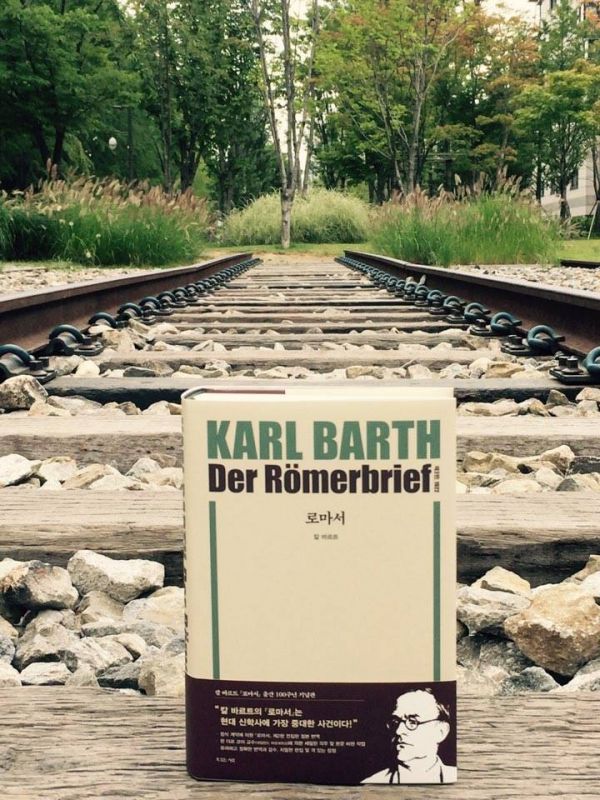 |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올바른 생각들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을, 그리고 ...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을 추구하셨고 또 발견하셨는가(Wort Gottes, 21, 24, 28., Karl Barth die grosse Leidenschaft, 에버하르트 부쉬 지음, 박성규 옮김,『위대한 열정- 칼 바르트 신학해설(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50쪽에서 재인용)"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제 수행을 통해, 저자는 로마서 안의 내적인 변증법을 발견한다. 저자에 따르면 하나님은 낯선 타자, 인간으로서는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감추어지신 하나님,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과 인간이 속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시는 부정, 불가능성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위기를 맞는 존재이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심연, 곧 "이편과 저편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죽음의 선이 그어져 있다(293쪽)."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불가능한 가능성, 변증법적 역설이 일어난다. 그것은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 위로부터 수직으로 가르고 들어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불가능한 가능성(147쪽)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접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죽음'의 죽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다.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정 안에 머무르기를 자처하고, 자신을 허공에 내던짐으로써(230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새로운 세상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죽음의 선은 생명의 선이 되고 그 종말은 곧 시작인 종말이며, 부정은 곧 긍정인 부정(293쪽)"으로 변환한다.
그러나 저자는 복음에 나타난 변증법적 역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가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 긋는다. 저자는 교회 혹은 신학이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 신'을 말하고 있으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모든 시도 역시 결국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어떤 최대의 긍정조차도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비유요 증언(874, 878쪽)"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종교는 오히려 자신이 다른 죄인들의 연대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착각하여 더 큰 죄책을 짊어진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윤리적 가능성 역시 배제된다.
 |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개념이나 인간의 '고양'이 아니다. 전혀 다름, 전적 타자로서 계시되며 이 세상의 '지양'이다. 인간과 인간이 속한 세상의 어떤 긍정적 가능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이다. 인간으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알려지지 않은 분으로서-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은 없다(748쪽)."
필자는 저자가 인식한 성서 해석의 과제가 그 본래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음과 이를 통해 발견한 로마서의 내재적 변증법에 대한 해석으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경계 지음이 결코 무너질 수 없음을 못박았음을 확인했다.
저자의 해석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전 5:2)"는 서문의 선언에서부터 시작돼 로마서의 해석이 마쳐지기까지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인간과 인간이 속한 세상의 어떤 가능성들도 불가능성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복음을 인간이 듣는다 해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으로서 남고, 이 세상도 그러하다. 이와 같은 저자의 해석에 대해 인간이, 종교가 거짓 신에게 주었던 자리를 빼앗아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예언자적으로 선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가 지나치게 관념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과 혹은 어떤 영감에 의해 짜인 체계에 따라 로마서 안에 담긴 교의학의 주제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모든 가능성이 배제되는 저자의 해석은 마치 종교와 비종교를 비롯한 모든 것을 동일 선상에 놓는 듯이 보인다.
 |
그러나 저자의 이러한 경계 지음, 구분 지음, 인간과 인간이 속한 세상의 모든 것을 위기와 불안으로 몰아넣는 부정, 하나님에 의한 '아니요'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진리, 낯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1,032쪽)"가 아닌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허무주의에 빠져 자포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을 인식하고자 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거짓 신"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옳다 여겨진다.
저자가 어느 때인가 스스로 고백한 바처럼, "우리는 신학자로서 하나님에 관해 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며, 인간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우리의 당위성과 '할 수 없다'는 우리의 무능함 둘 다를 알아야 하며,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저자가 당대 신학에 던진 폭탄은 한 세기를 거쳐온 지금의 한국교회에도 다시금 던져져야 할지 모른다. 우리의 삶, 교회 현장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있거나 당연시 여기며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들 위에, 인간적인 연약함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행위들 위에 폭발하여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해야 할 것이다.
글: 정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