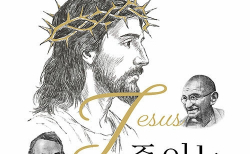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
"딸을 잃었다. 처음에는 나에게만 닥쳐온 비극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겪는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딸의 3주기를 맞으면서 여유가 생긴 것일까. 나와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은 생각이 든다. 당신도 그랬냐고. 그때 그 골목을 지나다가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느냐고. 그게 죽음인데도 오히려 그 애가 태어나던 때 생각이 나더냐고."
딸을 '하늘의 신부'로 떠나보낸지 3년 만에, 아버지는 '굿나잇 키스'를 보낸다. 이 유명한 '글 쓰는 아빠'는, 딸이 어린 시절 "아빠 굿나잇!" 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글의 호흡이 끊길까봐 돌아보지 못한 채 손만 흔들며 "굿나잇, 민아" 하고 건성으로 대답했던 것이 지금 못내 마음에 걸린다.
물론 딸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자고 있는 지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 그것 뿐은 아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게 '글 쓰는 아빠'에게서 시작된 일이니, 그것을 푸는 것도 결국 자신이 가장 잘 하는 '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딸에게 굿나잇 키스를 보내듯, 딸의 영혼을 향해 '우편번호 없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독백처럼 "내가 나를 향해"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백은 딸에게 이야기하는 글로 바뀌었고, 그러다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급기야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이 3인칭으로 변해 하나의 산문이 되고 시가 되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딸에 대해 쓴 글들이 출판되어 나오는 것에 거부감이 있고 가시처럼 마음에 걸린다. "다만 이 글들이 나와 내 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딸을 잃은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세상 모든 이에게 바치는 글이 되었으면 한다."
'굿나잇 키스'라는 작고 일상적 행위부터, 아버지는 딸과 함께했던 추억을 하나씩 꺼내 놓는다. 딸에게 보낸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우리는 신앙에 대해, 문학에 대해, 사랑에 대해, 때로는 삶의 지혜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되고, 어느 구절에서는 깊은 울림도 얻게 된다. 편지이지만 동서고금의 인문학·과학·예술 등을 접하는 재미도 있다.
 |
| ▲'아버지' 이어령 선생. |
'아버지'의 이 편지들은 '예비 아빠'나 '초보 아빠'들에게는 굳은 결기와 다짐을, '이미 아빠'들에게는 반성과 실천에의 소망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는 공감과 힐링을 각각 전해 준다.
아버지는 손주에 이어 딸을 잃고 나서, 그렇게도 멀리 있다고 느꼈던 죽음이 '불과 몇 센티미터만을 남겨두고 다가옴'을 느낀다. 죽음은 그에게 더 이상 '추상명사'가 아닌,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던지면 깨뜨릴 수 있는 유리 그릇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참 많이도 미워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자연히 남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딸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슬픔을 망각한 것은 아니다. "그 슬픔의 노을을 아침의 노을로 바꾸어 버리는 재생과 부활의 힘을 믿는 것이라고. 남들이 다 놀리더라도, 나는 그 힘이 네가 말하는 믿음의 힘이고 희망이고 빛이라고 생각해." 늘 '굿나잇 키스'로 글을 마치던 아버지는, 마지막엔 '굿나잇 키스'를 하지 않는다. 저녁노을 뒤에는 밤의 어둠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