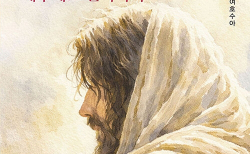(연합뉴스) 4.11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권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과 달리 28일 투표에 들어간 각국 동포사회는 선거와는 무관한 듯 조용한 분위기다. 이번 재외선거 등록자 수가 전체 대상자 223만3천193명의 5.5%에 불과한 데다 실제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총선 자체에 대한 무관심과 까다로운 선거 절차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유명무실하게 귀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산한 투표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재외투표가 마감된 5개 지역의 경쟁률은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장 먼저 투표가 시작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전체 1천172명의 선거권자 가운데 70명만이 투표를 했다. 고작 5.9%의 투표율이다.
호주 시드니의 경우 첫날 투표 마감 결과 2천183명 중 92명이 투표를 마쳐 4.2%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캔버라의 경우 679명 중 6.3%인 4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10.9%, 유지노사할린스크 17.0%의 투표율을 각각 나타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투표일이 5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동포사회의 총선 관심도가 낮아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 분위기 `시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동포사회에는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간간이 국내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 각 정당의 후원조직이 속속 생겨나고 동포사회의 자생 조직까지 결성되면서 내부 갈등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3일부터 진행된 재외선거인 등록이 극히 저조한 양상을 보이면서 선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싹 사그러들었다. 각 정당이 재외 표심에 대한 관심을 거두면서 동포사회의 자생 조직들도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 특히 각 정당이 확정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재외동포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도 동포사회에 냉소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미국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경우 성명을 통해 "동포들을 외면한 한국의 정당 정치인들은 이제 미국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조차 없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미주 한인들을 만나 정치적 선동을 일삼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총영사관에 파견된 진승엽 재외선거관은 "전반적으로 재외국민들이 총선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아 등록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절차 개선 시급
오는 12월 대선을 앞둔 마당에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라는 재외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도 제고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에 완전히 정착한 영주권자의 경우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두번이나 방문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거주국 수도나 대도시에 설치돼 있는 탓에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투표권 행사를 위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탓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동포단체들은 우편ㆍ인터넷 등록 도입, 투표소 증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