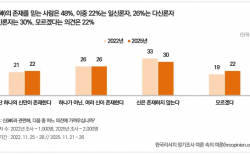22살 꽃다운 나이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홀로 압록강을 건넌 김선영(가명, 38)씨는 올해 추석도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이다.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인 선영씨의 가족은 모두 10명이다. 2천 달러면 쌀밥은 먹지 못해도 강냉이 쌀과 소금을 사서 가족 모두가 1년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어렵게 모은 미화 3천 달러를 지난 봄에 브로커를 통해 송금하긴 했지만 북한에서는 월동준비가 한창인 시기이기 때문에 혹여 양식이라도 떨어졌을까 노심초사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큰 폭으로 줄었다. 장마당에서 구할 수 있는 생필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다는 소식도 마음을 시리게만 한다.
어릴 적 추석에는 송편도 먹고 노릇노릇 구워지는 부침개의 기름 냄새도 맡을 수 있었다. 좋은 음식은 아니었지만 차례상을 만들어 성묘도 가곤 했었다. 그러나 혹독했던 고난의 행군을 지나 그가 탈북을 결심한 시기의 추석은 산 사람도 먹을 음식이 없었다.
서민들이 양식이 없어 굶주린 배를 움켜쥘 수 밖에 없을 때 동네 간부들은 1년에 한번씩 불고기를 구워먹으며 온 동네에 부러움을 샀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평한 사회라고 선전하는 당국이 싫었다. 싫어도 불만을 표출할 수 없었다.
선영씨는 그렇게 자유를 찾아 압록강을 넘었고 꿈을 찾아 태평양을 건넜다. 미국에 도착해서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를 배우고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그리고 지금은 한의대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는 질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북한에서는 그저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지요."
선영씨의 꿈은 의사다. 응급실은커녕 약국도 마땅치 않은 북한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단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더운 물에 목욕을 시켜드리고 내 손으로 지은 더운 흰쌀 밥을 대접하고 싶어요."
선영씨는 가족과 재회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북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통일을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