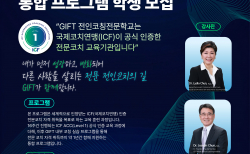설교를 몇 번 준비하는가?
설교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마다 단골처럼 던지는 질문이 있다.
"설교를 몇 번 준비하는가?"
그럼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설교를 몇 번 준비하다니!'
그럼 곧이어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질문을 제대로 했느냐? 라는 눈빛이다. 질문을 제대로 했다. 단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을 뿐이다.
설교는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설교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 또 다른 하나는 설교를 몇 번 준비하느냐?
위의 두 말은 같은 말이다. 설교자는 설교 준비를 최소한 두 번 이상 해야 한다. 필자는 아트설교연구원 회원들에게 설교 준비를 세 번 하라고 한다.
세 번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첫째, 본문을 중심으로 준비한다.
둘째, 청중을 중심으로 준비한다.
셋째, 삶으로 준비한다.
설교자는 설교를 세 번 준비해야 한다. 최소한 두 번은 준비해야 한다. 두 번 준비 중 청중의 입장 준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청중의 입장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반쪽 준비일 뿐이다. 설교를 잘 하는 설교자들은 두 번 이상 준비한다. 팀 켈러, 유기성, 옥한흠 목사도 설교를 두 번 이상 준비한다.
한 번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한다. 또 다른 한 번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청중의 입장에서 준비한다. 이런 일련의 준비 중 삶으로 살아낸다. 결국 설교를 세 번 준비한다.
많은 설교자들은 설교 준비를 두 번 한다. 첫째는 본문 중심 설교 준비다. 둘째는 삶으로의 준비다. 즉, 청중 입장에서 설교 준비에는 별 관심이 없다.
설교자는 설교 준비를 세 번 해야 한다. 세 번 준비하려면, 설교 준비를 일찍 해야 한다. 최소한 주일이 끝난 후부터 준비해야 한다. 유기성 목사나 팀 켈러 목사는 적어도 3주 전부터는 설교 준비를 한다.
본문과 청중의 교집함을 찾아라
존 스토트 목사가 한 말이 있다. "설교자는 '다리 건설자'와 같다."
설교자는 하나님과 청중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교인의 다리를 놓으려면 하나님은 물론 청중을 알아야 한다.
설교 다리 건설자인 설교자는 하나님과 청중, 설교자와 청중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연결고리가 되어주려면 본문과 청중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본문과 청중 사이의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중은 그 설교를 자신의 설교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설교자가 본문과 청중과의 교집함을 찾기보다는 본문 해석에 주력한다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일어난다. 하지만 본문을 바르게 해석했다고 스스로 최고의 설교자로 여긴다. 그럼 청중은 분통이 터진다. 자신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명이 대화를 한다. 한 명만 열정적으로 떠든다. 듣기만 해야 했던 사람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 한다. 내 마음을 전혀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설교자의 설교가 이렇다.
설교자는 본문 이해는 물론. 청중 이해도 해야 한다. 그래야 다리 건설자라고 할 수 있다. 한쪽 다라만 놓았다면 다리 파괴자일 뿐이다.
설교자는 청중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청중의 입장을 헤아리면, 청중에게는 그 설교가 자기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청중의 입장을 헤아린 설교는 따뜻하다. 청중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 한다. 설교자와 하나가 되려 한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청중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청중의 현재 상황과 지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해주어야 한다. 청중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고 말해야 주어야 한다.
설교자는 청중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려야 한다. 청중은 자신과 설교자의 마음에 일체감을 갖기 때문이다. 청중은 본문의 팩트에 그다지 관삼이 없다. 청중은 설교자와 일체감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설교자가 기억할 것이 있다. 청중은 설교자가 청중의 마음을 헤아린 만큼, 마음을 연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청중을 중시했다. 그는 성경 해석에서 청중 이해를 아주 중요시했다. 그렇다면 청중이 아주 중시되는 21세기는 말할 것도 없다.
청중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이 말한 포스트모던 교회의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험하고 느끼는 교회다.
둘째, 상호작용하는 교회다.
셋째, 이미지와 은유로 사고하는 교회다.
넷째, 관계가 살아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이다.
청중은 자신이 경험되어야 한다. 이는 설교에서도 마찬가지다. 21세기는 감성, 경험, 은유로 청중이 경험되게 해야 한다.
설교자들의 설교는 청중이 원하는 구조가 아니다. 설교자들의 설교가 대부분은 설명 중심이다. 이는 감성, 경험, 은유라는 특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청중과 무관하다 해도 과언 아니다. 설교는 논증 중심으로 해야 한다. 논증은 감성, 경험, 은유에 잘 아울린다.
21세기는 특별히 절대주의적인 것을 거부한다. 이 말은 청중과 접촉점을 찾은 뒤, 하나님을 설명해 내야 한다는 전제가 주어진다. 청중이 원하는 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설교가 아니라 자신과 관계있는 설교다. 자신과 상관없으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설교는 청중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그럴지라도 일방적으로 설득하고자 하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반드시 '저 말은 나와 상관 있어!'라고 쌍방적 관점에서 설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청중의 입장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
설교에서 힘든 것은 청중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이다. 청중의 입장의 설교가 청중과 상관이 있게 된다. 청중은 자신과 상관있을 때 귀를 연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 결국 들려지는 설교는 청중과 상관있어야 한다. 설교가 청중과 상관있을 때 청중의 마음이 움직인다.
역지사지가 설교 출발점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남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다. 지난 주 글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설교자는 자기 입장에서 설교를 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마땅히 들으셔야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설교를 하던 설교자가 청중의 입장을 헤아리는 설교 하기란 무척 어렵다.
기업은 고객을 신처럼 대한다. 고객을 신처럼 대하는 이유는 기업의 생존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명제 때문이다.
설교도 청중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 요즘 목회가 어렵다고 한다. 10개를 개척하면 겨우 1개 생존한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설교자 입장에서 설교하고 목회하기 때문이다. 교인 입장에서 목회하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개척교회는 기존 교회와 달라야 한다. 달라도 아주 달라야 한다. 하지만 기존 교회와 아주 비슷하다. 차별화된 매력이 없는데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미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완전히 청중의 입장에서 목회해야 한다. 이는 비굴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과 같이 청중을 섬기는 것이 목회다.

교회를 개척하면 설교를 철저하게 청중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그 다음 기존 교회가 생각하지 못하는 남다른 아이템을 장착해야 한다.
필자가 많이 권유 받았던 것 중 하나가 '원어 설교'다. 원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설교에서 원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청중을 헤아리는 역지사지가 담긴 설교에서, 원어 사용은 금물이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청중에게 원어는 외국 말이다. 그럼 설교 중 자신을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 든다. 원어를 사용하는 것은 청중에 대한 역지사지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신학적 용어 사용, 교회 전문 용어 등도 역지사지와 전혀 상관없다.
설교자들이 가장 잘 하는 것이 일방적 선포다. 하지만 설교는 역지사지로 해야 한다. 나아가 형식도 일방적인 선포에서 청중과의 대화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럴 때 청중과 교감과 공감이 되는 쌍방 소통이 이루어진다.
김도인 목사/아트설교연구원 대표(https://cafe.naver.com/judam11)
저서로는 《설교는 인문학이다/두란노》, 《설교는 글쓰기다(개정 증보)/CLC》, 《설교를 통해 배운다/CLC》, 《아침에 열기 저녁에 닫기/좋은땅》, 《아침의 숙제가 저녁에는 축제로/좋은땅》, 《출근길, 그 말씀(공저)/CLC》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