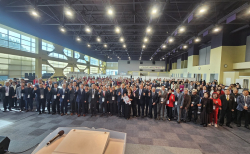프랑스에서 종이책이 전자책을 넉넉히 이기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2011년 이 나라에 전자책 단말기 ‘킨들’이 상륙했을 때 오프라인 서점과 종이책은 3년 내 멸종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2018년 현재 출판시장에서 전자책 비중은 3%에 불과하고 오히려 동네 책방이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도 지난해 전자책 판매는 18.7% 줄었고 종이책은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책이 단순한 지식 정보의 전달 수단 그 이상의 매체라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와 책에 묻어 나오는 잉크 냄새를 전자책이 어떻게 흉내 낼 수 있으며, 새 책을 펴기 전 책 표지를 만질 때 느껴지는 감촉을 어떻게 디지털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식당이나 셀모임 할 때 자주 발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가 울거나 칭얼대면 얼른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쥐어 줍니다.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아이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전개되는 장면 변화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탐닉하며 떠들지 않고 얌전하게 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호랑이 온다,” “순경 온다”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울음을 그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다 못해 순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손목에는 디지털 시대의 상징물인 아이워치가 차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진동하고, 운전할 때도 우회전 좌회전해야 할 때마다 흔들려주는 편리한 기계입니다. 시간도 인공위성과 연결되어 오차 없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칼 같이 정확한 아이워치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5분 앞당겨 맞춰 놓는 아날로그의 지혜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밤늦도록 책상 앞에서 씨름할 때, 컴퓨터로 수많은 자료들을 검색하고 살펴보지만, 결국은 신학교 시절 내내 푼돈으로 사서 모은 주석 책들을 일일이 펴보고 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가운데, 설교가 정리되곤 합니다. 이사 다닐 때마다 제일 골치거리가 책들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의 구박에 때론 벌금까지 내면서 옮겨 다녔던 그 책들이 오늘도 여지 없이 제 책상에 올라 설교 준비의 친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전자책의 등장과 함께 책방뿐 아니라, 서재도 없어진다고 하지만, 아직 제 손에 킨들이 없는 이유는 종이책을 넘기는 손끝에 눈물이 있고, 책 위에 줄 그으며 긁적이는 낙서에 아날로그만 줄 수 있는 정신세계의 포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시간에 쫓겨 라면 끓는 시간도 기다릴 수 없어 스프 타 넣고 뜨거운 물 부어먹는 컵라면이 아니라, 싱싱한 야채에 두부 툭툭 짤라 넣고 남편 퇴근시간 맞춰 불 조절하며 정성껏 끓인 아내의 된장찌게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