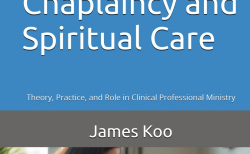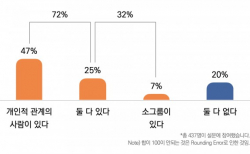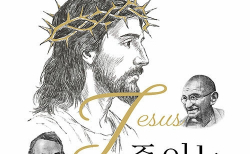독서와 여행은 짝이다. 여행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독서와 짝인 여행이 진짜 여행이다. 찌든 삶을 도피하기 위한 여행은 삶에서 일탈해 쉼을 얻기 위한 방편이다. 시간이 남고 돈도 남고 힘도 남아 가는 여행은 기름기 가득한 여행이다.
독서인은 여행인이다. 독서인이 여행을 하면 풀 한 포기, 바람 한 가닥에 의미를 찾는다. 독서인이 여행하는 곳은 독서의 결과 혹은 독서와 연관된 지역이다.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거기서 독서인은 지면과 상상에서 얻었던 지식을 실제로 보고, 현장에서 상상을 펼칠 수 있다.
칸트는 세계 여행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다독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상상했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칸트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목격자들의 증언과 독서 지식을 검토하면서 상상을 그렸을 것이다.
그러나 독서인이 독서 현장을 방문하면, 독서와 상상이 실제로 다가오는 희열(喜悅)이 있다. 그래서 독서인은 반드시 자기가 연구하는 현장에 가고 싶어한다.
고대 철학가들(탈레스, 플라톤)도 거의 대부분 여행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와 새로운 사상 체계를 이루었다.
우리는 쉽게 신대륙을 발견한 콜롬버스를 '여행의 아이콘'으로 생각한다. 신대륙을 찾는 여행은 매우 드라마틱하지만, 독서보다 욕망에 관련한다. 지금도 신대륙을 찾는 여행가들은 경제 영역 확장을 위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팔기 위해, 알래스카에 냉장고를 팔기 위해 하는 여행은 비즈니스이다.
스페인 산티아고(Santiago, 800km, 25km 한 달 걷기) 순례길을 '여행의 정석'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종교 순례지를 걷기를 갈망하는 것은 종교인의 정서와 감동적 스토리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토 종주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스토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종주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은 기계적이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종교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절한 스토리와 쉼과 교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한다면, 그 조용한 순례를 원한 순례자들은 다른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독서가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가의 세계를 직접 보며 스토리를 만들어 낸다. 독서가는 그 사상의 현장에서 살고 싶어할 정도로 여행을 좋아한다. 결국 여행이 삶이고 삶이 여행이 된다. 그래서 독서가 현장이고, 그 현장에서 멋진 인생과 인간 교제와 글과 사상도 탄생할 것이다.
한국 기독 지성들은 프란시스 쉐퍼를 만나기 위해 스위스 알프스 위에모(Huemoz) '라브리(L'Abri, 피난처)'를 방문했다. 멋진 알프스 산의 절경이 아닌, 쉐퍼를 보기 위해 알프스를 방문했었다. 쉐퍼의 책을 읽으면서 쉐퍼와 라브리를 만나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와 식사한 사람은 그 한 번의 식탁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경험담을 듣기 위해서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도 있을 것이다.
독서와 여행은 짝이다. 칼빈을 많이 읽으면 제네바에 가고싶어질 것이고, 칼빈이 앉았다는 의자를 보면서 그의 숨결을 느껴보려 할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터키, 그리스 등을 여행하고 싶어 할 것이다.
뜨거운 여름, 여행이 아닌 바캉스(避暑)가 떠오른다. 나는 해수욕장으로 피서(避暑) 가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은 더 뜨겁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억으로는 지리산 계곡이 가장 시원했다.
에어컨 기술이 좋은 이 때, 도서관 서비스가 좋은 이때, 피서를 해수욕장이나 계곡으로, 아니면 해외 휴양지로 꼭 가야 할 필요는 없다.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고, 시원한 봄, 가을에 독서의 현장으로 여행을 떠나 보자. 내가 좋아했던 사상가, 작가가 보았던 풀 한 포기를 감상하고, 바람의 숨결을 느껴보자.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주님의교회 담임, 크리스찬타임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