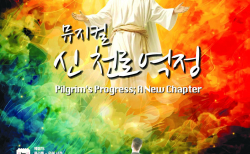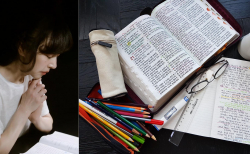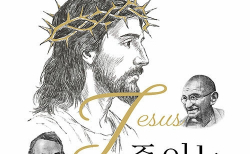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2015 종교개혁] 루터와 영국 종교개혁, 칼빈과 제네바 목사회
<꺼지지 않는 불길>, <꺼지지 않는 불 종교개혁가들>, <종교개혁가들과 개혁의 현장들> 등 최근 본지에 소개된 종교개혁사 또는 종교개혁가 관련 도서들은, 그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결같이 마지막 부분에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이신칭의>는 아예 "이신칭의 교리가 현대인들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일부 현대 신학자들의 지적을 전제로 이를 변증하고 있다.
2년 남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 준비가 이곳저곳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500년이나 지나다 보니' 종교개혁을 부르짖던 당시 그들의 모습을 오롯이 재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종교개혁주간을 맞아, 당시 종교개혁가들의 구체적인 행적이나 사상들을 보여 주는 도서들을 소개한다.
◈영국의 종교개혁과 루터의 이신칭의
 |
루터의 유산
칼 R. 트루먼 | CLC | 448쪽 | 23,000원
제목을 읽고 누구나 떠올랐던 내용들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영국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주요 인물들의 생애와 신학, 저서들을 다루면서, 이를 루터의 신학, 특히 '이신칭의'의 구원론과 비교하고 있다.
<교리와 신앙>, <종교개혁의 유산> 등이 국내으로 소개된, 개혁주의 신학자인 저자가 영국 종교개혁가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물론 그가 영국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50년 전만 해도 그들을 '신학자'보다는 '16세기 영국 종교 갈등의 난폭한 주범들'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학은 무시당했고, 그저 유럽 대륙의 개혁가들을 모방한 정도로만 생각됐다는 것.
영어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을 비롯해 존 프리스(John Frith), 영국 종교개혁에서 가장 뛰어난 루터파 신학자 로버트 반즈(Robert Barnes), '복장 논쟁'으로 알려진 청교도의 아버지 존 후퍼(John Hooper), 존 브래드퍼드(John Bradford) 등, 이 책이 소개한 영국의 종교개혁가 5인은 모두 '순교자'들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개혁가들은 신학적 '유리알 게임(glass-bead game)'이나 즐기던 학문의 상아탑들이 아니라, 자기 시대의 사건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었다"며 "그들에게 있어 신학은 개인적일 뿐 아니라 심오한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었고 기꺼이 궁극적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
| ▲마틴 루터. |
<루터의 유산>은 이들 5인을 간략히 소개하고 교부 신학과 스콜라 신학, 롤러드와 인문주의 등 이들이 종교개혁에 나서게 된 지성적 배경들을 살핀 다음, 루터를 비롯해 필립 멜란히톤과 칼빈을 포함한 개혁주의 등에서 받은 직접적 영향들도 고려하고 있다.
저자는 헨리 8세 시대의 틴데일과 프리스, 반즈의 경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칭의의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율법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으로 보는 면이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후 에드워드 6세와 메리 여왕 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인 존 후퍼와 존 프래드퍼드에 와서는 이러한 구원론 논쟁의 중심 주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신칭의가 공식적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 이 때는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뜻과 죄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주요 논제가 됐고, 각자의 견해가 다양해진다.
저자는 이신칭의 교리와 성경 번역 사역 등을 근거로 "최초 영국의 종교개혁 신학은 넓은 의미에서 루터의 유산"이라고 말한다.
◈제네바 회의록으로 본 '목사 칼빈'
 |
칼빈과 제네바 목사회
임종구 | 부흥과개혁사 | 632쪽 | 30,000원
"제네바 목사회 회의록에 따른 칼빈은 위대한 책 한 권을 쓴 신학자도 아니요, 성경을 해설한 단순한 설교가 내지 주석가도 아니며, 마냥 논쟁을 즐기는 거친 싸움꾼도, 욕망에 사로잡힌 정치꾼도 아니다. 그는 자신의 개혁적인 종교 이념의 승리를 위해 제네바시 당국과 때로는 대화하고 타협하며,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목회신학자다. 이렇게 그는 초기 정치철학자에서 목회신학자로 이동한 셈이다(박건택 교수)."
'제네바의 목사' 존 칼빈에 대해 파헤친다. 주요 원천은 '제네바 목사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치리회 회의록', '시의회 회의록', 그리고 주요 서간문들이다. 근대를 열었던 개척자에서 제네바의 독재자, 심지어 살인자로까지 묘사되는 칼빈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로잡기에 앞서, 그 역시 지역교회 목회자인 저자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칼빈 연구는 개혁자의 주저를 중심으로 한 교리적 접근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이 책에서 "신학연구 방법론에서 역사적 비평, 본문 비평, 교리적 비평을 기본으로 상정할 때, 그동안 칼빈 연구는 교리적 비평만이 선행되고 고착됨으로써 개혁자가 지닌 다면적 성향을 드러내는 데 한계를 가졌다"며 "그러나 서간문과 설교, 주석, 소논문들과 제네바의 각종 회의록 같은 자료들에 접근이 허용됨으로써 그의 신학과 실제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 기회가 늘어났다"고 취지를 소개하고 있다. '기독교 강요'가 제네바의 신학이라면, '목사회 회의록'은 제네바의 현장이라는 것.
칼빈은 16세기 제네바 목사회 회장으로서 목사회를 대표하여 치리회에 참여했고, 시의회를 방문했으며, 아카데미를 세웠다. 공적 구제 시스템인 종합구빈원과 민간 구제 시스템인 프랑스 기금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치리회는 목요일, 목사회는 금요일 모임을 가지면서 제네바의 개혁을 이끌었다. 저자는 목사회 회의록을 <기독교 강요>와 비교하면서 둘의 간극을 좁혀 나간다.
저자는 "목사회 오전 회합의 결과물이 칼빈의 방대한 주석의 배경이 되었고, 오후 회합의 결과물이 취리히 협약을 비롯한 교리의 일치와 발전이었다"며 "목사회는 제네바 각 의회에 접촉했고 각 기관에 적입자를 추천했으며, 각 종교개혁 도시와 서신을 교환하면서 각 교구에 파송할 목회자를 추천하고 그들을 견책하고 관리했다"고 분석한다.
 |
|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끌며 목회했던 도시 제네바. ⓒ크리스천투데이 DB |
칼빈은 교회 건설의 중심에 목사의 직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개혁이란 단순히 성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회 건설을 위해선 목사를 바르게 선출하고 검증해 적법하게 임직해야 했다. 무엇보다 교리의 일치와 바른 신학을 갖고, 목사의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장치들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목사회는 신학의 창구 역할을 했는데, 일련의 필요가 금요일 주간성경연구모임에서 구체화됐다. 그러나 목사회의 현장은 교회가 국가에 의해 깊이 통제된다는 결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책은 이러한 목사회에 대해 일반·실천·신학의 관점에서 '도시의 신학', '이중 통치에 있어 위정자의 검에 대한 적용', '권징을 통한 열쇠의 사용', '개인의 신념에 있어 속박과 자유', '신학과 윤리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그에 앞서 제네바에 도착하기 전, '인문주의의 모유'를 공급받은 기간부터 그의 생애를 '죽음'이라는 메타포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연구의 배경을 다원성과 정치성, 근대성이라고 밝히면서, 제네바의 종교개혁과 제네바 목사회의 의미를 최종 결론에서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16세기 제네바 상황을 21세기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소위 '개혁주의'에 대한 막연한 접근이 아닌, 제네바의 허와 실을 공정하게 살피고 신학적 피상성을 실효성으로 전환하는, 교회를 위한 봉사로서의 '신학함'이 요청된다"고 제언했다.
또 "목사회가 제네바의 통치 이념을 제공했듯, 교단 신학교와 목사회가 교단 신학을 발전시키고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일과 목사들의 지속적 연장 교육을 통해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참된 목회신학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