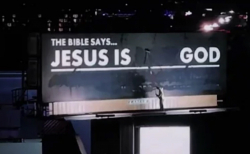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가끔씩 혼자 생각하거나 정말 친한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나누지만, 차마 공개적으로 꺼내지 못하는 ‘금기어’가 책이 되어 나왔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Why Johnny Can’t Preach-The Media Have Shaped the Messengers·홍성사)>.
저자 데이비드 고든은 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짧은 글’을 썼다. 그만큼 절실하고 긴박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북미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루터교단이나 감리교단 목회자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보수적 복음주의·개혁주의 교회들에 대한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설교의 평가 기준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객관적이며, 여러 경우 ‘평범한 설교자’조차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예배 후 들은 설교를 놓고 대화(나눔)를 이어갈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요점이나 주제를 알 수 없고, 설령 있다 해도 본문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적용할 거리를 찾을 수 없다. 성도들은 지쳐가고, ‘설교 잘하는 목사’에 대한 기대는 접은 채 다른 장점이라도 붙잡으려 한다.
그가 제시하는 설교학의 ‘교과서’는 로버트 루이스 대브니의 <성경 수사학 강의>에 나오는 설교의 일곱 요소다. 충실성, 통일성, 복음주의 어조, 교훈성, 역동성, 영향력, 짜임새. 가장 간단한 테스트도 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지, 짧아졌으면 좋겠는지 묻는 것’이다.
저자는 원인을 신학교가 아니라, 목회자 후보생들에게서 찾는다. 텍스트를 각종 영상미디어가 대체해가는, 책맹(冊盲) 문화를 속절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 해답은 간단하다. 책을 가까이 하라는 것. 특히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의 글을 ‘정독으로’ 많이 읽고,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한다.
읽었으면 써 봐야 한다. 지금은 100년 전에 비해 글쓰기 기회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편지를 쓰면서 쓸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고 일정한 분량으로 내용을 제한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던 그때와 같은 기회가 없어졌으므로, 매일의 삶을 성찰해 보는 일기쓰기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는 일도 괜찮다.
저자는 또 도덕주의와 요령을 가르치는 설교, 자기성찰과 사회 복음(이른바 문화 전쟁)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설교자라면 텍스트를 정독하는 것, 짜임새 있게 소통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식별하는 것 등 세 가지 감성은 계발해야 한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설교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작업을 부단히 실행하는 일도 필요하다.
저자 데이비드 고든은 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짧은 글’을 썼다. 그만큼 절실하고 긴박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북미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루터교단이나 감리교단 목회자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보수적 복음주의·개혁주의 교회들에 대한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설교의 평가 기준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객관적이며, 여러 경우 ‘평범한 설교자’조차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예배 후 들은 설교를 놓고 대화(나눔)를 이어갈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요점이나 주제를 알 수 없고, 설령 있다 해도 본문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적용할 거리를 찾을 수 없다. 성도들은 지쳐가고, ‘설교 잘하는 목사’에 대한 기대는 접은 채 다른 장점이라도 붙잡으려 한다.
그가 제시하는 설교학의 ‘교과서’는 로버트 루이스 대브니의 <성경 수사학 강의>에 나오는 설교의 일곱 요소다. 충실성, 통일성, 복음주의 어조, 교훈성, 역동성, 영향력, 짜임새. 가장 간단한 테스트도 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지, 짧아졌으면 좋겠는지 묻는 것’이다.
저자는 원인을 신학교가 아니라, 목회자 후보생들에게서 찾는다. 텍스트를 각종 영상미디어가 대체해가는, 책맹(冊盲) 문화를 속절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 해답은 간단하다. 책을 가까이 하라는 것. 특히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의 글을 ‘정독으로’ 많이 읽고,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한다.
읽었으면 써 봐야 한다. 지금은 100년 전에 비해 글쓰기 기회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편지를 쓰면서 쓸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고 일정한 분량으로 내용을 제한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던 그때와 같은 기회가 없어졌으므로, 매일의 삶을 성찰해 보는 일기쓰기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는 일도 괜찮다.
저자는 또 도덕주의와 요령을 가르치는 설교, 자기성찰과 사회 복음(이른바 문화 전쟁)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설교자라면 텍스트를 정독하는 것, 짜임새 있게 소통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식별하는 것 등 세 가지 감성은 계발해야 한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설교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작업을 부단히 실행하는 일도 필요하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