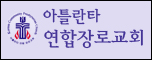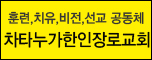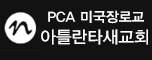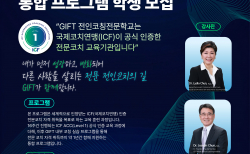노르웨이의 숲, 왠지 낯선 듯 낯설지 않게 들린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의 일본어 원제목이 바로 “노르웨이의 숲’이다. 소설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한다. “비행기가 멈춰 서자 금연 사인이 꺼지고 천장 스피커에서 나지막이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 오케스트라가 감미롭게 연주하는 비틀즈의 『노르웨이의 숲(Norwegian Wood)』이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늘 그랬듯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마구 뒤흔들어 놓았다.”
비틀스의 노랫말에 나오는 노르웨이의 숲은 노르웨이산 나무로 만든 싸구려 가구를 의미한다고 한다. 하루키는 뭐라고 특정할 수 없는 모호함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노르웨이의 나무”는 모호함이 아닌 진짜 노르웨이의 나무와 삶에 관한 책이다.
책의 부제는 ‘북유럽 스타일로 장작을 패고 쌓고 말리는 법’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책에 대해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는 방법에 대한 간결하고 우아한 책’이라고 말했다. 저자인 라르스 뮈팅(Lars Mytting)은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언론인이다. '노르웨이의 나무'는 출간하자 마자 유럽 전역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은 장작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저 장작 패기에 대한 감성만 늘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설명한다. 땔 나무의 종류와 도끼와 톱 같은 연장들, 장작을 쌓고 말리는 방법과 불 피우는 요령, 난로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숲으로 끌어들인다.
북유럽에서 난방용 장작을 준비하는 것은 낭만이 아니라 여전히 삶의 일부분이다.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는 혹한기에는 전기나 석유, 가스는 때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무는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불이 붙는다. 믿음직한 최후의 보루로서 나무는 지금도 그들의 생명을 지킨다.

노르웨이의 연간 나무 소비량은 150만톤이다. 60센티미터 길이의 장작을 1미터 높이로 쌓을 경우 장작더미의 길이는 7,200킬로미터로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의 중심부까지 이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노르웨이 전체 나무 수량의 0.5퍼센트도 안된다.
나무는 탄소 중립적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다. 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무는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러나 문제는 나무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무는 조만간 죽어서 썩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무를 태울 때와 같은 양의 이산화 탄소가 배출된다. 그러므로 나무 난방은 온실 가스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저자는 이런 숲과 나무들, 장작을 패고 쌓는 모든 부분을 감성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사실은 엄청난 육체 노동을 수반한 고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늘 동경하는 북유럽 스타일의 삶이 축복받은 휴양지의 여유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직장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듯, 그들도 역시 살기 위해서 장작을 패며 노동한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이 아닌 것을 그저 막연히 동경하며 현실을 저주한다.
우리도 불과 몇 십년 전 까지만 해도 지게지고 나무해서 아궁이에 불 때는 시절이 있었다. 노르웨이에서 장작을 패든 나뭇짐을 해서 나르든 힘들기는 매한가지였다. 지금은 따뜻함을 위해서 비탈진 산 길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누구도 지금이 그 때보다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가는 느낌이다.
삶은 나무를 패는 것과 같다. 하루 하루의 삶이 한 조각의 장작이 되어 인생더미에 쌓인다. 그리고 수분이 마를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좋은 땔감이 된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린 이미 노르웨이의 숲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