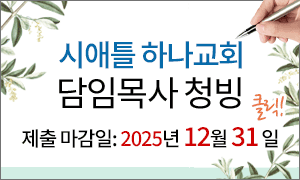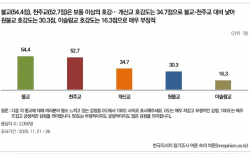어느 방송사 앵커의 브리핑이 연일 화제입니다. 거창하거나 엄청난 특종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난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어느 날, 그 앵커의 브리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나는 '흙수저'라는 말이 싫다." 이른바 흙수저 담론이 불거졌을 때. 한 청년의 글이 있었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 늘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우리 부모님이 '흙수저'라는 말을 몰랐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알게 되면 자식에게 그 흙수저를 쥐어준 것은 아닐지, 자책하실 것만 같아 그 단어가 싫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청년은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좋은 흙을 받았다.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흙."
그러나 이 청년의 소망과는 달리 세상은 흙수저, 금수저 논란을 더욱 무성하게 만들어 내고 있는 중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부터 출신 유치원과 부모의 직업이 거론된다는 기막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하시노?" 1980년대 영화에나 등장했던 그따위 질문이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에는 버젓이 생활수준 상·중·하·극빈, 이런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실세 정치인의 말 한 마디에 서류전형에서 2,299등이었던 그 정치인의 인턴사원이, 면접에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25대 1의 경쟁률을 뚫어냈다면, 그 인턴에게는 동화 같은 이야기이되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잔혹사에 틀림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새벽에 들어오는 아이의 추운 발소리를 듣는 애비는 잠결에 귀로 운다."
나의 부모님만큼은 흙수저라는 말을 몰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던 그 청년. 그러나 이미 그 말을 들어버린 부모님, 이 땅의 힘 없는 부모들은 모두 잠든 깊은 밤, 소리 죽여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통곡의 소리가 교회 안에도 들려옵니다. 많은 교회들이 덩치를 키우고 재정을 불리기 위해 가진 자를 반겼으며 있는 자들을 환대했고, 부한 자들의 친구를 자청했습니다. 한 지역의 가장 큰 건물이 교회라면 자랑스러울까요?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가 큰 자인지 겨누던 제자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제 한몸 살기 위해 마침내 예수를 배신하던 그 참담한 베드로와 같은 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교회들은 권력과 재벌의 입을 대신하면서, 음지에서 희생되고 신음하는 이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이른바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초대형교회가 즐비한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는 한국교회의 수준입니다.
약자의 서러움을 이해하고 예수께서 흘린 눈물을 공감하며 나누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등지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지 못해 등을 돌리는 이들의 뒷모습을 보는 일은 슬프고도 욕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확연히 다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대로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의 아픔에 참여하여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이른바 예수쟁이들이 할 일이고 교회가 보여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가을 햇살처럼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성호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포항을 사랑하는 교회' 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