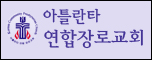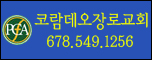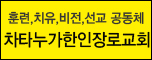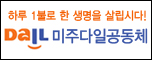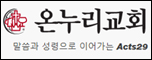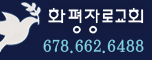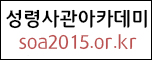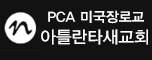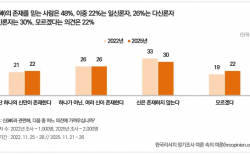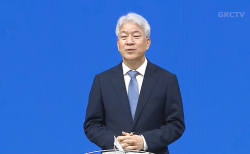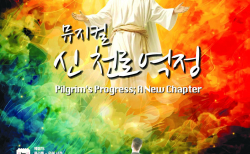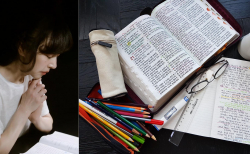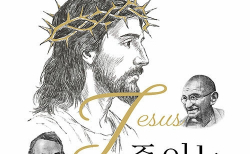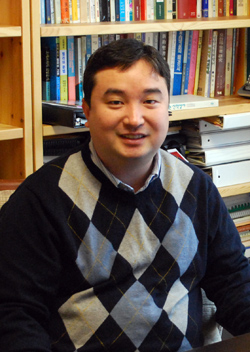
볼 것 없다던 장년 세대가 다시 TV 앞으로 다가서고 있다. 아이돌 가수들의 헐벗기 경쟁이 아닌,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와 그 때 그 시절 스타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반갑다.
무한도전의 토토가 열풍으로 시작된 90년대 전성시대다. 그 때야 말로 우리나라가 가장 잘 나가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 지표상으로는 지금이 훨씬 낫겠지만 몸에 와닿기로는 역시 그 시절이 좋았다.
오랜 유신과 독재의 그늘이 사라지고 민주화의 첫 열매를 맛보던 시기, 봄날 대학 캠퍼스에서 최루탄 냄새 대신 벚꽃 향기를 맡을 수 있었던 때였다. 80년대 선배들은 방학 때 농촌으로 떠났고, 90년대 후배들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 배낭 여행을 떠났다.
대학 등록금이 학생들의 숨통을 틀어 쥐지도 않았고,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도 아니었다. 배부름에 감사하는 세대가 아닌 풍요를 일상으로 생각한 세대, 미래 보다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첫 세대였다. '개발 도상국'이라는 딱지를 떼는 게 국가적 사명이었던 80년대를 지나,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아닐까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던 시대였다.
물론 I.M.F. 전까지의 얘기다. 90년대 단 꿈을 꾸던 우리에게 I.M.F.라는 자명종은 고막을 찢어 발기고 영혼까지 흔들어댔다. 정년 퇴직보다는 해고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지고, 끊임없는 자살 소식이 무덤덤해지기 시작한 때도 그 무렵부터였다.
뜬 구름 같았던 '세계화'라는 단어가 무지개가 아니라 덪이란 걸 알게 되었고, 우리가 체급을 높일 때까지 숨을 고르고 있던 헤비급 선수들의 예고 없는 강 펀치로 얼굴이 바닥에 닿아있던 끔찍했던 그 사건으로, 참 좋았던 시절은 그렇게 깔끔하게 잊혀졌다.
그런데 그 90년대가 부활했다. 왜? 단지 그리움 때문일까? 그렇다면 70-80년대는 안 그립고 유독 90년대가 그리운 까닭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넉넉하면 미래를 꿈꾸고 현실이 불안하면 과거를 회상한다. 오늘 배가 고프면 내일도 배 고플까봐 불안하다. 그저 예전에 배터지게 먹었던 생각만이 오늘의 배고픔을 달래는 방법이다.
90년대에 대한 과도한 열광은 불황의 서막이다. 잃어버린 십 년이 이십 년이 되고 지금까지 끊임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일본이 그렇게도 잘 나갔던 80년대를 그리워하듯,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90년대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우리는 일본의 장기불황과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뭐가 다른지는 속 시원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경기침체, 저 출산, 기둥뿌리 흔들리는데 간판만 바꿔다는 무슨 무슨 노믹스 같은 헛다리 경제 정책 등 아주 빼다 박았다
시장은 국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들은 비웃고 있다. 가계 부채는 시한폭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심지만 갈아 끼우는 격이다. 주류 경제학자와 교수들은 침묵하고 있으며, 예측은 없고 뒷북이나 치는 평론만 있을 뿐이다.
앞으로 남은 뻔한 수라고는 '애국심 마케팅' 밖에 없을 텐데, 이것은 '묘수'가 아니라 '악수'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만의 기업이 아니라는 뜻이다. 낙수 효과는커녕 물방울이라도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대기업들은 대놓고 글로벌화를 외치는데 정부가 태극기 다는 데만 열중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타계책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도 이미 옛날에 써 먹었던 방법 아닌가? 금 모이기 운동, 바이 코리아 등 경제정책도 돌려 막기 할 것인가?
그나마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는 남북 경제 협력뿐인데 북한의 '최고존엄'은 요즘 전쟁 놀이에 흠뻑 빠져 있고, 남한은 종북몰이에 한참이다. '대박'이기는 한데, 당첨도 되기 전에 복권부터 찢어버린 격이니 말해서 무엇 하랴.
90년대의 단꿈을 I.M.F.가 흔들어 깨웠듯이, 그 익숙한 노래가 쓴 맛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먼저 정부가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한다. 성장 레이스에 숨 차오르는 중국에 기대거나 아예 경제 환경 자체가 다른 미국, 북유럽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때는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는 일본을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