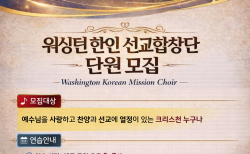피아노 연주자가 막 무대에 오를 무렵, 객석 중간쯤에서 앉아있던 아빠와 엄마는 순간 당황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꼬마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덜컥하는 가슴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아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오, 마이갓! 어떻게 이럴 수가?" 아이는 어느새 무대 위로 올라가서 천연덕스럽게 연주자대신 자리에 앉아 그 고사리 손가락으로 새하얀 건반을 통통 때리며 유치원에서 배움직한 음계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 어이없는 해프닝에 청중들은 멍한 시선으로 말문이 막혔고 아빠와 엄마는 어찌할 줄 모르며 당황하고 있었다. "여보! 저 애를 빨리 좀 어떻게 해봐요!" 아빠는 얼굴을 감싸 안은 체 엄마를 다그쳤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연주직전의 이 돌발 상황에서 드디어 그날의 주인공인 피아니스트가 무대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무대를 감히 독자치하고 있는 발칙한 꼬마를 보며 잠시 주춤거리다가 이윽고 그가 놀라지 않도록 그의 등 뒤로 다가선 피아니스트는 꼬마가 튕기는 왕초보의 음반사이로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그의 섬세한 하모니를 넌지시 끼어 넣고 있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순간 장내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피아노 협주곡을 감상하며 잔잔한 감동에 빠져 버렸다.
마치 세 살배기 어린아이의 낙서에 피카소의 현란한 추상화가 덧칠해지면서 새로운 장르의 걸작이 만들어 지는 감동의 순간이라고나 할까. 얼마 전 영화관에서 교육용 홍보물로 잠깐 보여준 '격려 (Encouragement)'라는 장면이다.
자녀들의 교육열에 일생을 바치려 드는 우리들의 심리는 서울시내의 학원가들 사이에서 1년 연봉이 40억 원을 훌쩍 넘는 스타급 영어강사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자녀들의 장래가 걸렸다고 확신하는 우리 부모들의 극성이 자아내는 오늘 한국의 자아상이다. 이곳 미주 한인사회에서 조차 12학년생을 둔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대학진학 문제로 노심초사한다.
아이들의 장래가 걸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선택은 당연히 장래 유망한 직종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강요하며 모든 선택의 기준을 성공된 장래를 보장하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려 든다. 아이들의 적성과 그들 삶의 주관성에 의한 선택은 박탈당한 체 일찌감치 부모들에 의해서 길들여진 금전만능의 심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자식의 성공된 미래를 위해서 앉으나 서나 자녀교육에 집착하며 아이들을 맞춤형 교육의 공산품으로 만들려 하는 부모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팽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내로라하는 학벌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가정의 축복을 제대로 다스릴 줄 아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한 인성의 결여 때문일까?
한국 전쟁 후 급격한 출산 붐을 타고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화, 외환위기는 격변의 세월을 겪어온 이른바 '58년 개띠'로 대변되는 베이비붐 세대들, 그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높은 스트레스와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삶의 질의 퇴보는 다름 아닌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이 초래한 심리적 결과물이다.
부모의 욕심과 강요로 만들어 지는 학벌위주의 교육은 사람을 더욱 목마르게 할뿐, 오히려 자녀가 격려를 통한 자율적 삶을 만들어 갈 때 사람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달아야 할 때이다. 사람이 대학은 나와야지 인간답게, 그리고 폼 나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회는 머지않아 기형적 경제구조를 낳게 될 것이며 이미 그러한 현상이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어머니는 밭에 나가고 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진종일 동생과 함께 논두렁을 따라 메뚜기 잡던 우리 세대들도 이만큼 인간답게 사는 바에는, 지금 이 정도의 환경 속에서 부모사랑 듬뿍 받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평안히 자라만 준다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강압적 교육은 그들의 행복한 삶의 가능성을 미리 박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