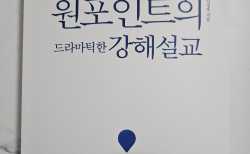요즘 교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귀를 압도하는 것은 ‘소리’다. 강력한 앰프로 증폭된 음악은 은혜보다 불편함을, 감동보다 귀를 막고 싶은 충동을 불러온다. 예배가 마치 공연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예배란 본래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 함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크를 든 찬양팀의 목소리가 회중의 목소리를 덮어버리면서 성도들은 점점 ‘청중’이나 ‘감상자’가 되고 있다. 예배가 공연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라 부를 수 없다.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시작됐을까. 70년대 이후 록·포크 음악이 예배에 들어오면서 전기 기타, 드럼, 키보드 같은 악기들이 쓰였고, 80~90년대 한국 교회의 대형화와 CCM 열풍 속에 워십 밴드가 등장했다. 자연스레 ‘큰 소리’가 예배의 표준처럼 자리 잡았다.
문제는 큰 소리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교회의 예배당 음향은 90~100데시벨을 넘는다. 이는 지하철이나 공장 소음 수준으로, 청력 손상은 물론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심혈관 질환까지 불러올 수 있다. 예배의 소리가 은혜가 아니라 소음 공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볼륨을 높인다. 감각적 자극에 익숙해지면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를 잡기 위해서”라는 명분도 내세운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첫인상을 “시끄러운 곳”이라고 말한다. 정작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말이다.
예배의 본질은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 울림이다. 절제된 음량 속에서 회중이 함께 부르는 목소리에 더 큰 힘과 감동이 있다.
앰프는 도구일 뿐이다. 그것이 예배의 중심을 왜곡하고 압도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회는 ‘더 크게’가 아니라 ‘더 함께’에 주목해야 한다. 앰프의 볼륨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최병철 박사(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대학원에서 25년간 음향과 음악심리학을 가르쳤다. 예배음악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chmovement.org에 소개하고 있다. 연락처는 (913) 283-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