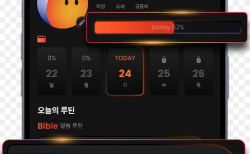시대를 읽어라
2019년 9월 1일자 중앙일보 인터넷 판의 기사다.
"교수 빼고 주위 사람과 사회는 다 변했는데, 그걸 모르는 교수들이 많더라고요. 갑의 둔감함이라고 할까"
최근 막말과 성추행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파면되는 교수들을 보며 한 국립대 교수 A씨가 전한 말이다. A교수는 "아직도 주변 동료들을 보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며 "교수들이 세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과연 교수만 그럴까? 이를 설교자의 설교와 대입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청중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설교자들은 20세기 방식으로 설교를 한다. 교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설교를 한다. 설교가 이미 변했어야 했는데, 여전히 이전 방식대로 하고 있다. 변한 세상과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설교자 입장에서 하고 방식의 설교를 한다.
교인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동시대의 문화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설교자는 교인들이 몸담고 살아온 문화와 사회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와 세상의 흐름을 설교에 반영해야 한다.
필자가 설교자들을 오랫동안 가르친 경험에 따르면, 설교자들은 설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므로 시대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시대와 무관하다. 하지만 설교는 시대와 유관하다. 설교하는 세상이 변했다. 설교를 듣는 교인도 다르다. 이는 설교는 시대와 시대의 사람들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가 읽은 책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강해 설교'를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한다. "설교는 본질적으로 상황화를 요구하는 행위라고 한다. 이는 설교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요, 성경이야기를 청중의 세상 속으로 이동시켜 그것이 청중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교는 상황화가 요구된다. 21세기 설교는 21세기에 맞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설교자는 시대의 흐름과 동시대의 문화를 읽어내야 한다.
그 책에서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섯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문화적 민감성과 연민의 태도로 청중에게 다가가라.
둘째, 진정성을 추구하라.
셋째,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접근하라.
설교는 웅변술로 하지 말고 대화형식으로 하라. 적절한 유머 사용 하라. 지나치게 종교적 냄새(전문 신학 용어, 헬라어 사용, 우리만의 용어 등)를 풍기지 말라.
넷째, 내러티브 설교를 도입하라.
다섯째,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 다양한 소품을 사용하라.
위의 주장처럼 설교는 시대를 담아내야 한다. 시대와 함께 가야 한다. 그럴 때 설교는 시대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설교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녔다. 하지만 그 가치가 진가를 드러내려면 시대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결될 때다. 설교는 언제나 교인의 고민, 아픔, 원함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설교자는 교인의 영적인 갈급함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리하면, 설교자는 시대를 읽어내야 한다. 설교에 교인들의 문제가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설교는 한 귀에 들어와 다른 한 귀로 흘러가지 않고 교인의 삶의 정황과 마음에 머문다.
교인은 아주 소중하다
오래 전부터 고객에 대해 들었던 말이 있다. "고객은 왕이다"
최근에 고객에 대해 들은 말이 있다. "고객은 신이다"
이 말은 박창규의 책 《콘텐츠가 왕이라면 컨텍스트는 신이다》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만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고객을 소중히 여긴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인을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다. 2019년 9월 1일자 기사에서도 지난 10년간 주일학교 학생 수가 41% 감소했다고 한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 비즈니스 세계처럼 교인을 왕처럼 대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종인 자신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한다. 지금 시대의 설교자는 교인을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비즈니스 세계는 문화가 상향식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군대식 문화처럼 하향식이다. 비즈니스 세계가 상향식으로 바뀐 것은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다. 위기가 증대되는 교회도 살아남으려면 교인을 눈에 보이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지금 목회 현장은 부흥은 커녕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특히 작은 교회는 생존이 화두다. 10년 전에는 교회 부흥이 어렵다고 말했다. 5년 전에는 교회 재정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교회 존립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척교회 시 생존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은 설교가 시대와 교인과 무관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
관점에 따라 설교 글쓰기가 달라진다
관점에 따라 글쓰기가 달라진다. 성경을 읽는 관점은 세 가지다. 하나님의 관점, 본문의 관점, 교인의 관점이다. 여기에 한 가지 관점이 더 있다. 설교자들의 관점이다. 설교자들의 관점은 마치 '간탐' 식과 흡사하다. '간탐'의 뜻은 아래와 같다.
"욕심 많고 자비심이 없고 잔학하며 탐욕스러움을 뜻한다. 이를테면 자기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설교자의 설교는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이다. 교인이 듣기가 고통스럽다고 해도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확신해 바꾸지 않는다. 이는 성경을 자기 관점으로 읽기만 했기 때문이다. 이젠 설교하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설교자 관점에서 교인 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설교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설교자 관점으로 설교하게 된다. 반면 세상을 읽었다면 교인의 관점으로 설교를 할 것이다. 교인의 관점으로 설교를 하면 교인의 삶의 정황 고려가 필수다.
'설교가 들려진다'는 말은 관점이 교인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설교자는 기억해야 한다.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로 글을 쓰면 설교가 일방통행식으로 흐른다. 당위성의 설교가 되기 쉽다.
반면, 교인의 관점에 따라 쓰면 쌍방통행식으로 흐른다. 그럼 교인의 삶과 원함 그리고 마음이 담겨 설교가 들려진다.
전에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느낀 점이 있다. '상처를 주지 않고 할 말을 다한다.'
반면 필자의 설교는 정반대였다. '하고 싶은 말도 거의 못했는데 상처만 줬다.'
이는 저의 설교가 일방통행식 설교였기 때문이다. 설교가 쌍방통행식이 되면 내게 하는 설교가 된다. 내용이 강하면 상처가 아니라 회개와 반성을 하게 된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있는 이이기가 된다.
글을 쓸 때도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쓰지 않는다. 교인이 듣고 싶은 말도 고려한다. 이런 글은 감정이 담기지 않고 공감이 일어난다.
예전에 일본 교토를 여행한 적이 있다. 교토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신기한 장면을 보았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면 버스의 문이 열리면서 버스가 승객 쪽으로 주저앉았다. 승객 쪽으로 주저앉으면 승객들이 편하게 버스를 탑승한다. 버스 문이 닫히면, 버스 높이가 원래 상태가 된다.
교토는 버스도 승객의 편에서 생각해 높이를 낮춘다. 한낱 버스도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준다면 설교는 말할 것도 없다.
설교는 들려져야 한다. 들려지는 설교는 세상의 흐름을 읽은 설교다. 교인들의 정황을 살핀 설교다.

김도인 목사/ 아트설교연구원 대표(https://cafe.naver.com/judam11)
저서로는 《설교는 인문학이다/두란노》, 《설교는 글쓰기다(개정 증보)/CLC》, 《설교를 통해 배운다/CLC》, 《아침에 열기 저녁에 닫기/좋은땅》, 《아침의 숙제가 저녁에는 축제로/좋은땅》, 《출근길, 그 말씀(공저)/CLC》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