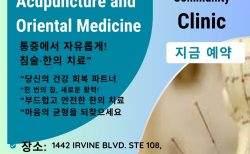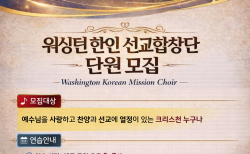독일 유학 중인 진규선 목사님이 지난 2009년과 2003년 국내에 방한한 바 있는 한스 슈바르츠(Hans Schwarz) 교수의 2013년 저작 「The Human Being: A Theological Anthropology」에 대한 리뷰를 보내 오셨습니다. 슈바르츠 교수는 1997년 템플턴상을 수상했으며, <마르틴 루터의 신학>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적 인간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자유로운가?', '인간의 성 문제와 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은 실증적 학문으로는 대답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다각도에서,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나름의 고심을 거친 생각이나마 나누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신학적 인간론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2013년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한스 슈바르츠(Hans Schwarz)가 바로 그러한 신학적 인간론을 다룬 「The Human Being: A Theological Anthropology」을 출판했다.
이 책의 구성은 위의 세 질문에 따라 3부로 구성돼 있고, 총 8장이다.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저자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에 대해 말한다. 인간을 두고 사용된 고대 히브리어(네페쉬, 바사르, 루아흐, 레브)나 헬라어(소마, 프쉬케, 사륵스, 프뉴마)가 종교적 개념과 함께 차분하게 설명되며,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등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이스라엘 종교와 기독교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로써의 인간이 다뤄진다.
그리고 현대 학문의 관점에서 본 인간을 소개한다. 저자는 우선 다윈 이후에 계속 발전한 공통 조상으로부터의 진화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저자는 창조과학, 지적설계의 입장이 상당히 편협함을 지적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설계에는 분명 진화적 유신론도 포함된다.)
그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인간에게 특별한 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저자는 말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생물학적 공통 조상의 문제뿐 아니라 흰개미나 박새(titmice), 침팬치 등을 보면 인간 사회의 전유물과 같은 언어, 전통, 심지어 문화까지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 행동은 어떠할까? 인간의 뇌는 진화에서 중요하게 지켜보아야 할 지점이지만, 다른 영장류와의 차이는 질(quality)에 있지 않고 양(quantity)에 있다. 그런 연관선상에서 인간의 잠재성이라는 부분도 과학적으로(신경학적, 유전학적, 행동학적, 사회학-철학적) 설명이 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기억력, 집행 능력, 정서, 식욕, 수면 등의 약학적인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약물들이 있다. 양로원의 많은 이가 돌봄을 목적으로 진정제를 투여받고 있다. 갈수록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리탈린을 많이 복용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비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70쪽)."
실존주의 철학의 한계와 마르크스, 그리고 신흥 종교
물론 저자는 생물학이나 유전학, 심지어 심리학 등이 기원, 발생, 생존 등을 넘어서 도덕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것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가진 않지만, 또한 철학적 설명도 얼마든지 등장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deger), 어니스트 베커(Ernst Becker), 쟝-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알베르 까뮈(Albert Camus)와 같은 실존주의자들의 논의를 언급한다. 그러나 슈바르츠는 이들이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렸지만,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이끄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한다.
일종의 유토피아를 혁신적으로 제시한 인물로, 저자는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를 꼽는다. 실제로 카를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이 이 책에서도 인용된다. "철학자들은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했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Die Philosophen haben die Welt nur verschieden interpretiert; es kommt aber darauf an, sie zu verändern)."
그런데 이 글의 출처는 '포이어바흐에 관한 글(Thesen über Feuerbach)'이다. 저자에 의하면, 루드비히 포이어바흐는 기독교를 인간의 산물이라 주장했는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당대의 사회적 산물(a social product)'이라고까지 파악했다.
마르크스는 유대-기독교, 즉 고대 종교가 주는 환상 속 행복(illusory happiness)이 아닌, 진짜 행복(real happiness)을 현실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르크스는 종교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했고, 포이어바흐가 종교를 인간의 산물이라 했을 때, 그때의 종교가 내포하는 점은 이 땅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투사임을 간과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한편,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는 네오-마르크스 철학자로써, 마르크스의 상당히 추상적이고 종교적이기까지 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를 추구하기 시작했다(예를 들면 행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일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 등). 또 블로흐에게 하나님이란 "알려지지 않은 인간성의 유토피아적 위격(utopian hypostasis of unknown humanity)"과도 같았다.
마르크스나 네오 마르크스 철학이 논한 노동이나 자유를 통한 인간 추구를 넘어서, 마르크스의 딸 로라와 결혼한 폴 라파르그(Paul Lafargue)는 「게으를 권리(Right to be Lazy)」라는 책까지 써냈다. 하지만 그는 사회 혁명으로는 소위 실낙원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파리 자택에서 아내와 함께 자살을 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신흥 종교들이 등장했다. 예를 들면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의 뉴에이지 운동(그의 책 「The Tao of Physics」, 「The Web of Life」 등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번역되었다)이 있다. 그의 책, 「The Tao of Physics(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에서, 그는 과학과 신비주의(mysticism)는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매릴린 퍼거슨(Marilyn ferguson)이란 인물은 「Aquarian Conspiracy(의식혁명이란 제목으로 번역)」이라는 책을 썼는데(카프라가 서문을 써 주었다), 거기서 "인간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지속적인 변혁과 초월에 열려 있으므로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런 신흥 종교 혹은 뉴에이지 사상가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와 특히 불안을 '일종의 영적 기술(certain spiritual techniques)'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바로 'Humanist Manifesto'이다. 이것은 "인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우리를 구원해줄 신적 존재(deity)는 없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야만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고찰들 끝에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이 세계의 개선에 그칠 수 밖에 없는지 비판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한다.
 |
| ▲국내에서 강연중인 한스 슈바르츠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
뇌과학의 발견 속에도, 인간은 여전히 자유로운 존재인가?
그리고 2부에서는 인간은 자유로운지, 그렇다면 악의 문제는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 여러 학문적 입장에서 논한다.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이라 해당 분야에 비전문가인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다소 간단하다.
분명히 이 논의에서는 뇌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고, 정신분석학적 주장들도 함의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다. 물론 뇌는 최소한 수백억개의 서로 연결된 신경세포로 구성돼 있고, 이 뉴런들은 엄청난 수의 시냅스들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뇌활동을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벤자민 리벳(Benjamin Libet)의 실험은 인간이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전 이미 뇌가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독일의 생리학자 게르하르트 로트(Gerhard Roth)가 말했듯 "주체의 의식은 신경학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말이 실제로 그런 의식이 존재한다는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자의 강조점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라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악'의 문제는 다소 병리학적으로 다뤄진다. 저자는 프로이트의 에로스 충동과 더불어 타나토스 충동의 설명을 상당히 강조하는 듯 보이고, 그 중에서도 자신을 향하든 외부를 향하든 인간의 '공격성(Agressiveness)'이 어느 정도는 '본능'에 기인한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카를 융이나 에리히 프롬의 추가적인 논의도 덧붙인다.
그리고 저자는 다시 신학 영역으로 돌아와 성경이 말하는 악, 그리고 신학사에서 다양하게 설명되는 악을 서술한다. 저자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죽음, 슬픔, 고통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고 가르치며, 이것을 벗어나는 신학적 설명은 오랜 세월 유지된 기독교의 주장은 아니다. 그렇다 해서 악과 죄, 죽음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 등에 대한 하나의 설명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서술하는데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한다. 그리고 루터와 에라스무스, 칸트와 리츨, 라우센부시와 라인홀드 니버 등으로 뻗어나가며, 기독교 신학 논쟁에서 이 사안의 윤리적 고찰과 사회적 고찰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서술한다.
또 바르트의 '무', 틸리히의 '소외 혹은 비존재', 판넨베르크의 '외부를 향해 열려있음(판넨베르크는 여기서 Exzentrizität, exocentricity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본래 수학용어이다)', 해방신학의 '불의(억압이나 착취 등,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그리고 페미니스트 신학에서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주디스 플래스코[Judith Plaskow], 수잔 B. 시슬스웨이트[Susan B. Thistlethwaite], 로즈마리 래드포드 류터[Rosemary Radford Ruether])' 등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여기서 저자는 특히 기독교 여성 신학자들은 권력을 가진 남성의 죄뿐 아니라 폭력과 불의에 일정 부분 지닌 여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성애 옹호 위해 성경에 호소? 바람직하지 못해
성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인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한다. 위 철학적 논의에서처럼 여기서 등장해야만 할 것 같은 이름들(예를 들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엘렌 식수,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주디스 버틀러 등)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성욕에 대해, 또한 그와 관련된 결혼에 대해 독신이나 금욕보다 우월하게 다루며, 전통적인 보수적 기독교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설명이 없다(남녀간 일부일처제). 또 동성애에 대해서는 매우 짧게 다루지만,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성경에 호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소명과 운명(개인의 내세 및 인류의 미래)이 언급된다. 저자는 환생이나 불멸, 그리고 과학 기술을 통한 현생인류 초월은 결국 죽음을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이며(즉 죽음을 미화하는 것은 인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 이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궁극적으로 성취할 것이라는 신학적 소망과 더불어 책을 마무리 짓는다.
신학적 인간론에서 진화, 동물, 심리, 뇌 등과 관련한 현대과학 등은 상당히 큰 문제다. 그리고 타 분야의 전문적 논의를 신학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은 여러모로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책은 그것들을 최대한 이해하고 수용하려 노력하고, 그런 토대 위해 신학적 인간론을 전개하며, 바로 그 신학적 인간론을 다룸에 있어 결국 인간만이 가진 특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유의지'를 긍정해야 하는 신학적, 윤리적 이유를 논한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 무엇보다 현대인일지라도 삶의 의미, 죽음 그 너머의 희망, 궁극적인 소망과 같은 것들을 종말론적·종교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
서두에 말했듯, 인간 혹은 인류를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길은 하나가 아니다. 하지만 신학적 인간론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인간론은 주로 조직신학의 여러 갈래 중 한 분과로만 여겨질 뿐, 그 자체를 거대한 주제로 삼은 신학 서술은 드물다.
자연과학이나 기술이 발달할 수록 더욱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처음 던졌던 질문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본서가 이 질문에 대해 신학적으로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
진규선 목사(번역가, 독일 유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