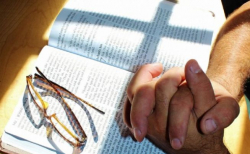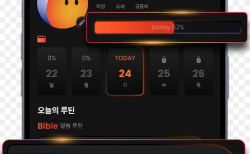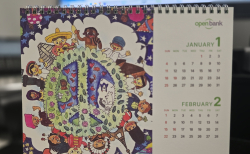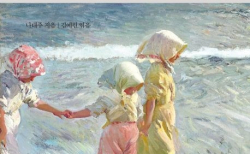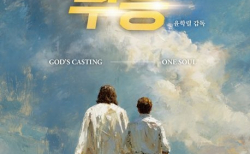로널드 헤커 크램 | 새물결플러스 | 2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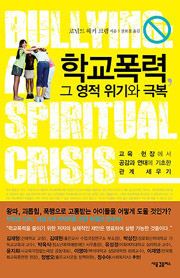
학교폭력은 이미 '국가적인 이슈'가 됐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특히 최소 수십 년간 활짝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인생들에게 뿌리까지 잘려나가는 듯한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은 여느 폭력보다 훨씬 심각하다.
<학교폭력, 그 영적 위기와 극복>은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조명하고, 삼위일체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기초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학교폭력을 "다른 사람이나 혹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갈망이 그 정반대의 결과를 일으키는, 외부로 표출된 영적 위기"로 바라보고 있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로 출발했지만, 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폭력은 그러한 '건전한 바람'이 죄에 의해 왜곡돼 나타난 현상이므로, 학교폭력은 사회학적·심리학적 방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학교폭력이라는 '영적 위기'에 대해, 저자는 서양에서 통용되는 자유방임적인 '관용' 대신 '공감(empathy)과 용서'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학교폭력을 '공감이 왜곡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 유형'이라고 지적한다. 공감은 자기와 타인, 그리고 자연 세계가 각각 본연의 존재를 참으로 이뤄가는 과정의 한 방법으로, 기독교적인 환대와 타인 혹은 이방인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가치이다. 공감은 단순히 남을 동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타인이 가진 '다름'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공감이 이뤄지지 않는 곳,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한 깊은 배려가 없는 곳에서 폭력의 씨앗이 싹트게 된다. 공감이 없는 곳에는 돌봄의 행위도 없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공감을 실천하지는 않지만, 남과 공감할 수 있는 예민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 가해자는 폭력 행위를 통해 고립된 느낌에서 초월해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짧은 순간 지속될 뿐이다. 가해자는 자기가 괴롭히는 '바로 그 사람(피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공감'을 가르쳐야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진정한 용서'에 대해 알려야 한다. 특히 용서란 이미 발생한 폭력을 잊어버리거나 그 결과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에 관련된 나 자신이 회복되고, 가해자인 상대방 역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한 관계적 실천 행위다. 용서는 자기와 타인들,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전환임과 동시에 '대화'이다. 용서는 서두를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며, 빨리 고치고 싶은 마음에 무언가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결정하는 것이다.
책을 통해 저자는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고, 공감과 용서를 학교와 가정, 교회와 직장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