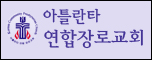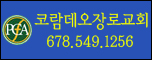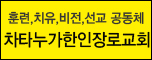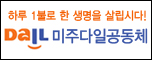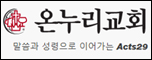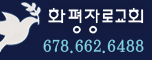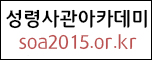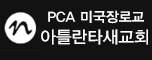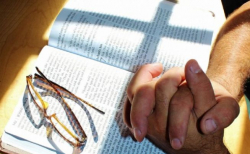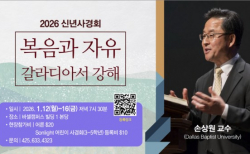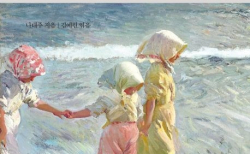‘새로운 한국교회’를 위한 20가지의 처방전이 담긴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새물결플러스)>가 발간됐다. 책은 ‘근본 정신 회복하기’, ‘교회 문화 직시하기’, ‘구조 개혁 시도하기’, ‘참여 방식 점검하기’ 등 4부로 구성돼 있다. 특히 1부 ‘근본 정신 회복하기’에는 김세윤·강영안·차정식·권연경 등 잘 알려진 학자들의 글이 실려 있다.
첫 테이프를 끊은, 신약학의 세계적 석학인 김세윤 교수(풀러신학교)는 한국교회 문제의 근원을 ‘신학적 빈곤’에서 찾는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실현하는 데 보이는 전반적 무능함과 일부의 심각한 부패의 근본 원인은 신학적 빈곤이며, 이는 복음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왜곡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 복음의 열쇠인 하나님 나라를 종말에나 오는 것으로 미루고 ‘하늘’로 쏘아올려 버림으로써, 그것의 이 땅에서의 현재적 의미를 묵과하는 것이다.” 칭의론을 법정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여 관계론적 측면을 무시하거나, 예정론의 의미와 의도에 대한 이해 부족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보니 전문 분야에서 상당한 지적 경지에 오른 그리스도인들도, 신앙과 지성을 통합하려는 노력 대신 신앙을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둔 채 원시적 이해만 갖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윤리가 부재하고, 선교에 대한 이해가 편협하며, 미신적 영성과 이단 사설에 쉽게 휩쓸리게 된다. 그 원인으로는 “기독교 신앙고백의 실존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고백에 따른 삶과 사역을 모색하는 신학적 사고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다. 김 교수는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를 황폐화하는 무책임한 자유주의 신학을 피하면서, 근본주의로부터 빠져나와 신학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영안 교수(서강대)는 한국교회에 대해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모이기, 헌금하기와 전도하기 등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라고 믿지만, ‘도덕적인 면’과 ‘상식적인 면’을 상실해 신뢰를 잃었다고 진단한다. 앞서 김세윤 교수와 비슷한 분석이지만, 그는 지성과 이성에 대한 오해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지성과 이성은 인본주의, 세속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 믿음의 삶에서 지성과 이성은, “우리의 의지나 감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차정식 교수(한일장신대)는 ‘빈곤한 설교’를 벗어나기 위해 “인문신학과 설교의 행복한 접속”을 제안한다. 차 교수는 이를 위해 △최소한의 기반으로 인간세계의 인문적 현상에 대한 상식 수준의 이해를 깔고 △대속적 구원신학의 전통에서 맥락 없이 숱하게 정당화됐던 가학적 고난과 폭력적 희생의 주제를 성찰하여 생명 향유적 지평으로 나아가며 △그 메시지가 사람살이의 다양한 현실 속에서 정치권력과 종교적 권위의 부당한 간섭으로 억압받아온 생명들을 구조적 족쇄로부터 해방시키는 선교적 과제에 민감해야 한다는 등 다소 난해한 방안을 내놓았다.
권연경 교수(숭실대)는 한국교회의 ‘윤리적 실패’의 근원을 ‘값싼 구원론’에서 찾는다. 2년 전 이미 <로마서 산책(복있는사람)>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는 권 교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표어에서 벗어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자’고 한다.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믿음으로 미래의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해 주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는 것. “선행적 선택에 조건이 없다고 해서, 그 선택에 목적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외에 다양한 인사들이 게토화된 언어, 사제주의, 공적 신앙, 신학교 구조조정, 성차별, 맘몬 숭배, 무속·상업적 성령운동, 목회자 납세 등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완상 전 부총리가 ‘복음과 성령의 공공성을 위하여’라는 서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