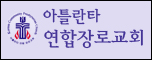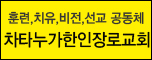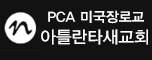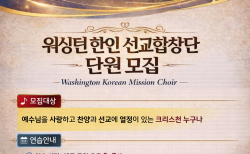양화진문화원 목요강좌에서 명예원장 이어령 박사가 ‘생명 찾기’를 주제로 라니어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에 대해 강연했다.
올해부터 ‘소설로 찾는 영성의 순례’를 주제로 목요강좌에 나서고 있는 이어령 박사는, 지난달 <레미제라블: 혁명인가, 사랑인가>에 이어 두 번째 강좌를 진행했다. 이어령 박사는 3년 전 한 인터뷰를 통해 ‘내 인생 한 권의 책’으로 <말테의 수기>를 꼽은 바 있다.
릴케가 지난 1910년 발표한 작품인 <말테의 수기>는 덴마크 귀족 출신의 젊은 시인 말테가 파리에서 죽음과 불안에 떠는 영락한 생활을 하면서 쓴 수기 형태로, 통일된 줄거리가 없다. ‘파리의 생활’, ‘죽음’, ‘시인과 고독’, ‘사랑’, ‘신(神)’, ‘탕아의 전설’ 등 54개의 단락으로 이뤄진 단편 수기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이어령 박사는 <말테의 수기>에 대해 “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아 오늘날까지도 이 오해로 ‘재미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사건이 등장하지도 않고 플롯도 없는 그냥 산문으로, 아름다운 영혼들을 만나보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릴케의 감성을 알려고 하지 못한 채, 평론을 읽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내면의 기록으로, 문학이 처음으로 많은 정보들을 소거해버린 채 엑스레이를 찍듯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이야기’와 ‘정보’의 차이를 논증하면서 ‘생명’에 다가갔다. 그는 “생명은 물질이 아니고, DNA와 같은 것”이라며 “씨앗은 사라져도 그 속의 DNA는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또 “성경도 천지창조부터 노아나 아브라함 등 모두 이야기로 돼 있지 않으냐”며 “그 이야기들은 겉으로 물질처럼 보이고 죽어있는 것 같지만, 말씀 속 DNA는 마치 2천년 전 씨앗이 다시 싹을 틔우듯 그 속에 생명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에만 집중한다”며 “정보란 아침에 탔다가 저녁에 내리고 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KTX 좌석번호와도 같은 것인데, 거기에만 집중해 그토록 갈망하고 아끼고 사랑하던 생명을 발견하지 못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말테의 수기> 첫 장면에서는 파리에 간 말테가 임산부를 본 느낌을 적어놓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파리에 생명이 있다고 모여들지만, 릴케는 여기서 천천히 죽어가는 도시의 모습을 본 것”이라며 “그래서 그는 임산부의 모습을 보며 생명과 죽음을 모두 떠올렸고, 이렇듯 생명과 죽음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등장하는 모티프가 작품의 끝까지 계속된다”고 했다.
그는 “죽음을 모르고 어떻게 생을 알겠는가”라며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는 생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빈약해져, 죽음도 너무나 하찮게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죽음이란 큰 사건이었지만, 오늘날 죽음은 하나의 통계 숫자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교회라면 생명의 전율이 느껴지고, 죽음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말테의 수기> 첫 장과도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령 박사는 또 ‘소설 읽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듯 “<말테의 수기>는 10쪽만 읽어봐도 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진한 충격과 진동을 경험하니, 다 읽기 힘들 수 있다”며 “친한 친구라고 24시간 함께 있지는 않듯 소설도 좋은 장면 읽다가 지루하면 잠시 놓아도 되고, 클래식 음악이 4악장까지 다 듣지 않아도 테마곡 소절만 알면 되듯 소설도 핵심 키워드를 통해 전체를 읽은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