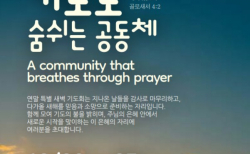책은 그에게 있어 ‘끼니’다. 거를래야 거를 수 없는. 매일 꼭 한 권씩 게 눈 감추듯 먹어치운다. “얘들 다 키우고 일선에서 물러나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구요. 나이 든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가봐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으니까요. 호호호.”
유독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녀를 만났다. 터헝가에 자리잡은 죠이휄로십교회 이상은(62) 사모를 말이다. 결혼 전 그는 출판사에서 근무했던 터라 웬만한 작가·목사들이 쓴 신앙서적은 모조리 섭렵했다. 당시 7-8만원 하던 월급 타는 날이면 용돈을 제하고 나머진 책 사는 데 다 써버리기 일쑤였다. “영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꼭 읽으리라 생각하면서 원서를 사뒀죠.” 그때 쟁여놓은 원서는 결과적으로 남편 박광철 목사 차지가 됐다. 그런 식으로 한두권씩 사모으다보니 어느덧 소장권수 2만권이 훌쩍 넘었다. 지금도 틈만 나면 근처 서점에 나가 샅샅이 훝어본다. 그러다 행여 인터넷이나 신문광고를 통해 본 ‘그 책’이 없을라치면 당장에 주문해서라도 꼭 본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3살 위인 남편과는 학생 시절,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오죽하면 신혼여행 갈 때도 책 보따리를 챙겨갔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책과 사랑에 빠졌다. “남편이 신학공부를 하겠다고 할 때에도 그저 공부로만 그치길 원했지,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과정이야 어찌됐던 그는 그후 사모가 됐고, 아들 둘을 낳아 키우면서도 “종일 책만 봤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책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늘 지근거리엔 책이 있었다. 그는 저서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에서 책 혹은 독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다.
▷신앙서적: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라. 너의 인격까지 품위있게 해준다.” ▷재미있는 책: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어라. 마음과 얼굴이 훨씬 밝아지고 심각한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서점:“자녀들과 함께 종종 서점에 들러라. 세상일에 뒤지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책 읽는 소리: “’책 읽는 소리’, ‘떡방아 소리’,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복잡하고 긴 문장을 거부하는 요즘 독자들에게 이런 단문이 통(通)했는지, 운이 좋은 탓인지, 이 책으로 그는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한 문장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다. 워낙에 완벽주의자인데다 꼼꼼한 성격인지라 마음에 들때까지 썼다 지우기를 반복한다. “원래 글 쓰는 걸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자꾸 쓰다보니 개발이 되더라”며 겸손을 떤다. 책을 더 쓸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그는,“책은 흔적이다. 함부러 쓰면 안된다”며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힌다.
요즘은 미국 올 때 싸들고 온 책 보따리를 풀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소설이 주는 묘미에 푹 빠져있다. 물론 그에게도 예수 믿고 한때 주야장천(晝夜長川) 성경 한우물만 팠던 시절이 있었다. 책을 봐도 신앙서적의 범위를 벗어나질 못했다. “어찌보면 편협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죠. 세속적인 책을 읽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40대에 들어서 가정 사역을 하면서부터 관련 전문서적에 통달했다.“제가 원래 뭘 하나 해도 거기에 몰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뭐냐 물으니, 꼽을래야 꼽을 수가 없단다. 너무 많아서 일게다. 그래도 한번 말해 보라 하니, 줄줄이 거침없이 쏟아진다. 공지영, 노희경, 신경숙, 박완서 등 유명 작가들의 책은 물론 기일혜, 이재철, 김성일 등 신앙이 묻어있는 소박한 글들을 특히나 좋아한다. 이 가운데 1994년부터 꾸준히 수필을 펴오고 있는 기일혜 작가의 수필집은 아예 시리즈로 통째 구입해 지인들에게 나눠준다. 말하자면 ‘기일혜 홍보대사’인 셈이다. 정크푸드가 아닌, 자연 밥상 같은 작가만의 독특한 색채가 마음에 든단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일혜 수필집, 꼭 한 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하는 걸 빼놓지 않는다. 그는 책을 보면 저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단다. ‘아, 이 책은 그 친구에게 딱인데…’
프란시스 쉐퍼의 아내 에디스 쉐퍼 여사가 쓴 <라브리 이야기>는 그에게 사역의 롤 모델을 비춰주는 거울이 됐다. 1955년 스위스에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어 자연 속에서 삶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향기처럼 전했던 쉐퍼 박사의 부부처럼, 그는 남편과 함께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지금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후배 선교사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그간의 사역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지혜를 나눈다. 그리고 이제 아끼던 책들도 도서관을 만들어 이들 선교사들에게 기부하고 나눠줄 계획이란다.
유독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녀를 만났다. 터헝가에 자리잡은 죠이휄로십교회 이상은(62) 사모를 말이다. 결혼 전 그는 출판사에서 근무했던 터라 웬만한 작가·목사들이 쓴 신앙서적은 모조리 섭렵했다. 당시 7-8만원 하던 월급 타는 날이면 용돈을 제하고 나머진 책 사는 데 다 써버리기 일쑤였다. “영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꼭 읽으리라 생각하면서 원서를 사뒀죠.” 그때 쟁여놓은 원서는 결과적으로 남편 박광철 목사 차지가 됐다. 그런 식으로 한두권씩 사모으다보니 어느덧 소장권수 2만권이 훌쩍 넘었다. 지금도 틈만 나면 근처 서점에 나가 샅샅이 훝어본다. 그러다 행여 인터넷이나 신문광고를 통해 본 ‘그 책’이 없을라치면 당장에 주문해서라도 꼭 본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3살 위인 남편과는 학생 시절,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오죽하면 신혼여행 갈 때도 책 보따리를 챙겨갔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책과 사랑에 빠졌다. “남편이 신학공부를 하겠다고 할 때에도 그저 공부로만 그치길 원했지,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과정이야 어찌됐던 그는 그후 사모가 됐고, 아들 둘을 낳아 키우면서도 “종일 책만 봤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책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늘 지근거리엔 책이 있었다. 그는 저서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에서 책 혹은 독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다.
▷신앙서적: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라. 너의 인격까지 품위있게 해준다.” ▷재미있는 책: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어라. 마음과 얼굴이 훨씬 밝아지고 심각한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서점:“자녀들과 함께 종종 서점에 들러라. 세상일에 뒤지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책 읽는 소리: “’책 읽는 소리’, ‘떡방아 소리’,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복잡하고 긴 문장을 거부하는 요즘 독자들에게 이런 단문이 통(通)했는지, 운이 좋은 탓인지, 이 책으로 그는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한 문장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다. 워낙에 완벽주의자인데다 꼼꼼한 성격인지라 마음에 들때까지 썼다 지우기를 반복한다. “원래 글 쓰는 걸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자꾸 쓰다보니 개발이 되더라”며 겸손을 떤다. 책을 더 쓸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그는,“책은 흔적이다. 함부러 쓰면 안된다”며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힌다.
요즘은 미국 올 때 싸들고 온 책 보따리를 풀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소설이 주는 묘미에 푹 빠져있다. 물론 그에게도 예수 믿고 한때 주야장천(晝夜長川) 성경 한우물만 팠던 시절이 있었다. 책을 봐도 신앙서적의 범위를 벗어나질 못했다. “어찌보면 편협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죠. 세속적인 책을 읽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40대에 들어서 가정 사역을 하면서부터 관련 전문서적에 통달했다.“제가 원래 뭘 하나 해도 거기에 몰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뭐냐 물으니, 꼽을래야 꼽을 수가 없단다. 너무 많아서 일게다. 그래도 한번 말해 보라 하니, 줄줄이 거침없이 쏟아진다. 공지영, 노희경, 신경숙, 박완서 등 유명 작가들의 책은 물론 기일혜, 이재철, 김성일 등 신앙이 묻어있는 소박한 글들을 특히나 좋아한다. 이 가운데 1994년부터 꾸준히 수필을 펴오고 있는 기일혜 작가의 수필집은 아예 시리즈로 통째 구입해 지인들에게 나눠준다. 말하자면 ‘기일혜 홍보대사’인 셈이다. 정크푸드가 아닌, 자연 밥상 같은 작가만의 독특한 색채가 마음에 든단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일혜 수필집, 꼭 한 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하는 걸 빼놓지 않는다. 그는 책을 보면 저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단다. ‘아, 이 책은 그 친구에게 딱인데…’
프란시스 쉐퍼의 아내 에디스 쉐퍼 여사가 쓴 <라브리 이야기>는 그에게 사역의 롤 모델을 비춰주는 거울이 됐다. 1955년 스위스에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어 자연 속에서 삶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향기처럼 전했던 쉐퍼 박사의 부부처럼, 그는 남편과 함께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지금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후배 선교사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그간의 사역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지혜를 나눈다. 그리고 이제 아끼던 책들도 도서관을 만들어 이들 선교사들에게 기부하고 나눠줄 계획이란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