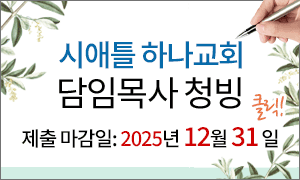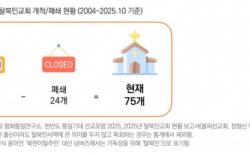탈북자 돕는 일에 이민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윤기관 교수를 만나봤다. 윤기관 교수는 현재 SFSU(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로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 남북경혐국민운동본부기획위원장, 한미FTA특별위원장, 대전광역시 물류정책 위원직 등을 맡고 있다.
그는 1982년부터 충남대에서 한국무역론을 가르쳤다. 무역을 가르치다보면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 당시는 보안문제로 서슬이 시퍼렇던 시대였고,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었다.
윤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통일이 됐을 때, 통일비용을 2000년도에 국내학자, 미국 학자들이 모여 국제기구에서 계산해본 적이 있다. 비용이 천문학적인 단위로 10조 달러에서 100조 달러였다. 먹여살릴 길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특히, 통일 이후 벌어질 경제적 불균형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사람들이 대거 넘어오게 될 경우 남한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학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수준이 최소 남한의 50%는 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 경제를 최소한 이 정도로 끌어올려야 사회불안이 사라지고 사회적 혼란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윤 교수는 "남북한 경제력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이 남한의 38분의 1밖에 안된다. 일인당 GNP는 18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런 경제 격차를 미리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 예상보다 5배 더 들어갔다. 그런데 아직도 멀었다고 한다. 아직 동서독 간 반목도 심하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쌀, 라면 박스를 주는 것은 영원히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며 오히려 죽이는 일일 수도 있다. 지금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경제를 적은 규모라도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기계를 주는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통일의 물리적 비용 전부 아냐
윤 교수는 "지금까지 계산된 것은 통일의 물리적 비용 뿐이었다. 별도로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 일단, 언어문제도 그렇다. 북한은 외래어를 모두 배척했기 때문에 순수한글로 바꿔버렸다. 언어와 사상이 가장 큰 문제이다. 뿌리박힌 것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 정치, 사상, 관습이 모두 다르다. 분단 66년간 이질화된 관습, 사회, 문화가 다른데 통일이 됐다고 해서 바로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탈북자의 경우 학력에 따른 문화, 언어, 시장경제 원리를 조목조목 가르쳐야 한다. 이런 것을 따지면 수천 가지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더 열심히 일한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기관 교수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앞으로 통일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 12월에 탈북자가 2만 명이 넘었다"며 "이 탈북자들이 북한의 2300만 명을 대변할 좋은 샘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전에 있는 480명의 탈북자들을 섬기는 협의회에서 회장으로 2년간 일한 적 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한국에 잘못 왔다고 했다. 넘어올 때보다 대우가 낮다고 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투리가 심해 무시를 당한다고 했다. 마치 김일성을 바라보듯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 같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할 일이 식모밖에 없다. 그런데, 임금도 연변 조선족보다 많이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나는 그들에게 시장경제를 가르쳤다. 하루종일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돈 주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국가는 신입사원이라도 다 같지 않다. 생산성에 따른다. 열심히 일해 매상이 오르면 임금이 올라간다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가르쳐줘도 몸에 이미 베어버린 타성을 바꾸긴 오래 걸렸다.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탈북자 2만명을 잘 돌봐주면 통일 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생님들이 된다. 신뢰가 생기면 그들도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과거에 탈북자들에게 여러가지 지원금이 있었는데, 무조건 돈을 주니까 아무 일도 안 했다. 배급에 익숙해진 그들에게 국가에서 처음에는 돈으로 일단 줬지만 지금은 잘하면 준다. 자격증 따면 더 준다고 얘기해준다. "
그는 "탈북자가 가족단위로 초중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과 의사소통이 되면 통일이 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 구출해야
윤 교수는 "2만명이 끝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들은 북한으로 갈 수도 없고 중국에서 사람행세도 못한다. 북한에 잡혀들어가면 수용소에 들어가거나 죽게 된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이 있는 땅에 산다. 그 탈북민들도 먹긴 먹는데 사람이 아닌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속에 숨어사는데 발각되면 인신매매, 사창가에 팔리기도 하고 위장결혼을 하게 되면 태어난 애들이 문제가 생긴다. 주로 중국 동북 3성에 있는데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한국에 있는 2만명 탈북자 중 60%는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브로커를 잘 만나면 살 수 있다. 안전한 경로를 통해 일단 태국으로 가면 난민수용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태국에서 미국행이나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다."
윤 교수는 김정일 정부 체제는 북한 주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김정일 정부는 북한 주민을 살리는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평양의 1천만명과 각 지방의 지도자를 포함한 사람 외에는 관심이 없다. 다른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죽으나마나 지금의 체제유지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평양시민과 관련된 1500만 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계속)
그는 1982년부터 충남대에서 한국무역론을 가르쳤다. 무역을 가르치다보면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 당시는 보안문제로 서슬이 시퍼렇던 시대였고,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었다.
윤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통일이 됐을 때, 통일비용을 2000년도에 국내학자, 미국 학자들이 모여 국제기구에서 계산해본 적이 있다. 비용이 천문학적인 단위로 10조 달러에서 100조 달러였다. 먹여살릴 길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특히, 통일 이후 벌어질 경제적 불균형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사람들이 대거 넘어오게 될 경우 남한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학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수준이 최소 남한의 50%는 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 경제를 최소한 이 정도로 끌어올려야 사회불안이 사라지고 사회적 혼란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윤 교수는 "남북한 경제력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이 남한의 38분의 1밖에 안된다. 일인당 GNP는 18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런 경제 격차를 미리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 예상보다 5배 더 들어갔다. 그런데 아직도 멀었다고 한다. 아직 동서독 간 반목도 심하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쌀, 라면 박스를 주는 것은 영원히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며 오히려 죽이는 일일 수도 있다. 지금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경제를 적은 규모라도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기계를 주는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통일의 물리적 비용 전부 아냐
윤 교수는 "지금까지 계산된 것은 통일의 물리적 비용 뿐이었다. 별도로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 일단, 언어문제도 그렇다. 북한은 외래어를 모두 배척했기 때문에 순수한글로 바꿔버렸다. 언어와 사상이 가장 큰 문제이다. 뿌리박힌 것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 정치, 사상, 관습이 모두 다르다. 분단 66년간 이질화된 관습, 사회, 문화가 다른데 통일이 됐다고 해서 바로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탈북자의 경우 학력에 따른 문화, 언어, 시장경제 원리를 조목조목 가르쳐야 한다. 이런 것을 따지면 수천 가지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더 열심히 일한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기관 교수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앞으로 통일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 12월에 탈북자가 2만 명이 넘었다"며 "이 탈북자들이 북한의 2300만 명을 대변할 좋은 샘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전에 있는 480명의 탈북자들을 섬기는 협의회에서 회장으로 2년간 일한 적 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한국에 잘못 왔다고 했다. 넘어올 때보다 대우가 낮다고 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투리가 심해 무시를 당한다고 했다. 마치 김일성을 바라보듯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 같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할 일이 식모밖에 없다. 그런데, 임금도 연변 조선족보다 많이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나는 그들에게 시장경제를 가르쳤다. 하루종일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돈 주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국가는 신입사원이라도 다 같지 않다. 생산성에 따른다. 열심히 일해 매상이 오르면 임금이 올라간다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가르쳐줘도 몸에 이미 베어버린 타성을 바꾸긴 오래 걸렸다.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탈북자 2만명을 잘 돌봐주면 통일 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생님들이 된다. 신뢰가 생기면 그들도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과거에 탈북자들에게 여러가지 지원금이 있었는데, 무조건 돈을 주니까 아무 일도 안 했다. 배급에 익숙해진 그들에게 국가에서 처음에는 돈으로 일단 줬지만 지금은 잘하면 준다. 자격증 따면 더 준다고 얘기해준다. "
그는 "탈북자가 가족단위로 초중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과 의사소통이 되면 통일이 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 구출해야
윤 교수는 "2만명이 끝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들은 북한으로 갈 수도 없고 중국에서 사람행세도 못한다. 북한에 잡혀들어가면 수용소에 들어가거나 죽게 된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이 있는 땅에 산다. 그 탈북민들도 먹긴 먹는데 사람이 아닌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속에 숨어사는데 발각되면 인신매매, 사창가에 팔리기도 하고 위장결혼을 하게 되면 태어난 애들이 문제가 생긴다. 주로 중국 동북 3성에 있는데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한국에 있는 2만명 탈북자 중 60%는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브로커를 잘 만나면 살 수 있다. 안전한 경로를 통해 일단 태국으로 가면 난민수용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태국에서 미국행이나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다."
윤 교수는 김정일 정부 체제는 북한 주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김정일 정부는 북한 주민을 살리는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평양의 1천만명과 각 지방의 지도자를 포함한 사람 외에는 관심이 없다. 다른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죽으나마나 지금의 체제유지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평양시민과 관련된 1500만 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계속)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