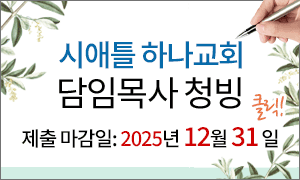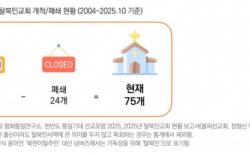한밤의 십자가 불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등대’인가, 아니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빛공해’일 뿐인가.
이에 대한 논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난 3월 W호텔,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등을 설계한 건축가 아론 탄(47) 교수가 “서울의 야경은 십자가 뿐인데, 계속 늘어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촉발됐다. 네티즌들은 “하늘에서 야경을 바라보면 공동묘지 같다”, “교회가 세금도 안 내면서 에너지절약 정책에 역행한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빛공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밤하늘에 교회 십자가만 가득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세했고, 국회에서 빛공해 방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회의 십자가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 빛공해 방지법은 과도한 조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등급별로 설정한 뒤 이에 맞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환경부는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8일 “도심 야간경관의 일례로 가로등, 교회 십자가 등이 언급됐으나 빛공해 방지법은 종교시설물(십자가 등)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하위법령에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 장관도 이후 몇몇 목회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등이 많이 켜져서 밤에 줄이는 방향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 십자가 등을 꺼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며 “토론 시간에 나왔던 얘기일 뿐, 개인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기독교에 비판적인 한 일간지는 교회의 ‘빛공해’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때 종교시설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그들의 주무기인 ‘종교편향’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이같은 조치가 개신교 쪽의 로비 때문이었다며 “교회 조명을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못박아둔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여기에 김경재 명예교수(한신대)가 같은 매체에 ‘십자가는 상징인가 주물숭배물인가’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교회 야광조명등 십자가는 주민의 거부감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십자가’는 자기비움과 희생, 비폭력적 저항과 진실의 관철, 화해와 사랑의 상징이었다”며 “그러나 일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나 광신적 신도들에게는 ‘십자가 형태물’ 자체가 주물적(呪物的) 능력이 있다고 맹신하는 물신숭배적 모습까지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김운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십자가를 단순히 불빛으로만 봐서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한국교회의 존재감을 무력화하는 발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엄신형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면 교회가 자율적으로 전기를 아끼는 운동을 펼치면 된다”며 “십자가 불빛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기독교를 희미하게 만들겠다는 속셈이므로 (법을 제정한다면)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교회가 심야에는 십자가를 소등하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운동에 나서야 한다”며 “십자가에 쓰이는 네온사인을 전력 소비량이 적은 발광다이오드(LED)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명혁 목사(한복협 회장)는 십자가 불빛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동방정교와 카톨릭의 논쟁에서 아이콘 문제가 나오는데, 희랍 종교가 십자가를 비롯한 아이콘을 많이 강조했고 서방 기독교는 좀 그렇지 않았다”며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논쟁을 십자가 자체로 확대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논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난 3월 W호텔,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등을 설계한 건축가 아론 탄(47) 교수가 “서울의 야경은 십자가 뿐인데, 계속 늘어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촉발됐다. 네티즌들은 “하늘에서 야경을 바라보면 공동묘지 같다”, “교회가 세금도 안 내면서 에너지절약 정책에 역행한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
| ▲한밤의 십자가 불빛이 때아닌 논란이 되고 있다(상기 사진 기사내용과 관계가 없음) |
여기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빛공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밤하늘에 교회 십자가만 가득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세했고, 국회에서 빛공해 방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회의 십자가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 빛공해 방지법은 과도한 조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등급별로 설정한 뒤 이에 맞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환경부는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8일 “도심 야간경관의 일례로 가로등, 교회 십자가 등이 언급됐으나 빛공해 방지법은 종교시설물(십자가 등)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하위법령에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 장관도 이후 몇몇 목회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등이 많이 켜져서 밤에 줄이는 방향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 십자가 등을 꺼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며 “토론 시간에 나왔던 얘기일 뿐, 개인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기독교에 비판적인 한 일간지는 교회의 ‘빛공해’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때 종교시설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그들의 주무기인 ‘종교편향’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이같은 조치가 개신교 쪽의 로비 때문이었다며 “교회 조명을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못박아둔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여기에 김경재 명예교수(한신대)가 같은 매체에 ‘십자가는 상징인가 주물숭배물인가’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교회 야광조명등 십자가는 주민의 거부감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십자가’는 자기비움과 희생, 비폭력적 저항과 진실의 관철, 화해와 사랑의 상징이었다”며 “그러나 일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나 광신적 신도들에게는 ‘십자가 형태물’ 자체가 주물적(呪物的) 능력이 있다고 맹신하는 물신숭배적 모습까지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김운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십자가를 단순히 불빛으로만 봐서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한국교회의 존재감을 무력화하는 발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엄신형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면 교회가 자율적으로 전기를 아끼는 운동을 펼치면 된다”며 “십자가 불빛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기독교를 희미하게 만들겠다는 속셈이므로 (법을 제정한다면)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교회가 심야에는 십자가를 소등하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운동에 나서야 한다”며 “십자가에 쓰이는 네온사인을 전력 소비량이 적은 발광다이오드(LED)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명혁 목사(한복협 회장)는 십자가 불빛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동방정교와 카톨릭의 논쟁에서 아이콘 문제가 나오는데, 희랍 종교가 십자가를 비롯한 아이콘을 많이 강조했고 서방 기독교는 좀 그렇지 않았다”며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논쟁을 십자가 자체로 확대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