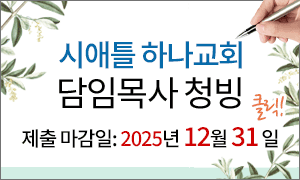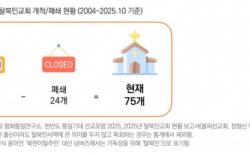그때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 논쟁이 벌어지던 4세기 무렵 말이다. 예수를 마리아의 피가 섞인 ‘사람’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는 그때도 있었다.
책 <사막으로 간 대주교(서해문집)>는 아리우스 이단(異端)과 맞서 싸웠던 아타나시우스의 삶 전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면서 신’으로 인정받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을 그린다.
결국 진리를 수호해냈지만, ‘정통 신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집트의 대주교 아타나시우스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30대의 젊은 나이로 당시 동방 최고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대주교에 올랐지만, 46년간 다섯 번이나 주교직에서 쫓겨나면서 도피와 은거, 유배로만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교회사가들은 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업적은 예수의 신성을 지켜낸 것과 함께,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을 최초로 확정한 것을 꼽고 있다.
아리우스파의 등장으로 니케아 신경에서 어렵사리 정리됐던 ‘예수의 신성’은 다시 혼돈에 빠졌고, 이와 관련해서는 4가지가 넘는 학설이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이 논쟁에는 로마 제국의 안정을 위해 황제까지 가담한 터였다. 아리우스 신학은 정치적인 지원 아래 주류 신학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엄격한 자기 절제, 신념에 찬 용기,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일관되게 아리우스파와 싸워 나갔다. 그는 물러나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함에 실수가 없었다. 황제와 협력하기도 했지만 맞서기도 했고, 때로는 유혈과 폭동이 그를 도운 적도 있었다. 그의 도피는 갓 피어나기 시작한 사막의 수도 문화와 은수자 안토니우스를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도 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매일 낭송하는 사도신경의 ‘삼위일체’는 뿌리를 내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본질에서 나오는 세 위격’이라는 것이다. 셋인 듯 하지만 하나이고 하나인 듯 하지만 셋인 관계, ‘저 바닷물을 모두 퍼서 이 구덩이에 옮기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렇게 정리되고 있었다.
평화방송에서 20년 넘게 종교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저자(김소일)는 아타나시우스의 삶을, 정치와 종교, 정통과 이단, 황제와 주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신성논쟁 다큐멘터리’라는 부제처럼 무려 1700년 전 이야기를 실감나는 필체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저자는 “4세기를 그처럼 뜨겁게 달궜던 교리 논쟁이 정말 순수하게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한다. 신성 교리를 둘러싼 교회의 내분과 갈등을 단순한 권력 다툼으로 보는 시각은 분명 무리가 있지만, 폭력과 테러, 보복과 유혈 폭동으로 점철된 이 싸움의 배경에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었던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밀라노 칙령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거치며 교회의 특권이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저자는 “이 시기의 역사는 길게 보면 정치와 종교가 뒤엉킨 채 몸부림쳤던 중세 역사의 예고편 성격이 강하다”고 정리한다.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는 “당대 교회 안팎의 상황을 헤쳐 나가면서 매우 합법적 수단만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거룩한 싸움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는 선에서 질문을 수습한다. “시대를 끌어안고 깊이 고뇌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선뜻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타나시우스는 당시 기독교가 직면했던 커다란 두 개의 도전-즉 교회 내부에서 오는 이단과 정통의 대립과 교회 밖에서 오는 권력의 간섭-의 최전선에서 생애를 바쳐 이단과의 싸움을 지휘했고, 황제의 권력에 맞서 교회를 지켰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 논쟁이 벌어지던 4세기 무렵 말이다. 예수를 마리아의 피가 섞인 ‘사람’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는 그때도 있었다.
책 <사막으로 간 대주교(서해문집)>는 아리우스 이단(異端)과 맞서 싸웠던 아타나시우스의 삶 전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면서 신’으로 인정받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을 그린다.
결국 진리를 수호해냈지만, ‘정통 신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집트의 대주교 아타나시우스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30대의 젊은 나이로 당시 동방 최고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대주교에 올랐지만, 46년간 다섯 번이나 주교직에서 쫓겨나면서 도피와 은거, 유배로만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교회사가들은 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업적은 예수의 신성을 지켜낸 것과 함께,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을 최초로 확정한 것을 꼽고 있다.
아리우스파의 등장으로 니케아 신경에서 어렵사리 정리됐던 ‘예수의 신성’은 다시 혼돈에 빠졌고, 이와 관련해서는 4가지가 넘는 학설이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이 논쟁에는 로마 제국의 안정을 위해 황제까지 가담한 터였다. 아리우스 신학은 정치적인 지원 아래 주류 신학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엄격한 자기 절제, 신념에 찬 용기,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일관되게 아리우스파와 싸워 나갔다. 그는 물러나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함에 실수가 없었다. 황제와 협력하기도 했지만 맞서기도 했고, 때로는 유혈과 폭동이 그를 도운 적도 있었다. 그의 도피는 갓 피어나기 시작한 사막의 수도 문화와 은수자 안토니우스를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도 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매일 낭송하는 사도신경의 ‘삼위일체’는 뿌리를 내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본질에서 나오는 세 위격’이라는 것이다. 셋인 듯 하지만 하나이고 하나인 듯 하지만 셋인 관계, ‘저 바닷물을 모두 퍼서 이 구덩이에 옮기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렇게 정리되고 있었다.
평화방송에서 20년 넘게 종교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저자(김소일)는 아타나시우스의 삶을, 정치와 종교, 정통과 이단, 황제와 주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신성논쟁 다큐멘터리’라는 부제처럼 무려 1700년 전 이야기를 실감나는 필체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저자는 “4세기를 그처럼 뜨겁게 달궜던 교리 논쟁이 정말 순수하게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한다. 신성 교리를 둘러싼 교회의 내분과 갈등을 단순한 권력 다툼으로 보는 시각은 분명 무리가 있지만, 폭력과 테러, 보복과 유혈 폭동으로 점철된 이 싸움의 배경에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었던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밀라노 칙령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거치며 교회의 특권이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저자는 “이 시기의 역사는 길게 보면 정치와 종교가 뒤엉킨 채 몸부림쳤던 중세 역사의 예고편 성격이 강하다”고 정리한다.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는 “당대 교회 안팎의 상황을 헤쳐 나가면서 매우 합법적 수단만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거룩한 싸움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는 선에서 질문을 수습한다. “시대를 끌어안고 깊이 고뇌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선뜻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타나시우스는 당시 기독교가 직면했던 커다란 두 개의 도전-즉 교회 내부에서 오는 이단과 정통의 대립과 교회 밖에서 오는 권력의 간섭-의 최전선에서 생애를 바쳐 이단과의 싸움을 지휘했고, 황제의 권력에 맞서 교회를 지켰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