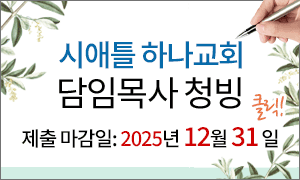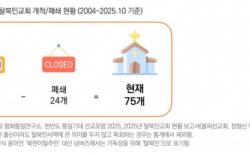기독교와 불교는 각각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5일 서울 냉천동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기독자-불자교수협의회 공동학술대회의 주제는 ‘생명과 화쟁’이었다.
이날 기독교를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이는 감신대 기독교통합학문연구소 박일준 교수였다. 그는 ‘근원적 동일성으로서의 생명과 진리의 침노 사건으로서의 생명’을 주제로 기독교의 ‘생명론’을 폈다.
박 교수는 먼저 기독교 생명의 본질을 ‘저항과 탈주’로 정의했다. 이는 “체제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 이해를 ‘전체’로 규정하고 틀을 제공해 앎의 유통을 통제하려 하지만, 생명의 힘은 그러한 체제의 지배 구조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탈주로를 찾는다”는 그의 생각에 기인한다.
전체에 묻혀버린 개인, 체제에 희생된 생명을 거부하고 하나의 객체화된 개인과 그의 생명을 목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생명론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가장 낮고 힘 없고 가난한 자의 눈 앞에 다가오는 절망을 성찰하지 못한 채, 조화와 상생을 토로하는 것은 곧 체제 담론에 불과하다”며 “개신교적 생명 이해란 곧 우리의 모든 생명 담론이 고통받고 있는 한 개인을 주목함으로써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은 유기적 전체성으로서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도 체감돼야 한다”며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속에서 종교인이 추구해야 하는 생명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좌절과 실패와 분노를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주체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특별히 개신교의 아가페적 사랑은 생명을 전체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한 영혼의 시각에서 공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난한 자의 저하와 탈주를 도외시한 채 전체로서의 조화와 생명만을 말한다면 그런 생명 이해는 언제나 체제를 위한 정치 담론의 역할 밖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응렬(각성 스님)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사는 ‘초기 불교의 수행관점에서 본 생명과 상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은 세계와 생명이 상호의존적인 관계 구조에 있다고 보는 연기설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법사는 “생명과 관련해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간 내면의 감정들에 기인한다. 갈등과 대립의 문제 역시 인간의 삶에서 파생되는 양태라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생명의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시각을 밖에서 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생명들을 향해 자애와 연민을 가르치는 붓다의 가르침에서 상생의 원리와 실천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연기원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생명의 본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세상의 삶, 그 자체의 본질의 이해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인간의 생명활동을 말한다”며 “불교적 시각에서의 상생은 생명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수행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기독교와 불교 외에도 유교와 원불교, 천주교가 함께 참여했다. 유교에선 이기동 교수(성균관대학교)가 ‘유학의 세 요소와 한국 유학의 상생철학’을 제목으로 발표했고 원불교에선 김도공 교수(원광대학교)가 ‘불교적 생명 원리에서 본 화쟁과 그 실천윤리’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천주교에선 이재돈 신부(가톨릭생명학대학원대학교)가 ‘가톨릭교회에서 보는 생명과 화쟁(和諍)’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날 기독교를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이는 감신대 기독교통합학문연구소 박일준 교수였다. 그는 ‘근원적 동일성으로서의 생명과 진리의 침노 사건으로서의 생명’을 주제로 기독교의 ‘생명론’을 폈다.
박 교수는 먼저 기독교 생명의 본질을 ‘저항과 탈주’로 정의했다. 이는 “체제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 이해를 ‘전체’로 규정하고 틀을 제공해 앎의 유통을 통제하려 하지만, 생명의 힘은 그러한 체제의 지배 구조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탈주로를 찾는다”는 그의 생각에 기인한다.
전체에 묻혀버린 개인, 체제에 희생된 생명을 거부하고 하나의 객체화된 개인과 그의 생명을 목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생명론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가장 낮고 힘 없고 가난한 자의 눈 앞에 다가오는 절망을 성찰하지 못한 채, 조화와 상생을 토로하는 것은 곧 체제 담론에 불과하다”며 “개신교적 생명 이해란 곧 우리의 모든 생명 담론이 고통받고 있는 한 개인을 주목함으로써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은 유기적 전체성으로서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도 체감돼야 한다”며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속에서 종교인이 추구해야 하는 생명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좌절과 실패와 분노를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주체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 ▲기독교를 대표해 발표한 박일준 교수(오른쪽) ⓒ김진영 기자 |
아울러 박 교수는 “특별히 개신교의 아가페적 사랑은 생명을 전체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한 영혼의 시각에서 공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난한 자의 저하와 탈주를 도외시한 채 전체로서의 조화와 생명만을 말한다면 그런 생명 이해는 언제나 체제를 위한 정치 담론의 역할 밖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응렬(각성 스님)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사는 ‘초기 불교의 수행관점에서 본 생명과 상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은 세계와 생명이 상호의존적인 관계 구조에 있다고 보는 연기설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법사는 “생명과 관련해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간 내면의 감정들에 기인한다. 갈등과 대립의 문제 역시 인간의 삶에서 파생되는 양태라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생명의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시각을 밖에서 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생명들을 향해 자애와 연민을 가르치는 붓다의 가르침에서 상생의 원리와 실천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연기원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생명의 본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세상의 삶, 그 자체의 본질의 이해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인간의 생명활동을 말한다”며 “불교적 시각에서의 상생은 생명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수행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기독교와 불교 외에도 유교와 원불교, 천주교가 함께 참여했다. 유교에선 이기동 교수(성균관대학교)가 ‘유학의 세 요소와 한국 유학의 상생철학’을 제목으로 발표했고 원불교에선 김도공 교수(원광대학교)가 ‘불교적 생명 원리에서 본 화쟁과 그 실천윤리’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천주교에선 이재돈 신부(가톨릭생명학대학원대학교)가 ‘가톨릭교회에서 보는 생명과 화쟁(和諍)’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