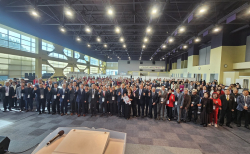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권력을 가까이하려는 기독교’의 존재는 개인적 선교로는 더 이상 양적 확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주최하고 우리신학연구소, 한국그리스도교연구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종교 가능성’ 연속 강의에서다.
불교와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와 시민사회의 소통 가능성과 그 방법론’ 연구 발제에 나선 이찬수 원장(종교문화원장)은 “예수가 결코 세속 권력을 추구한 적이 없는 사실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신앙 확대를 도모하거나,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갈등과 충돌로 이어지고 나아가 종교전쟁의 씨앗을 발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수직적 전제 군주 시절이라면 모를까, 수평적 개인 사회에서 종교가 권력의 힘을 빌어 세를 확장하려는 것은 그 종교의 내실이 빈곤해지고 있음을 도리어 드러내는 일일 뿐더러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근대 상황에서 보자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무엇보다 종교의 이름으로 타자를 억압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반종교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종교의 권력화는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른바 권력 내지 공적 영역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종교 편향 현상은 기존의 개인적 선교 방법으로는 더 이상 양적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기독교도 자신이 느끼고 있다는 뜻”이라며 “선교가 한국 사회에서 한계에 부딪쳤으니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양적 성장을 도모해보려는 의도의 반영이지만, 기독교가 권력과 야합하는 현상은 이미 한국 기독교가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이자,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수 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범재신론(凡在神論, panentheism)’, 즉 다원주의적인 범신론을 제시하는 등 편협한 기독교 이해를 드러냈다. 오늘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에서는 개별 종교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교리를 절대시한다 해도 그것이 공적 차원에서까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세속화(secularization) 상황에서는 개인의 양심이나 양식이 종교화된 ‘시민종교(Civil Religion)’로서의 역할을 종교가 수행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원장은 “다원화 내지 세속화라는 배경 속에서 18세기 유럽에서는 진화론을 위시한 과학주의적 흐름이 대두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19세기 말 미국 개신교권에서 이른바 ‘근본주의(fundamentalism)’가 등장했고, 하늘을 공간적 높이로 상상하면서 발생하는 ‘초자연적 유신론(supernatural theism)’을 강력하게 붙들려는 움직임도 생겨났다”며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상당수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신이 걸림돌이 되는 시대가 됐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상당수 사람들은 이전에 ‘초자연적 유신론’의 전통을 갖고 있던 이들”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주최하고 우리신학연구소, 한국그리스도교연구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종교 가능성’ 연속 강의에서다.
불교와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와 시민사회의 소통 가능성과 그 방법론’ 연구 발제에 나선 이찬수 원장(종교문화원장)은 “예수가 결코 세속 권력을 추구한 적이 없는 사실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신앙 확대를 도모하거나,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갈등과 충돌로 이어지고 나아가 종교전쟁의 씨앗을 발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수직적 전제 군주 시절이라면 모를까, 수평적 개인 사회에서 종교가 권력의 힘을 빌어 세를 확장하려는 것은 그 종교의 내실이 빈곤해지고 있음을 도리어 드러내는 일일 뿐더러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근대 상황에서 보자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무엇보다 종교의 이름으로 타자를 억압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반종교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종교의 권력화는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른바 권력 내지 공적 영역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종교 편향 현상은 기존의 개인적 선교 방법으로는 더 이상 양적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기독교도 자신이 느끼고 있다는 뜻”이라며 “선교가 한국 사회에서 한계에 부딪쳤으니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양적 성장을 도모해보려는 의도의 반영이지만, 기독교가 권력과 야합하는 현상은 이미 한국 기독교가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이자,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수 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범재신론(凡在神論, panentheism)’, 즉 다원주의적인 범신론을 제시하는 등 편협한 기독교 이해를 드러냈다. 오늘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에서는 개별 종교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교리를 절대시한다 해도 그것이 공적 차원에서까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세속화(secularization) 상황에서는 개인의 양심이나 양식이 종교화된 ‘시민종교(Civil Religion)’로서의 역할을 종교가 수행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원장은 “다원화 내지 세속화라는 배경 속에서 18세기 유럽에서는 진화론을 위시한 과학주의적 흐름이 대두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19세기 말 미국 개신교권에서 이른바 ‘근본주의(fundamentalism)’가 등장했고, 하늘을 공간적 높이로 상상하면서 발생하는 ‘초자연적 유신론(supernatural theism)’을 강력하게 붙들려는 움직임도 생겨났다”며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상당수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신이 걸림돌이 되는 시대가 됐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상당수 사람들은 이전에 ‘초자연적 유신론’의 전통을 갖고 있던 이들”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