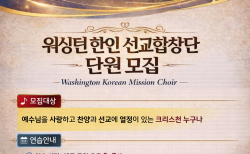북가주에서 평소에 자주 뵙고 존경하던 어느 목사님의 은퇴예배를 취재하게 됐다. 미국교회 큰 예배당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예배가 마치고 식사 테이블에는 너무 많은 사람으로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교회 장로님들도 내심 놀라는 눈치였다. 그런데, 그 자리를 유난히 빛냈던 것은 많은 사람의 수가 아니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께 대한 참석한 사람들의 깊은 존경심때문이었다.
마지막 은퇴예배시간에 한결같던 인격과 고매한 성품을 교인들은 스스럼없이 말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오는 가장 귀한 손님에게 하는 것처럼 깍듯이 대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춘 분이셨다. 교인들의 감사의 말은 마치 사랑을 듬뿍받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후배 목회자들도 함께 참석해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기쁘게 축하해주는 아름다운 예배였다.
목회하시면서도 동시에, 교단 내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큰 일을 공헌하셨고 그 외에도 지역사회에 셀 수 없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로 지금까지의 목회를 설명하기엔 오히려 부족해보였다.
그러고보니, 2, 3년 전에 취재갔을때, 그 목사님이 버클리 대학 강의실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역사 세미나를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모습도 생생히 기억난다. 노년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듣고있는 대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계셨다.
어떤 사람이든 마지막까지 처음과 같은 모습을 간직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가장 멀리있는 사람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변치않는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떠나는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말보다 삶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않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며,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길 주저하지 않는 크리스천.
이민사회는 진심으로 그런 근사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가득 넘쳐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길 소망하고 있는지 모른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교회 장로님들도 내심 놀라는 눈치였다. 그런데, 그 자리를 유난히 빛냈던 것은 많은 사람의 수가 아니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께 대한 참석한 사람들의 깊은 존경심때문이었다.
마지막 은퇴예배시간에 한결같던 인격과 고매한 성품을 교인들은 스스럼없이 말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오는 가장 귀한 손님에게 하는 것처럼 깍듯이 대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춘 분이셨다. 교인들의 감사의 말은 마치 사랑을 듬뿍받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후배 목회자들도 함께 참석해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기쁘게 축하해주는 아름다운 예배였다.
목회하시면서도 동시에, 교단 내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큰 일을 공헌하셨고 그 외에도 지역사회에 셀 수 없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로 지금까지의 목회를 설명하기엔 오히려 부족해보였다.
그러고보니, 2, 3년 전에 취재갔을때, 그 목사님이 버클리 대학 강의실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역사 세미나를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모습도 생생히 기억난다. 노년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듣고있는 대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계셨다.
어떤 사람이든 마지막까지 처음과 같은 모습을 간직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가장 멀리있는 사람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변치않는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떠나는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말보다 삶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않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며,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길 주저하지 않는 크리스천.
이민사회는 진심으로 그런 근사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가득 넘쳐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길 소망하고 있는지 모른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