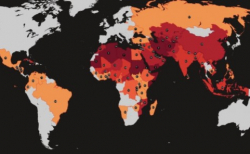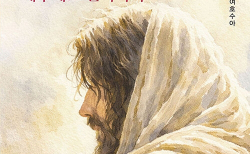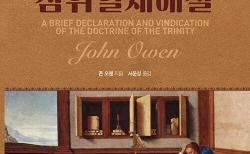|
| ▲ 영화 ‘소명’은 강명관 선교사 부부와 바나와 부족의 삶을 유쾌한 화법으로 풀어낸다. 강 선교사의 웃음은 어린 아이의 그것과도 많이 닮았다. 그 웃음을 따라, 자신의 소명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강 선교사의 진심이 더욱 진하게 전해온다. |
이 영화는 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가에 대한 대답이자 정답이다. 진심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에 크리스천들을 무릎꿇게 할 자극이며, 영상을 다루는 업(業)을 소명으로 여긴 한 감독의 역작이다. 다큐멘터리 기독교 영화 ‘소명’이 한국에서 네 달째 극장에 걸리며 1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중앙시네마 단관 개봉으로 시작해 지금은 인천, 대전 등에서도 개봉되며 10개 극장에서 관객들을 맞고 있다. 뒷심이 대단하다.
신현원 감독(38·명성교회)은 지난해 말, 같은 교회 성도로 아마존 바나와 부족과 함께 생활하는 강명관 선교사를 약 한 달간 카메라에 담아왔다. 강 선교사의 모습을 영상에 담고자 했던 교회의 요청에 따른 일이었지만 귀국 후 편집을 거치며 극장 상영을 결심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은막(銀幕) 위에 그려진 강 선교사의 얼굴은 너무나 밝았다. 독충들이 살을 파고 한낮 기온은 40도를 웃도는 그런 오지에서 어떻게 저런 표정을…, 하면서 어둠 속 옅은 불빛에 의지해 주변을 둘러보면 관객들 표정이 하나같이 강 선교사의 그것과 닮아있다. 돌아보면 기자 역시 그랬던 것 같다. 강 선교사의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된 때문일까. 신 감독이 극장 상영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영화는 의외로(?) 유쾌했다. 감동을 코드로 한 영화들이 대개 진하게 눈물샘을 자극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 선교사와 바나와 부족을 비추는 카메라의 동선은 시종일관 가볍고 선명하다. 복잡하게 파고들지 않는다는 얘기다. 강 선교사의 환한 웃음만큼이나 환한 영화였다.
강 선교사는 부족 청년들과 함께 사냥을 나서고 심순주 사모는 동네 아낙들에게 빨래를 가르친다. 3년을 동고동락하며 터득한 그들의 언어를 분석해 글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가르치면서 강 선교사 부부는 언젠가 바나와 부족의 말로 번역된 성경을 그들이 읽고 묵상하는 날을 꿈꾼다. 상처난 사람이 생기면 약을 발라주고 선교 지원 물품이 배달되면 물물교환을 통해 골고루 나눠준다. 공짜로 주지 않는 건 그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함이며, 무엇보다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이런 일상들에 신 감독은 화려한 조명을 비추지 않았다. 중간 중간 삽입된 성경구절과 몇 번의 배경음악이 고작이다. 내레이션에도 온갖 수식이나 장황한 설명이 없다. 그래도 강 선교사 부부에겐 그 모든 것을 능가할 만큼의 진심이 있다는 걸 신 감독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진심에 동화된 관객들이 강 선교사의 기도 장면을 포함한 몇몇 장면에서 흘리는 눈물은 비록 볼을 타고 조로록 흘러내리는 작은 것이지만 콧물까지 쏟아내며 엉엉거리는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뭉클하고 강하다. ‘살아있는 드라마’ 다큐멘터리의 힘일까.
‘행복’을 찍은 감독과의 만남
 |
| ▲그의 웃음에서 행복이 묻어난다. 오지의 땅 아마존에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강 선교사 부부와 바나와 부족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그들의 행복도 함께 담아온 듯 하다. ⓒ송경호 기자 |
이미 많은 인터뷰에 응한 뒤였다.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관객이 많이 들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독교 언론은 물론 지상파 방송과 일간지들이 그의 ‘간증’을 취재해 갔다. 그런 그에게 신선한 질문을 주려고 애썼지만, 글쎄… 기독교 문화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창한 질문을 던졌으니 그리 신선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래도 나름 소득(?) 또한 있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당시엔 해외 선교사들이나 국내 교회들이 한국 사회에 많은 문화적 영향을 끼쳤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책을 출판하는 등 생동감이 교회에 넘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 가서 연극도 보고 노래도 듣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허기를 채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일까…. 우리만의 문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만의 문화가 없어서가 아닐까요. 보세요. 교회에도 다 세상 문화가 넘치고 그래요. 교회는 또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고….”
그래서일까. 영화 ‘소명’은 원색을 그대로 썼다. 대중 극장에 걸면서도 기독교 선교사의 다큐멘터리임을 숨기지 않았고, 내용에 있어서도 기독교적 색채를 여과 없이 투영했다. 처음 영화를 선보인 시사회 자리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기독교적 색채를 모호하게 해서 대중적으로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았겠다”고 했지만 신 감독은 생각이 달랐다. 선교사의 삶을 조명해 ‘기독교인’들이 보고 느끼게 하자는 신념이었다.
예상은 적중했다. 영화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본 기독교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소명’을 보고자 하는 비기독교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이다.
“비기독교인 작가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죠. ‘기독교 영화로 생각하고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이라는. 처음 극장 상영을 위해 뛰어다니면서 극장 관계자들이 기독교 영화를 누가 보겠냐며 거절했을 때, 타협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 감독과는 초면이었지만 인터뷰 준비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사진을 통해 본 그의 얼굴은 한결같이 웃고 있다. 사람들에게 내보일 사진에서 웃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만 신 감독의 웃음은 뭔가 달라 보였다. 한 달 간 강 선교사 부부를 비롯해 바나와 부족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선물 받은 웃음인지,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아마존까지 날아가면서 얻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웃음엔 행복이 묻어나 있다.
“강 선교사님과 바나와 부족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중 하나가 버림에 대해서지요. 전기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식량이 떨어지면 사냥을 위해 아마존 정글을 하루종일 헤매야 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얼굴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많은 것들을 갖고도 그런 평화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텐데….”
다녀온 후 신 감독은 그럼 무엇을 버렸는지 하나만 가르쳐달라 했다.
“집착을 버렸어요. 가지려 하고, 이기려 하고, 쟁취하려는 집착.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이 따로 있음을 조금 알게 됐다고나 할까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뭐 그런 깨달음이죠.”
제2, 제3의 ‘소명’이 나오길 바라며
듣고보니 영화의 제목인 ‘소명’과 신 감독이 깨달은 ‘버림’의 철학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위해 외국어고등학교 국어교사 자리를 ‘버리고’ 아마존에 간 강 선교사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TV 동물농장’이라는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찍어야 하는 빡빡한 스케줄을 과감히 ‘버리고’ 열대 우림으로 날아간 신 감독이나 모두 하나같이 소명을 위해 무언가 버린 이들이다. 생각해본다.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있을텐데, 우리는 무엇을 버렸는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건…, 그래 그건 욕심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문화의 미래’라는 다소 거창한, 그러나 신선하지 않은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것도 그는 잊지 않았다.
“웬만한 교회에 가 보면 다 영상팀이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잘 활용했으면 해요. 교회 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는 기독교인들, 혹은 비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독교 영상물을 만들면 좋겠어요. 물론 당장 기독교 문화가 부흥하진 않겠죠.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듯 그렇게 자라나지 않을까요.”
영화 ‘소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것이고, 교회는 무수히 많은 집회에서 그것을 상영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은 짧았으면 한다. 제2, 제3의 ‘소명’이 하루빨리 그 자리를 대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지금와서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신 감독의 고백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듣고 싶은 마음에서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