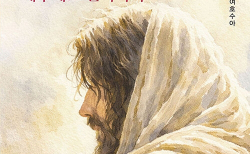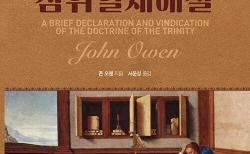수원에 있을 때입니다. 수원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는 유난히 농업과 관련된 학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흔히 수원농대라고 불렀던 서울농대가 교회 곁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일하시는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여러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산림학과 교수님이면서 교회의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던 이돈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생태계 복원사업에 헌신하면서 세계산림학회 회장으로도 수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제게 두 그루 묘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감나무라면서 한번 잘 키워보라고 가져다주신 것입니다. 산림학회 교수님이 특별히 골라서 주신 묘목이니 얼마나 좋은 감나무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사택에는 감나무를 심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시던 이천으로 내려가 그곳 마당에 이 감나무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제 곧 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맛있는 감을 따 먹을 기대를 갖고 땅을 깊이 파서 두 그루의 감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물론 감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모든 일은 아버님 몫이 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어느 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감나무에서 소식이 와야 할 텐데 무소식입니다. 꽃은커녕 봉오리조차 맺히질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금년에는 감 먹기 틀렸다 싶었습니다. 내년에는 먹을 수 있겠지... 그러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감나무에는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봉오리도 없고 꽃도 피지 않고...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자 봉오리가 몇 개 피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올해에는 감 맛을 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봉오리들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3년째에도 감 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설상가상 두 그루 중 한 그루의 감나무 묘목이 시들시들하더니 결국 말라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깨끗이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4년째 되던 해 가을 부모님에게서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감이 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대여섯 개가 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추석, 무려 4년 만에 저와 가족들은 그 감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개가 더 떨어져 단 3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그저 심기만 하면 금세 열매가 열리리라 싶었는데, 감 맛을 보기까지 무려 4년이 지났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무성한 잎사귀의 무화과나무가 아닌 단 한 알이라도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간절한 요즈음입니다. 주님은 열매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우겨도 열매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그 중에 산림학과 교수님이면서 교회의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던 이돈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생태계 복원사업에 헌신하면서 세계산림학회 회장으로도 수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제게 두 그루 묘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감나무라면서 한번 잘 키워보라고 가져다주신 것입니다. 산림학회 교수님이 특별히 골라서 주신 묘목이니 얼마나 좋은 감나무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사택에는 감나무를 심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시던 이천으로 내려가 그곳 마당에 이 감나무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제 곧 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맛있는 감을 따 먹을 기대를 갖고 땅을 깊이 파서 두 그루의 감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물론 감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모든 일은 아버님 몫이 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어느 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감나무에서 소식이 와야 할 텐데 무소식입니다. 꽃은커녕 봉오리조차 맺히질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금년에는 감 먹기 틀렸다 싶었습니다. 내년에는 먹을 수 있겠지... 그러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감나무에는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봉오리도 없고 꽃도 피지 않고...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자 봉오리가 몇 개 피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올해에는 감 맛을 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봉오리들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3년째에도 감 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설상가상 두 그루 중 한 그루의 감나무 묘목이 시들시들하더니 결국 말라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깨끗이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4년째 되던 해 가을 부모님에게서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감이 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대여섯 개가 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추석, 무려 4년 만에 저와 가족들은 그 감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개가 더 떨어져 단 3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그저 심기만 하면 금세 열매가 열리리라 싶었는데, 감 맛을 보기까지 무려 4년이 지났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무성한 잎사귀의 무화과나무가 아닌 단 한 알이라도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간절한 요즈음입니다. 주님은 열매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우겨도 열매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