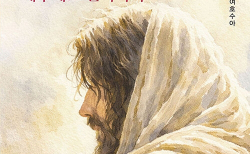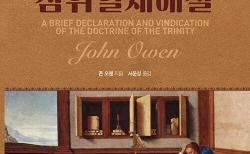나라가 어수선하다. 금융위기라고 한다. 거대한 투자은행들이 쓰러지고 연봉만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최고급 엘리트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연일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노후를 위해 들어놓았던 은퇴연금이 반 토막이 났다는 탄식 섞인 하소연도 이젠 그러려니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어느 기자는 돈으로 분탕질을 하던 미국의 금융가가 이제 반성문을 쓸 차례라고 꼬집었다.
뉴욕 월가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기가 가끔 어느 먼 나라 이야기인 듯 싶었다. 하지만 차츰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이야기임을 깨닫는다. 여기저기 장사가 안 된다는 말들,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들, 앞으로 거대한 감원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푸념들...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금융위기의 여파이다. 이럴 때마다 살아갈 생명의 무게가 더욱 짐스럽게 느껴진다.
그러고 보니 이게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도 아시아도 남미도 그 어디에서건 금융위기의 파고를 겪지 않는 곳이 없다.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다. 중국에서는 연일 문을 닫는 공장 이야기에, 영국에서는 금융기관의 대규모 감원소식,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나라 자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1998년이던가? 한국에서도 이런 난리가 났었지 않았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 중에서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서 내 몰렸다. 이때 저 유명한 노숙자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필이면 노숙자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이름을 바꾸려고 법원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세상살이는 끝없이 반복된다. 풍성할 때도 있고 빈약할 때도 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 막 쓸 때도 있고 쓰던 습관을 접어야 할 때도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방법에는 별 차이가 없다.
아내가 잠시 한국을 방문 중이다. 한동안 한국의 브라운관을 뜨겁게 달궜던 ‘엄마가 뿔났다’는 드라마에 나오는 엄마 한자처럼 약 한 달간의 휴가를 드렸다(?). 아내는 그동안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치과 진료와 함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형제들을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 덕에 나만 바빠졌다. 그동안 아내가 아이들 챙기고, 밥을 지어 나르고,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을 만만하게 보았다. 정작 내가 그 일을 당하고 보니 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다. 아침은 씨리얼로 해결, 점심은 각자 알아서 해결, 저녁은 그래도 따끈한 밥을 먹어야겠기에 밥을 짓고, 나름 반찬을 만들고, 주방 청소도 하고, 설거지에, 아이들에게 빨리 자라고 호통 치는 일까지 도맡아 하려니 아, 이게 보통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냥저냥 견디다 보니 어느 덧 아내가 돌아올 날이 가까워졌다.
그렇다. 금융위기임은 분명하다. 살기 힘들어진 것 또한 분명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만일 살아갈 힘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뉴욕 월가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기가 가끔 어느 먼 나라 이야기인 듯 싶었다. 하지만 차츰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이야기임을 깨닫는다. 여기저기 장사가 안 된다는 말들,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들, 앞으로 거대한 감원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푸념들...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금융위기의 여파이다. 이럴 때마다 살아갈 생명의 무게가 더욱 짐스럽게 느껴진다.
그러고 보니 이게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도 아시아도 남미도 그 어디에서건 금융위기의 파고를 겪지 않는 곳이 없다.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다. 중국에서는 연일 문을 닫는 공장 이야기에, 영국에서는 금융기관의 대규모 감원소식,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나라 자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1998년이던가? 한국에서도 이런 난리가 났었지 않았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 중에서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서 내 몰렸다. 이때 저 유명한 노숙자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필이면 노숙자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이름을 바꾸려고 법원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세상살이는 끝없이 반복된다. 풍성할 때도 있고 빈약할 때도 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 막 쓸 때도 있고 쓰던 습관을 접어야 할 때도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방법에는 별 차이가 없다.
아내가 잠시 한국을 방문 중이다. 한동안 한국의 브라운관을 뜨겁게 달궜던 ‘엄마가 뿔났다’는 드라마에 나오는 엄마 한자처럼 약 한 달간의 휴가를 드렸다(?). 아내는 그동안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치과 진료와 함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형제들을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 덕에 나만 바빠졌다. 그동안 아내가 아이들 챙기고, 밥을 지어 나르고,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을 만만하게 보았다. 정작 내가 그 일을 당하고 보니 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다. 아침은 씨리얼로 해결, 점심은 각자 알아서 해결, 저녁은 그래도 따끈한 밥을 먹어야겠기에 밥을 짓고, 나름 반찬을 만들고, 주방 청소도 하고, 설거지에, 아이들에게 빨리 자라고 호통 치는 일까지 도맡아 하려니 아, 이게 보통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냥저냥 견디다 보니 어느 덧 아내가 돌아올 날이 가까워졌다.
그렇다. 금융위기임은 분명하다. 살기 힘들어진 것 또한 분명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만일 살아갈 힘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