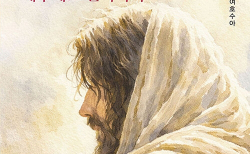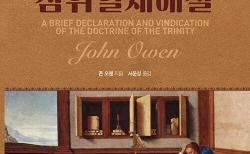잇따른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자살은 한국교회에 금기시됐던 ‘자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한국교회가 ‘베르테르 효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자살 흐름을 ‘생명존중’ 운동으로 하루빨리 막아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교계에서 일어나는 자살 논의에는 씁쓸한 구석이 없지 않다.
물론 ‘자살=지옥’ 식의 무조건적 마녀사냥은 지양해야 한다. 자살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었던 우울증이 ‘감기’처럼 하나의 질병임을 인식해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에 나서야 한다. 소외되고 불우한 ‘잠재적 자살시도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고단한 생활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살을 예방하는 강력한 힘’이 돼 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7일 자살관련 세미나에서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는 “목회자들이 ‘자살하면 지옥간다’는 단순한 논리보다는 자살하는 것이 왜 잘못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회가 ‘진정한 성공’과 삶의 의미를 바로 가르쳐야 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지나친 동정심을 담은 논의들은 오히려 ‘자살해도 괜찮아’ 식의 분위기를 몰아갈 위험이 있다. 같은 날 세미나에서 김충렬 박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인 자살은 사고사”라고 했다. “올바른 목회로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맞는 말이지만, 어디선가 이 글을 읽고 있을 한 사람에게는 그럴듯한 변명이 될 수도 있다. ‘생명’이 달린 문제에는 말 한 마디에도 세심한 배려와 고심의 흔적이 녹아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진지하고 숙연해야 할 자살 논의를 한국교회 비판의 좋은 ‘먹잇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 사이비 진보 언론은 어이없게도 자사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을 근거로 한국 성도들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다”며 비판하고, 신학계 거장까지 내세워 한국교회 지난날의 아픔을 또다시 후벼파고 있다.
망자(亡者)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자살’에 대한 논의는 산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할지 모른다. ‘자살하면 지옥간다’는 말은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아픔을 주기 때문이고, 자살 논의 자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는’ 열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족들의 상처를 헤아리는 한국교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살 자’들을 위한 ‘자살에 관한 설교지침’은 새겨들을 만 하다.
물론 ‘자살=지옥’ 식의 무조건적 마녀사냥은 지양해야 한다. 자살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었던 우울증이 ‘감기’처럼 하나의 질병임을 인식해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에 나서야 한다. 소외되고 불우한 ‘잠재적 자살시도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고단한 생활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살을 예방하는 강력한 힘’이 돼 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7일 자살관련 세미나에서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는 “목회자들이 ‘자살하면 지옥간다’는 단순한 논리보다는 자살하는 것이 왜 잘못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회가 ‘진정한 성공’과 삶의 의미를 바로 가르쳐야 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지나친 동정심을 담은 논의들은 오히려 ‘자살해도 괜찮아’ 식의 분위기를 몰아갈 위험이 있다. 같은 날 세미나에서 김충렬 박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인 자살은 사고사”라고 했다. “올바른 목회로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맞는 말이지만, 어디선가 이 글을 읽고 있을 한 사람에게는 그럴듯한 변명이 될 수도 있다. ‘생명’이 달린 문제에는 말 한 마디에도 세심한 배려와 고심의 흔적이 녹아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진지하고 숙연해야 할 자살 논의를 한국교회 비판의 좋은 ‘먹잇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 사이비 진보 언론은 어이없게도 자사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을 근거로 한국 성도들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다”며 비판하고, 신학계 거장까지 내세워 한국교회 지난날의 아픔을 또다시 후벼파고 있다.
망자(亡者)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자살’에 대한 논의는 산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할지 모른다. ‘자살하면 지옥간다’는 말은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아픔을 주기 때문이고, 자살 논의 자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는’ 열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족들의 상처를 헤아리는 한국교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살 자’들을 위한 ‘자살에 관한 설교지침’은 새겨들을 만 하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