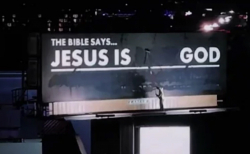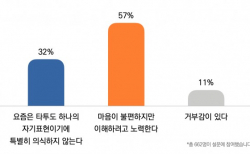|
 |
 |
 |
'통일 조국의 평양특별시장'을 꿈꾸는 강동완 교수님(전 부산하나센터장)이 보내오신 '평양 밖 북조선'의 생생한 사진입니다. 2019년 새해 휴전선 너머, 북·중 국경 지역에서 직접 담아낸 '날 것 그대로' 북한의 오늘 모습입니다. -편집자 주
압록강은 꽁꽁 얼어붙었고,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강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북녘의 마을에 유독 우뚝 선 조형물이 하나 보였다.
망원렌즈로 당겨온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문구가 새겨진 영생탑이었다.
북한의 마을마다 반드시 한 개씩은 있다는 영생탑. 마을 한가운데에 위용 있게 자리했는데, 더욱 놀라운 장면은 그 영생탑 아래에 있었다.
검은색 점으로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다름 아닌 사람들이었다. 너른 들판에 무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영생탑 크기에 눌러 점같이 작게 보였다.
한겨울 꽁꽁 언 땅을 겨우 깨고 수레에 옮겨 담는 건 거름이다. '거름전투'에 동원된 마을 사람들, 아니 엄격히 말하면 모두 여성들이다. 삼삼오오 수레에 거름을 싣고 와서 들판에 쏟아 놓는다.
장엄한 물줄기로 흐르는 압록강을 얼어붙게 할 정도의 매서운 추위에도, 거름전투를 위한 동원은 계속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이 영원히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족한가?
꽁꽁 언 강물은 아래에서부터 녹아 새 봄이 오면 물줄기를 다시 이어간다.
북녘의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얼음 밑으로 흐르는 작은 물살처럼, 북한 주민들의 힘은 그렇게 영생탑을 녹여낼 것이라 믿는다.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오리라.
글·사진 강동완 교수
부산 동아대 교수이다. '문화로 여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북한에서의 한류현상, 남북한 문화, 사회통합, 탈북민 정착지원, 북한 미디어 연구에 관심이 많다. 일상생활에서 통일을 찾는 '당신이 통일입니다'를 진행중이다. '통일 크리에이티브'로 살며 북중 접경지역에서 분단의 사람들을 사진에 담고 있다.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북중 접경에서 찍은 999장의 사진을 담은 <평양 밖 북조선>을 펴냈다. 저자는 '평양 밖 북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물음을 갖고 국경 지역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다음은 <평양 밖 북조선>의 머리말 중 일부이다.
 |
"북한은 평양과 지방으로 나뉜다. 평양에 사는 특별시민이 아니라 북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네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었다. 2018년 여름날, 뜨거웠지만 여전히 차가운 분단의 시간들을 기록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999장의 사진에 북중접경 2,000km 북녘 사람들을 오롯이 담았다. '사람, 공간, 생활, 이동, 경계, 담음' 등 총 6장 39개 주제로 사진을 찍고 999장을 엮었다.
2018년 4월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다.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만남이라 했다. 만남 이후,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길로 갈 것처럼 여겨졌다. 세상의 외딴 섬으로 남아 있던 평양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오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더디며, 여전히 그들만의 세상이다. 독재자라는 사실은 변함없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대한 감옥이다.
북중접경 2,000km를 달리고 또 걸었다. 갈 수 없는 땅, 가서는 안 되는 땅이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 눈앞에 허락된 사람들만 겨우 담아냈다. 가까이 다가설 수 없으니 망원렌즈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당겨서 보고 싶었다. 0.01초 셔터를 누르는 찰나의 순간 속에 분단의 오랜 상처를 담고자 했다.
대포 마냥 투박하게 생긴 900밀리 망원렌즈에 우리네 사람들이 안겨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허락되지 않은 공간에서 망원렌즈로 찍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었다. 렌즈의 초점을 아무리 당겨보아도 멀리 떨어진 사람은 그저 한 점에 불과했다.
사진은 또 다른 폭력적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터라,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시야에 들어오는 북녘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전하고 싶었다.
셔터를 누르는 사람의 의도로 편집된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담고자 했을 뿐이다.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손가락은 카메라 셔터 위에 있었고, 눈동자는 오직 북녘만을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