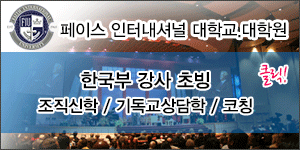김병삼 목사가 지난 3월 27일 '자율적 새벽기도'에 대한 단상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그는 "오래 전 후안 카를로스 오르띠즈 목사님의 책에 심취했던 때가 있었는데 '기도가 당신에게 지루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문장이 아주 강하게 다가왔었다"며 "아마도 모든 크리스천 이라면 '기도'에 대한 강박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문을 열었다.
김 목사는 "대한민국에서 목회는 모든 목사들에게 '새벽기도' 역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나교회 목회자에게는 '새벽기도 자율과 자유'를 선포했었다. 목회자들에게 새벽에 나오는 시간이 강박이나 억압 규율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전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는 기쁨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것', 그래서 새벽시간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다. 기도의 시간이 삶에서 기쁨과 필요, 그리고 갈급함이 되기까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김 목사는 "어제는 목회자들에게, 더 이상 새벽기도가 자율이 아닌 목회자로서의 '의무감'으로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밤새 마음이 무거웠다"며 "새벽시간에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새벽기도'가 지루한 노동이 될까봐"라고 언급했다.
김병삼 목사는 "중세 교회의 타락은 '영성'이 징벌적 개념으로 바뀌는 순간 아니었을까"라며 "'죄'에 대한 보상으로 '기도의 형량'이 부과되기도 하고, 죄에 대한 보상으로 '선행과 고행'이 부과되기도 했으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감사했던 시간들이 징벌적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스스로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 아닐까"라며 "요즘 나이 드는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전에 목회 경험을 가지고 후배 목사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거나 충고할 때가 많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저도 젊은 시절 부목사도, 개척교회도, 시골 목회도 했고 때로 다른 목회자들의 눈치도 보고, 교인들의 이목도 있고, 자신에 대한 규율의 수단으로 새벽기도를 했던 것 같다"며 "지금 생각해 보니 새벽에 나와서 참 많이 졸았던 것 같고, 새벽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았다"고 회고했다.
김 목사는 "생각해 보니 그 시절, 새벽기도는 기쁨과 설렘 기대의 시간이 아니라 '의무감'이 참 많이 짓누르고 있었다"며 "아마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의무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니 그때 억지로라도 붙들고 있었던 기도의 끈이 나를 붙잡아 주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끈으로 인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절절하게 새벽에 기도했던 것 같다"며 "기도가 지루한 노동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순간, 기도의 기쁨과 기대가 날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려했다.
김 목사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새벽을 사십시오!'로, 이는 꼭 시간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 기도와 묵상과 사색, 그리고 목회의 준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며 "어느 시간이나 가능하지만, 목회 패턴에서 보면 새벽처럼 좋은 시간이 없더라"고 고백했다.
김병삼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이기는 하지만 '새벽'을 지키는 목회자를 교인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며 "오늘 새벽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을 지켰던 그 자리의 습관들이 정말 필요한 순간의 하나님을 붙드는 끈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