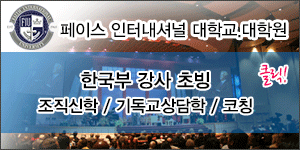결국엔 믿음이 이긴다
화종부 | 생명의말씀사 | 3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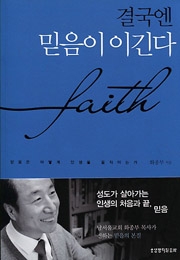
반가운 저자의 특별한 책이 나왔다. 저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전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관한 설교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온 것이다. 평소에 저자를 좋아하고, 또 저자의 설교를 즐겨 듣는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책의 추천사와 추천한 분들의 이름 뒤에 있는 호칭들이다. 집사 또는 권사이면서 교수, 주부, 원장, 과장, 회사원, 작가라는 호칭들을 가진 이들이 책의 추천사를 쓰고 있다. 화려한 수식이 될 수 있는 신학교 교수와 명망 있는 목사의 추천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저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이 설교가 선포된 자리에 있던 무명 성도들에게 추천사를 요청한 것이다. 한 마디로 참 '저자스럽다'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내용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은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가득하다.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있는 믿음의 개념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뒤 곧바로 각각의 인물들로 들어간다. 예배로 믿음을 증명한 아벨, 동행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낸 에녹, 방주를 짓는 것으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노아. 이렇듯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의 짤막한 기사들을 가지고, 한 편 한 편의 완성된 설교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을 본다면 먼저 본문에 대한 적절한 주해의 과정을 공유한다는 부분을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아벨의 제사와 관련하여 저자는 현재 학계에서 말하는 세 가지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것을 종합하여 특유의 포괄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라는, 성도가 품을 수 있는 의문의 답을 함께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 속에서 찾아가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신의 견해를 절대화시키지 않으면서 청중과 함께 호흡하며 결론으로 인도하는 과정 자체가, 성경 본문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처럼 여겨져서 좋았다.
저자가 보이는 이러한 설명 방식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본문이 말하는 것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 같아 보였다. 이것은 설교자의 권위가 아닌, 성경의 권위 앞에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의아했던 부분도 있었으나, 책을 읽어가는 동안 점점 더 설득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책을 읽는 동안 느꼈던 또 하나의 특징은 '따뜻한 책망'이 많다는 것이다. 저자는 믿음장을 설교하며 많은 성도와 조국교회의 믿음 없음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한다. 잘못된 신앙과 그 신앙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로 가득한 조국교회를 말하며 날이 선 비판을 한다.
저자는 에둘러 말하지 않고, 억지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다. 아프고 시린 날카로운 지적과 경고가 반복되고 있다. 신기한 건 저자의 책망이 '많이 아프지만, 이상하게 아프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아마도 저자가 이 호통을 치는 과정에서 사용한 말 한 마디 표현 하나하나에 들어 있는 '애정' 때문인 것 같다.
저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소리치지 않고, 자신이 하는 그 책망을 듣는 성도의 자리에서 함께 그 책망의 대상도 되고 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걷고 있는 이의 입에서 나온 책망이기에, 나는 방어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하며 이 책망들을 들을 수 있었다.
소소한 아쉬움은, 저자의 구어체 문장의 원고가 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의미가 조금은 약화되거나 난해해진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몇 편의 글을 계속해서 읽으며 익숙해졌던 것 같지만, 초반 독서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요인이기도 했다. 조금만 문장들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면, 늘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일상적인 눈으로 스치며 지나간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입체적으로 다가왔다. 그들이 경험했던 힘겨움과 통과한 시련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을 이기게 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말미에 조그만 글씨로 내 이름도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된다.
/조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나눔교회 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