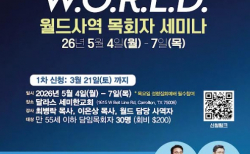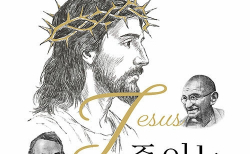지금 한국사회에서는 갑(甲)과 을(乙)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통적으로 그 사회에는 갑(甲)과 을(乙)의 서열은 언제나 존재했고 사람들은 갑(甲)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모두가 안간힘을 쏟고 살았다.
일단 한번 갑(甲)의 반열에 오르기만 하면 사람들은 알아서 갑(甲)과 을(乙)의 관계에 순응하며 생존하려 했다. 하지만 언젠가 부터 을(乙)은 갑(甲)의 횡포를 무조건 용인하지는 않게 되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존재하는 갑(甲)의 권한은 관습이라는 틀 속에서 을(乙)로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민주주의 최첨단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말이다.
언젠가 상담가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였다.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사례가 주어졌다. 어느 조그만 시골마을에 땔감나무를 만들어 파는 나무꾼이 자신의 상담가에게 나무를 팔았다. 물론, 표면상으로 상담가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거래가 끝난 통상적인 거래로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였다. 교육에 참석한 상담가들은 한 시간이 넘도록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도대체 그 둘 사이에 해서는 안 될 윤리적 금기사항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한국적 문화 속에서 원칙과 공정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개인의 사적관계에 의한 친밀감에 더욱 의존하다 보니 일단 서로에게 당장 주고받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 그것이 사후에 어떤 부작용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의 문제로 미루어 놓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
공정사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계약이 바로 보편적 인권과 평등의 원리를 존중하며 권한의 남용을 예방하는 윤리강령이다. 물론 이것이 헌법으로 규정하는 법적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 사회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인간양심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이 전에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의 규범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대권 후보군중의 단연 선두에 있었던 박근혜 후보는 형제 사랑으로 인한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서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 당시 정치 비자금혐의로 체포된 모 저축은행 대표와 막역한 친구사이인 자신의 동생인 지만 씨와 그 은행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지만 씨의 부인에 대해서 비호하는 듯 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박지만 씨의 삼화저축은행 로비 연루 의혹에 대해 "본인이 아니라고 밝혔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발언 하면서 우리의 통념상 정치적 후광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녀로서는 뭔가 좋지 못한 또 하나의 게이트로 부각될 수도 있는 이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려 하는 그녀의 리더십과 윤리의식에 어쩐지 신뢰감이 없어 보였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한국의 정치리더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가장 근본적인 까닭은 바로 우리 민족을 공정한 사회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바른생활의 리더십이 진정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사회가 공정사회의 룰을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윤리의식이 바로서야 하며 동시에 권력의 힘을 남용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할 뿐 소외된 계층과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위선자들을 선거를 통해서 철저하게 걸러내야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한순간의 실수와 친족들의 부화내동으로 인해서 정치적 생명에 빨간불이 켜질 때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고 토로한다. 어떤 이는 자살도 하지 않는가? 사람이기에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윤리적 규범은 바로 그런 실책까지도 포함을 하는 매우 광범위한 우리사회 공인들의 책임의식이다. 자꾸만 자신의 특수한 상황만을 이해해 달라고 주장할 때 설사 사람들이 백번 양보해서 없었던 걸로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이미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인간심리의 기본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윤리는 무섭고도 추상같은 하나님의 양심과도 같은 것이다. 나는 조그만 시골의 상담가와 클라이언트인 나무꾼과의 상거래에 대한 예를 통해서 자칫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려 했던 좋은 사이의 인심 좋은 거래로 받아 들일 뻔 했던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의 원리가 상대적으로 위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압력과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인간의 심리를 인정하면서 혹여나 내가 어찌 이 세상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깨닫게 되는 순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