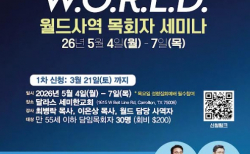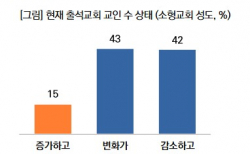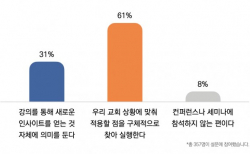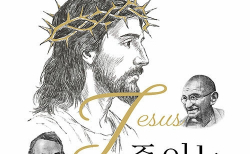거리의 전차길 과 電車 電線줄로
언덕 오래 된 건물과 집채들 비껴선 실루엣 안에, 돌아 서는 광장
몇 골목을 허술하게 벗어나왔는가
서쪽 하늘 가 높이 벽돌 성터 비슷이
붉은 지붕 높다랗게. 뻗어 나간 언덕을 바라보다가
허름한 지하도 건너서부터는
허물어진 옛 都城 안, 갈라진 언덕 돌길에 오른다.
예전에야 의젓하게, 한 몫을 해 낸 집채들일 텐데
한 쪽 높은 지붕들이
바래인 오랜 거미 줄 걸친 듯 벽들이 뭉텅뭉텅 떨어져 나가고
벽 칠들은 군데 군대 살 떨어져 나간, 속살이 비치는 데
건물들로 왜 저리도 방치되어 있을 가
혼자서 라면 한 낮인데도, 머리털 끝이 서질 만큼 음산한 골목 거리
거리 속 굴 길을 지내 쳐 가면서
내 머리 안에는 꽤나 궁상스러워 지게 하는, 짧은 지하도
옛 모습을 흘려 내는, 누런 건물 골목 안을 돌아
희한하게 벽에 붙은 돌 간판에, 프란츠 리스트 란 글자 아래서
소스라친다. 여기 건물 안에서 리스트가!
헝가리언 랍쏘디 광시곡을 연주했을 건물 벽 아래서
내 가슴은 왜 이다지 뚝딱이면서, 심장이 튀는 가
다음 골목에서 또 비슷한 돌 간판 만난다.
모차르트 아마데우스가 연주 하고 갔다는 건물 앞이다
나는 발걸음이 오싹 멈춘다.
귓가에 아마데우스의 진혼곡 레퀴엠이 무겁게 어른거리고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내 심장의 음정 담긴 물무늬 물결
벗어 나온 골목들 중앙 분수 石塔 앞에서,
그리운 사람 얼굴 그림자 비추이는데
우뚝 서, 오른 몇 계단 위에 다시 멈춰 서서야
마틴 루터 회심하기 전의 교회당 앞임을 알아차렸다
교회당 옆 기둥에 새겨 진 어느 이름 높은 분의 무덤일 뿐 아니라
교회당 예배 실 돌바닥에도 또 하나의 명가 의 무덤은
흑 대리석 반짝이게 묵직이 덮여 뉘어 있구나.
뒷방 좁은 굴천장 계단 위에 돌아 오르자
하이든이 사용하였던 누런 빛깔 엇갈린 악보 색 오선지,
백년이 넘은 한 쪽 구석이 부식해 나간 고서 몇 권,
마틴 루터가 걸쳤다는 허름한 옷가지들과 圖書具들이
왜 나의 가슴 속으로 스스로 파고 들어와서,
소리 없는 이야기들로 차곡차곡 쌓이는가.
문득 문득 마음을 멈추게 하는
숙연하게 떠오르는 숱한 이야기의 줄기줄기
온 몸 속에서 핏줄이 서 오는 듯
어쩌지 못하는 마음 水波의 요동을 일으켜서
발 머뭇거리게 하고
허전하게 내 그림자만을 번복하면서
자꾸만 작게 또 작게 잦으려들게 하는 내 뒷걸음질로
옴짝 못하게 서 있을 이 멈춤을
아, 어찌 어찌하랴
살아 있는 歷史는 한 없이 우리를 부끄럽게도 만들어 놓고,
때 따라서는, 얼굴 가리며 등을 밀쳐내 주는
뜨거운 용기로도 세워놓아 주는 법
두 가지로 합리하게 뭉쳐내, 찰흙 비벼낼 수 있다면
돋우어 헤엄쳐 온 이 세월 위에
마음 바닥으로부터 굳게 뿌리 내리고 싶었던
꿈 그려오던 形體의 다듬어진 形象 하나 비벼 세울,
또 다시 그런 나의 아침을 열려져 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닐 가.
 | |
어디서나 인간 역사는 시대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괘적(掛積)을 통하여 역사 구석구석 마다에 걸쳐, 인간 손에 의하여 번듯하게 여기저기 걸쳐져 있게 만들어 놓여지는 것임을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서사시로 때로는 산문, 또는 시로 때로는 저명한 악성들의 오선지 촉필(觸筆)에서, 때로는 그리고 번듯한 교량(橋梁) 또는 꼭 있어야 할 자리의 건축구조물로_ 그리고 이 造形들의 始作點은 어느 한 인간의 마음자리에서부터 사실은 터져오기 시작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브라티슬라바_ 허스름한 도시에서 오히려 마음 닿아지게 얻어지는 도시 향(都市鄕)은 富饒에서 오는 화려한 역사가 아니라, 가난에서도 지켜져 내려오는, 그리고 빼앗겨지지도 않는 그 삶의 모양새를 묻어나게 하는 허스름한 도시의 맛이었습니다. 거기에 <흐란츠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모챠르트>가 음악을 흘려놓고 간 자리로,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향수를 골목에다가 부어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색이 잔뜩 묻어있는 높다랗이 루터교회당 안은 역시 육중한 그분의 사제복 발걸음 스치는 소리로 내 귀에는 여전히 들려 왔습니다. 그분의 스치는 옷 깃 소리마다 속에서 발로(發露)하는 改革의 꿈틀이는 목소리가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마음 아프게, 그분이 사용하였던 옷가지, 책자, 서류함들 등에 관하여는 촬영금지여서 영상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한 인간이 이 땅 위에서 땅을 헤집고 지나가는 자리에 반드시 그 그림자가 서려 남겨지게 됩니다. 이 브라티슬라바 거리_ 깨어져 나간 건물의 벽 속살이 뜯어져 내린 그대로 또 그냥 방치해 둔 이 도시모습에서도 마음의 정은 묻어나지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왜 말끔하게 치장된 오늘의 서울 명동 거리나 충정로 거리 속에서도, 나는 육이오 직후의 허물어져, 연기 풀풀 피어오르는 전쟁터의 건물 벽 잿더미를 연상시켜 내게 하며, 아니 더 그 이전, 해방 맞은 후의 소위 본정통 거리 진 고개를 겹쳐 생각해 내게 되군 하는 그 아픔, 정 과 맛, 그런 이야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슨 내 그림자 자국을 내 꿈트리는 자리에 새겨 남겨놓아가고 있는지, 나의 무게를 담고 선 이 자리를, 비켜서서 스스로 눈여겨 되짚어 봅니다. 내 무게 자국이 이 자리에 추(醜)함으로 새겨 놓여져 있을까요. 아름다움으로 비쳐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