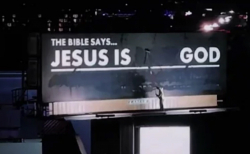<예수, 한국사회에 답하다(새물결플러스)> 등을 쓰며 활발히 활동 중인 차정식 박사(한일장신대)가 기독출판 세계화의 ‘어려움’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야기했다.
온라인상에서 한국책의 세계화를 염두에 둔 국내 저자들의 무신경과 관심 부재, 세계 시장에 알릴 만한 글의 주제와 소재의 대중성, 글쓰기 역량에서 드러난 취약한 수준 등이 이유로 거론되자, 차 박사는 ‘한국책의 세계화가 어려운 진짜 이유’로 그 논의를 넓혔다.
차정식 박사는 첫번째 이유로 ‘한글의 어휘와 통사의 문제’를 제시했다.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은 정평이 나 있지만, 한글 문장에는 ‘수식어’가 많은 편이라 직역할 경우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차 박사는 “부족한 어휘들은 어려운 한자어를 재생하고 죽어버린 순우리말을 복원하는 대안이 있지만, 낯선 순우리말과 난해한 한자어로 뒤범벅된 문장들은 대중의 독서시장에 편입되기도 전에 고사할 운명에 처하거나 그 이전에 이런 책을 출간해줄 만큼 담대한 국내 출판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것저것 다 빼면 빈곤한 대중적 어휘만 남게 된다”며 “가령 ‘말하다’, ‘언급하다’ 등으로 ‘tell’, ‘talk’, ‘speak’, ‘say’, ‘utter’, ‘articulate’ 등의 뉘앙스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두번째로는 “숱하게 지적됐지만” 번역 문제다. 차 박사는 “번역은 또다른 창작으로 그 전문영역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요즘은 국가에서도 전문번역가를 양성하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양적·질적 수준에서 빈약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말 책을 외국어로 제대로 번역하려면 그저 언어가 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국어에 두루 능통하고 양쪽 나라의 문화전통과 일상적 습속에 대한 문학적 표현의 미묘함까지 소화하고 드러낼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 그는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지나친 주관적 의역도 삼가고, 기계적인 직역의 어색함도 극복한 상태에서 미묘한 긴장의 창의성을 포착해낼 줄 알아야 한다”며 “몇 년 전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영역(英譯)돼 대중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신경숙의 고유한 문체를 죽이는 출혈 대신 매끈한 미국식 영어로 가독성을 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번째로는 ‘우리의 축적된 역량’ 문제를 들었다. 활자문화는 케이팝(K-POP)이나 일부 드라마 장르와 달리 오랜 기간 축적되고 숙성돼야만 그 자생적 토양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꽃도 피워낼 수 있는 법”이라며 “문화의 고유한 특수성이 극진해진 자리에 공감받을 만한 보편성의 꽃이 피는 것이 여전히 온당한 이치이고, 그나마 가장 근대적 가치의 문화적 숙성도에서 잘 축적된 곳이 문학 분야이지만 노벨상 경쟁에서 보듯 아직 일본이나 중국에도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
네번째로는 ‘우리의 문화적 국력이 세계 사회에 나타나는 방식과 그 수준’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문화적 국력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냉정한 자가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 박사는 “미국 국민 다수가 아직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데서 보듯, 매스컴에 비친 해외 나라들의 인상은 그들의 대외적 인식 수준에 비례한다”며 “우리가 햄버거와 스파게티를 우리 음식처럼 잘 먹고 즐기는 것과 달리 그들 대다수는 김치와 된장찌개에 여전히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를 여전히 잘 모르고, 우리도 그들을 자세히 모른다”며 “그 상호무지에는 그들이 선도해 온 세계 문화에 끼어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쪽의 취약한 문화적 국력에 좀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차정식 박사는 일본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알려진 ‘가라타니 고진’을 꼽았다. 차 박사에 따르면 가라타니는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을 탐사하는 문학비평가로 공부길을 닦은 뒤 서구철학을 깊고 넓게 배워 자신의 글과 학문을 체계화했는데, 그에 대한 통상적 평가 중 하나는 ‘서구철학을 서구학자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나는 이 평가가 그의 공부가 축적된 자리에서 우러난 자생적 해석의 힘에 대한 경애 어린 찬사로 들린다”며 “그에게는 보편성을 추동하는 일본문화의 특수성, 더 자세하게는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과 풍경이 선사한 정서적 공간이 자리하고 있고, 제 밑바닥 자리를 공들여 닦지 않은 채 세계 보편성의 대양으로 점프해 들어서는 익사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차정식 박사는 “아무리 체제의 장벽이 강고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의 힘”이라며 “천재가 많은 이 땅의 미래에 서로 좀더 인내하고 투자하면서 상부상조한다면 세계 무대에 소개할 국내 저자들 수는 적지 않고, 기독교 책들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려면 전략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저자 개인들의 심오한 겅부, 보다 모험적인 도발과 성찰의 축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우리 기독교계의 대세라는 복음주의 쪽 사람들도 C. S. 루이스, 유진 피터슨, 필립 얀시 좀 덜 읽고 가라타니 고진처럼 수일한(빼어나게 우수한) 국내소설과 시 작품을 좀더 많이 읽어 상상력을 키워나가면 좋겠다”는 도발적 주장을 곁들였다.
그는 “자랑은 못 되지만 나는 계몽적 오만함의 전략으로 저들 책을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았고, 가끔 궁금해서 발췌한 몇 문단을 살펴봐도 내 생각과 비교해 별 심오한 사상이 탐지된 것도 아니었다”며 “그래서인지 저들 책을 엄청나게 열심히 읽어 그네들의 복음주의 버전으로 감염된 이 땅의 ‘짝퉁 복음주의자들’이 더러 불쌍해지기도 했다”고도 했다.
온라인상에서 한국책의 세계화를 염두에 둔 국내 저자들의 무신경과 관심 부재, 세계 시장에 알릴 만한 글의 주제와 소재의 대중성, 글쓰기 역량에서 드러난 취약한 수준 등이 이유로 거론되자, 차 박사는 ‘한국책의 세계화가 어려운 진짜 이유’로 그 논의를 넓혔다.
차정식 박사는 첫번째 이유로 ‘한글의 어휘와 통사의 문제’를 제시했다.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은 정평이 나 있지만, 한글 문장에는 ‘수식어’가 많은 편이라 직역할 경우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차 박사는 “부족한 어휘들은 어려운 한자어를 재생하고 죽어버린 순우리말을 복원하는 대안이 있지만, 낯선 순우리말과 난해한 한자어로 뒤범벅된 문장들은 대중의 독서시장에 편입되기도 전에 고사할 운명에 처하거나 그 이전에 이런 책을 출간해줄 만큼 담대한 국내 출판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것저것 다 빼면 빈곤한 대중적 어휘만 남게 된다”며 “가령 ‘말하다’, ‘언급하다’ 등으로 ‘tell’, ‘talk’, ‘speak’, ‘say’, ‘utter’, ‘articulate’ 등의 뉘앙스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두번째로는 “숱하게 지적됐지만” 번역 문제다. 차 박사는 “번역은 또다른 창작으로 그 전문영역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요즘은 국가에서도 전문번역가를 양성하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양적·질적 수준에서 빈약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말 책을 외국어로 제대로 번역하려면 그저 언어가 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국어에 두루 능통하고 양쪽 나라의 문화전통과 일상적 습속에 대한 문학적 표현의 미묘함까지 소화하고 드러낼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 그는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지나친 주관적 의역도 삼가고, 기계적인 직역의 어색함도 극복한 상태에서 미묘한 긴장의 창의성을 포착해낼 줄 알아야 한다”며 “몇 년 전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영역(英譯)돼 대중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신경숙의 고유한 문체를 죽이는 출혈 대신 매끈한 미국식 영어로 가독성을 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번째로는 ‘우리의 축적된 역량’ 문제를 들었다. 활자문화는 케이팝(K-POP)이나 일부 드라마 장르와 달리 오랜 기간 축적되고 숙성돼야만 그 자생적 토양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꽃도 피워낼 수 있는 법”이라며 “문화의 고유한 특수성이 극진해진 자리에 공감받을 만한 보편성의 꽃이 피는 것이 여전히 온당한 이치이고, 그나마 가장 근대적 가치의 문화적 숙성도에서 잘 축적된 곳이 문학 분야이지만 노벨상 경쟁에서 보듯 아직 일본이나 중국에도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
네번째로는 ‘우리의 문화적 국력이 세계 사회에 나타나는 방식과 그 수준’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문화적 국력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냉정한 자가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 박사는 “미국 국민 다수가 아직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데서 보듯, 매스컴에 비친 해외 나라들의 인상은 그들의 대외적 인식 수준에 비례한다”며 “우리가 햄버거와 스파게티를 우리 음식처럼 잘 먹고 즐기는 것과 달리 그들 대다수는 김치와 된장찌개에 여전히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를 여전히 잘 모르고, 우리도 그들을 자세히 모른다”며 “그 상호무지에는 그들이 선도해 온 세계 문화에 끼어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쪽의 취약한 문화적 국력에 좀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차정식 박사는 일본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알려진 ‘가라타니 고진’을 꼽았다. 차 박사에 따르면 가라타니는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을 탐사하는 문학비평가로 공부길을 닦은 뒤 서구철학을 깊고 넓게 배워 자신의 글과 학문을 체계화했는데, 그에 대한 통상적 평가 중 하나는 ‘서구철학을 서구학자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나는 이 평가가 그의 공부가 축적된 자리에서 우러난 자생적 해석의 힘에 대한 경애 어린 찬사로 들린다”며 “그에게는 보편성을 추동하는 일본문화의 특수성, 더 자세하게는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과 풍경이 선사한 정서적 공간이 자리하고 있고, 제 밑바닥 자리를 공들여 닦지 않은 채 세계 보편성의 대양으로 점프해 들어서는 익사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차정식 박사는 “아무리 체제의 장벽이 강고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의 힘”이라며 “천재가 많은 이 땅의 미래에 서로 좀더 인내하고 투자하면서 상부상조한다면 세계 무대에 소개할 국내 저자들 수는 적지 않고, 기독교 책들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려면 전략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저자 개인들의 심오한 겅부, 보다 모험적인 도발과 성찰의 축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우리 기독교계의 대세라는 복음주의 쪽 사람들도 C. S. 루이스, 유진 피터슨, 필립 얀시 좀 덜 읽고 가라타니 고진처럼 수일한(빼어나게 우수한) 국내소설과 시 작품을 좀더 많이 읽어 상상력을 키워나가면 좋겠다”는 도발적 주장을 곁들였다.
그는 “자랑은 못 되지만 나는 계몽적 오만함의 전략으로 저들 책을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았고, 가끔 궁금해서 발췌한 몇 문단을 살펴봐도 내 생각과 비교해 별 심오한 사상이 탐지된 것도 아니었다”며 “그래서인지 저들 책을 엄청나게 열심히 읽어 그네들의 복음주의 버전으로 감염된 이 땅의 ‘짝퉁 복음주의자들’이 더러 불쌍해지기도 했다”고도 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