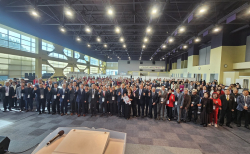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뉴욕=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사우스 센트럴 지역은 한때 가난한 흑인들의 분노를 상징했다.
1992년 4월29일 이른바 `로드니 킹' 사건에서 촉발돼 로스앤젤레스를 일주일 가까이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흑인폭동의 진원지가 바로 이곳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사우스 센트럴의 `얼굴'은 많이 변했다. 흑인들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여겨졌던 이곳에 중남미 이민자들이 대거 정착하면서 흑인을 능가하는 주류 인구로 부상한 것이다.
20년 전 로스앤젤레스 흑인문화의 중심지였던 이곳 거리에서는 이제 스페인어가 대세로 굳어졌다.
흑인 가게의 주인은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인으로 대체됐다. 전설적인 재즈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던 술집은 중남미의 약초가게로 간판이 바뀌었다.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흑인이 사우스 센트럴 지역 인구의 절반이었으나 지금은 히스패닉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약 20평방마일 정도인 이곳의 흑인 인구는 1990년과 비교해 8만명이 줄었다.
사실 이 지역의 공식 명칭도 시의회가 2003년 `센트럴'을 삭제키로 하면서 `사우스 LA'로 개명됐다.
캘리포니아주립대의 라파엘 소넨세인 교수(인종정치학)는 "로스앤젤레스 역사상 이런 인구 변화는 처음"이라며 "이는 흑인공동체의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인구 변화는 폭동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는게 정설이다. 당시 폭동에 연루돼 체포된 용의자의 절반이 히스패닉이었다는 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문제는 지명과 인종 분포가 바뀐 지금까지 폭동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기꺼이 일을 한다.
간선도로를 따라 즐비한 공터는 이 지역에 대한 재건 약속이 2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높이 올라간 새로운 건물은 대부분 개인이 아닌 정부나 교회 등 비영리 기관이 주도한 것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범죄율은 낮지만 고등학교의 퇴학률은 도무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도시를 가득 메운 주류 전문점은 예전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대중교통 부족과 비위생적인 식품에 대한 불만이 높다.
수십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흑인들에게 이는 단지 `잃어버린 역사'일 뿐이다. 그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보수를 받고 공사장 일자리에 뛰어드는 히스패닉계 불법 이민자들을 향해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20년 전과 같은 사회 불안의 씨앗이 수면 아래에 잠복하고 있는 셈이다. 흑인 부동산 개발업자인 대니 베이크웰은 "우리는 히스패닉이 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취직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어디서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곳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곳에 살고 있고 그들을 환영한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베이크웰은 최근 흑인을 고용하지 않은 공사장의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의 이런 발언은 양극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언제든 20년 전과 같은 흑인폭동이 재발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LA폭동 = 1992년 4월29일부터 5월4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흑인폭동 사건이다.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구타한 4명의 백인 경찰관이 무죄판결을 받자 흑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폭력과 방화, 약탈, 살인을 자행했다. 한인타운도 습격당했고 교포 이재성(당시 18세)씨가 흑인들의 총격에 희생됐다.
이 사건은 미국의 사회구조가 안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폭발이었다. 흑인사회의 계층분화가 진행되면서 중산층 흑인이 늘어나는 반면 대도시 슬럼가에 사는 극빈층 흑인도 늘어나고 있던 것이 그 배경이다.
흑인 거주지 사우스 센트럴 지역을 포함해 로스앤젤레스에서 피해를 본 업소가 1만여개였고 이중 2천800개가 한인업소였다.
이 폭동으로 55명이 사망하고 2천383명이 부상했으며 1만3천379명이 체포됐다. 피해액은 총 7억2천만달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