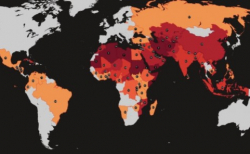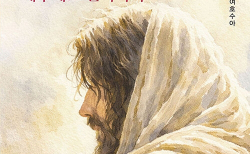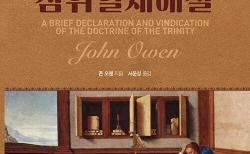김정일 사망 이후 주민들이 당국의 지나친 감시와 압력으로 억지로 통곡하다 지쳤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억지 눈물에 지친 주민들은 열흘에 걸쳐 이뤄진 장례가 빨리 치뤄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들은 주민들이 “이 지긋지긋한 날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추모행사에 강제로 끌려나오고 있으며, 함경북도 한 지역의 경우 공장과 기업소별로 정해진 시간대에 하루 두 번씩 김정숙 동상을 찾아가 애도해야 하는 실정이다. 돌아오는 길에 시 연구실에 들러 한 시간씩 또 울어줘야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은 아침 시간에 추모객들이 몰려 혼잡을 빚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조문식장이 텅 비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구역별로 조문시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하루에 두 번씩 통곡하는 날들이 반복되니 조문식장에 가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울지 않으면 보위원들이 불러내기 때문에 우는 흉내라도 억지로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조문식장 안에서는 10명 이상의 보위원들이 지켜보며 주민들을 감시하고, 울지 않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 “조문이 불성실하다”고 협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러낸 이들의 경우 이름과 직장, 주소를 확인하고 있어 주민들은 ‘공포의 조문’을 하고 있는 셈.
주민들은 “김일성 사망 때도 장례식이 끝난 뒤 사상투쟁 형식으로 ‘애도기간 총화’가 있었는데, 조문식장에서 울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올라 혹독한 비판 대상이 됐다”면서도 “김일성 장례 때도 따로 조문식장을 차려놓고 억지로 울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