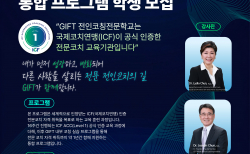한 두 달 전쯤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한 도시에 사는 80대 노부부가 하루를 사이에 두고 숨진 일이 있었다. 사람이 낳고 죽는 것은 세상이 이치라 그리 놀라울 것이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숨진 방법이 나에게 큰 도전을 주었었다.
그들은 비록 질병이 있었지만 아직 죽기에는 이른 날이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더 이상 추한 모습이 아닌 그냥 이대로 함께 부부가 죽고 싶은 나머지 “죽을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사용한 것이다. 즉, 노부부는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절식”선언을 해 버린 것이다.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양로원과 가족들을 발칵 뒤집어질 수 밖에.
하소연도 해보고 달래도 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절식”은 자신들의 선택이며 양로원에는 법적으로 하등의 잘못이 없다는 문서에 사인을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 평온하게 (?) 두 부부가 하루 차이로 세상을 뜨고야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 절기에 이 신문기사가 다시 나의 뇌리를 때리고 있다. 별난 항목과 명목으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인간이 인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가.
이미 동물이나 인간복제까지 가능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 속에서, 목사이자 목회상담가로서 곤혹감을 감출 수 없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핵심은 ‘생명”이다. 죄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어 나셨으며,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을 포기하셨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생명을 “부여”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지 결코 인간의 권리일 수 없다.
아무리 지금 내 모습이 추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럽고 아프다하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은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파멸의 길을 재촉할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바벨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름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보좌의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위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우리 모두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이어야한다. 그러나, 갈 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팽배해져만 간다면,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는 더욱 퇴색해져만 갈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분명히 보고 있는 것만 같아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인간의 추한 꼴을 감추고자 “인간의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하기 보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추함과 아픔과 질병속에서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면 아기 예수 나신 성탄절은 더욱 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그들은 비록 질병이 있었지만 아직 죽기에는 이른 날이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더 이상 추한 모습이 아닌 그냥 이대로 함께 부부가 죽고 싶은 나머지 “죽을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사용한 것이다. 즉, 노부부는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절식”선언을 해 버린 것이다.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양로원과 가족들을 발칵 뒤집어질 수 밖에.
하소연도 해보고 달래도 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절식”은 자신들의 선택이며 양로원에는 법적으로 하등의 잘못이 없다는 문서에 사인을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 평온하게 (?) 두 부부가 하루 차이로 세상을 뜨고야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 절기에 이 신문기사가 다시 나의 뇌리를 때리고 있다. 별난 항목과 명목으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인간이 인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가.
이미 동물이나 인간복제까지 가능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 속에서, 목사이자 목회상담가로서 곤혹감을 감출 수 없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핵심은 ‘생명”이다. 죄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어 나셨으며,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을 포기하셨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생명을 “부여”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지 결코 인간의 권리일 수 없다.
아무리 지금 내 모습이 추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럽고 아프다하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은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파멸의 길을 재촉할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바벨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름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보좌의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위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우리 모두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이어야한다. 그러나, 갈 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팽배해져만 간다면,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는 더욱 퇴색해져만 갈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분명히 보고 있는 것만 같아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인간의 추한 꼴을 감추고자 “인간의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하기 보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추함과 아픔과 질병속에서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면 아기 예수 나신 성탄절은 더욱 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