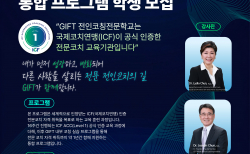시인 도종환은 가을 비 속에서 요절한 아내의 환영(幻影)을 보고 애틋한 그리움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메밀꽃 지는 고개를 넘어오며 당신을 생각했지.
감잎이 바람에 끌리는 소리를 들으며 당신을 생각했지.
차가와 오는 시간 속으로 끌리어 나와 홀로 새는 방안에
어제는 쥐들이 새끼를 치고 가는비 굵게 스며 천정을 적시었지
올해는 시월까지 장마비 길어
당신을 누이고 다져 밟은 발소리 아래로 빗줄기 오래오래 지나갔으리.
머리맡에 따라와 우는 벌레소리 달 없는 밤에도 깊이깊이 땅끝을 두드렸으리.
얼마나 많은 바람과 비에 씻긴 뒤에야
흙 속에서도 고요히 이승 저승 넘나들고
바람 속에서도 너울너울 다시 만날 수 잇는 걸까.
어느 하늘 어느 구름 아래 다시 만날 수 잇는 걸까. ”
도종환처럼 애틋한 그리움의 시심(詩心)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내게도 시월 비속으로 그리운 옛 사람들이 영화처럼 나타났다가는 스러져 버리고는 한다.
마치 옛 시인이 노래한바 “ 소리 없이 나린비가 낙수되어 떨어지니 오마지 않던 님이 자꾸만 기다려져 열린듯 닫힌문으로 눈이 자꾸가더라 ”라는 싯귀와 절로 맞는 마음인 까닭이다. 어떤 네티즌이 짓궂게도 이런 댓글를 달아 그리움에 더 부채질하였다.
“바람의 장난으로 열리는 문에도 공연히 자꾸만 가슴이 뛰어와 언제야 님 생각 접을 수 있을까 잊을듯 한 맘만이 남아있더라 ” 공연히 자꾸 뛰는 가슴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이 시인처럼 오늘 내리는 시월 비는 마음을 진정 시킬수 없도록 추억의 언덕을 허위적 거리며 오르게 한다.
아무리 생각하려해도 그려지지 않는 이웃 소녀의 티없이 맑은 웃음소리가 공명되어 가슴을 훓고 지나간다. 골목길에서 언제나 만나게 되던 웃니 고운 여학생이 다가온다.
미쳐 건네 주지 못한 빛바랜 연서가 짓궂은 갈 바람에 날라가 버린다. 그 속으로 비로서 배시시 웃어주니 더욱 내 마음에 눈물이 시월비 되어 흘러 내린다.
장발머리 그때 그 갈 비도 영혼의 방황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만약 즐겨 찾던 음악다방을 지금 찾을 수 만 있다면 한편 구석에 흘러 내린 흥건한 빗물 자국 속에 내 젊은 날의 방황의 이야기를 주저리 주저리 엮어낼 수 있으리라!
지금은 장로님이 된 친구 성태군이 실연한 여인에게 무엇인가 열심히 다독이며 위로하던 그 다방에서 따듯한 홍차 한잔 하거나, 시흥 숲길 따라 곱게 져버린 단풍잎을 적시는 시월 비를 맞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뜻 상념에서 깨어나니 포도(鋪道)와 내 마음에 추적 추적 시월비는 끊임없이 내린다.
“메밀꽃 지는 고개를 넘어오며 당신을 생각했지.
감잎이 바람에 끌리는 소리를 들으며 당신을 생각했지.
차가와 오는 시간 속으로 끌리어 나와 홀로 새는 방안에
어제는 쥐들이 새끼를 치고 가는비 굵게 스며 천정을 적시었지
올해는 시월까지 장마비 길어
당신을 누이고 다져 밟은 발소리 아래로 빗줄기 오래오래 지나갔으리.
머리맡에 따라와 우는 벌레소리 달 없는 밤에도 깊이깊이 땅끝을 두드렸으리.
얼마나 많은 바람과 비에 씻긴 뒤에야
흙 속에서도 고요히 이승 저승 넘나들고
바람 속에서도 너울너울 다시 만날 수 잇는 걸까.
어느 하늘 어느 구름 아래 다시 만날 수 잇는 걸까. ”
도종환처럼 애틋한 그리움의 시심(詩心)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내게도 시월 비속으로 그리운 옛 사람들이 영화처럼 나타났다가는 스러져 버리고는 한다.
마치 옛 시인이 노래한바 “ 소리 없이 나린비가 낙수되어 떨어지니 오마지 않던 님이 자꾸만 기다려져 열린듯 닫힌문으로 눈이 자꾸가더라 ”라는 싯귀와 절로 맞는 마음인 까닭이다. 어떤 네티즌이 짓궂게도 이런 댓글를 달아 그리움에 더 부채질하였다.
“바람의 장난으로 열리는 문에도 공연히 자꾸만 가슴이 뛰어와 언제야 님 생각 접을 수 있을까 잊을듯 한 맘만이 남아있더라 ” 공연히 자꾸 뛰는 가슴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이 시인처럼 오늘 내리는 시월 비는 마음을 진정 시킬수 없도록 추억의 언덕을 허위적 거리며 오르게 한다.
아무리 생각하려해도 그려지지 않는 이웃 소녀의 티없이 맑은 웃음소리가 공명되어 가슴을 훓고 지나간다. 골목길에서 언제나 만나게 되던 웃니 고운 여학생이 다가온다.
미쳐 건네 주지 못한 빛바랜 연서가 짓궂은 갈 바람에 날라가 버린다. 그 속으로 비로서 배시시 웃어주니 더욱 내 마음에 눈물이 시월비 되어 흘러 내린다.
장발머리 그때 그 갈 비도 영혼의 방황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만약 즐겨 찾던 음악다방을 지금 찾을 수 만 있다면 한편 구석에 흘러 내린 흥건한 빗물 자국 속에 내 젊은 날의 방황의 이야기를 주저리 주저리 엮어낼 수 있으리라!
지금은 장로님이 된 친구 성태군이 실연한 여인에게 무엇인가 열심히 다독이며 위로하던 그 다방에서 따듯한 홍차 한잔 하거나, 시흥 숲길 따라 곱게 져버린 단풍잎을 적시는 시월 비를 맞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뜻 상념에서 깨어나니 포도(鋪道)와 내 마음에 추적 추적 시월비는 끊임없이 내린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