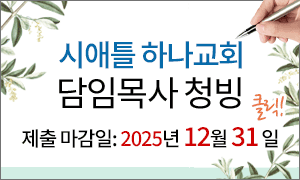1970년대 초반에 필자의 대학 스승이셨던 양승달 교수님이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들에게 신랑감의 직업별 선호도를 조사했었는데, 목사가 랭킹 21위로 이발사 다음이었다고 하였다. 결국 목사에게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과연 그 선호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굼하기만 하다. 모처럼 친구들이 모이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필라델피아에 갔었다. 모처럼 목사친구들을 만나 그동안 목회선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로 밤이 깊어 가는 것도 잊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초등학교 5학년인 친구 아들이 리빙룸에서 놀고 있길래 슬그머니 물어 보았다. “너는 앞으로 자라서 무엇이 될거니?”하고. 그랬더니 그녀석이 서슴지 않고 대답하기를, “나는 집사가 될래요”한다. 하도 신기해서 되물어 보았다. “얘, 넌 왜 하필이면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되지 않고 집사가 되겠다고 그러니?” 그녀석의 대답이 신통하다. “목사는 싫어요, 아빠를 보니 돈도 벌지 못하면서 항상 바쁘기만 해요.” 참으로 목사는 이화대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목사 아들도 싫어하게 되어버렸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목사란?”타이틀로 작문을 해 보라고 하였더니, 대뜸“목사는 동네북이라”라고 써 내었다. 왠지 씁쓸한 느낌이다. 과연 오늘날 목사는 동네북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도 그럴듯하다. 너도 나도 목사에 대해서는 세금도 내지 않고 마음대로 두들겨대는 풍조가 이민사회에서는 만연되어 있는 것 같으니 말이다.
키가 크면, ‘키만 확대장성같이 크지 어디 실속이 있어야지’하고, 반대로 키가 작으면, ‘남들 클 때 뭐하다가 키도 하나 크지 못하고 땅에 붙어서 매사 하는 일이 그렇게 능통성이 없고 답답한지...’하면서 남의 작은 키에 능통성까지 들먹거리면서 빈정된다. 살이 잘쪄서 뚱뚱하면, ‘양들은 다 굶겨 놓고 자기만 먹었나?’하고, 반대로 날씬하게 말라 있으면, ‘자기 몸 하나도 먹이지 못해서 삐쩍말라 있으면서 양들을 어떻게 살지우겠는고’라고 중얼거린다.
어쩌다 설교가 길면, ‘자기 도치에 빠져서 날세는 줄 모른다’하고, 반대로 설교가 짧으면, ‘그 실력에 뭐 더 나올게 있겠느냐?’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과연 목사는 동네북인것도 같다. 이 사람 저 사람 마음대로 두들기고 가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민사회에 이와 같은 동네북이 없으면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아마도 부부싸움이 더 잦아지던지? 병원이 더욱 분빌 것 같다. 마음대로 두드릴 대상이 없으니 결국 그 대상이 부부가 되던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여 병이 나도 잔뜩 났을테니 말이다.
낙엽이 가을을 대변하듯 스산한 바람에 나부끼는 창가를 응시해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보면 아롱진 이민목회의 슬프고 기쁜 추억들이 낙엽만큼이나 질서 없이 머리를 스친다. 한 마디의 불평도 하지 못한 채 어렵고 굿은 일들을 나 자신의 일처럼 해결해 주고도 웃으며 돌아서 오던 그 숱한 발자치들...
수 없는 욕과 누명 같은 애매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같이 욕하고 변명하지 못 한 채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죽어가야 했던 순간들이 아픈 살이 되어 박힌다. 주일이면 친 형제들보다 더 반기며 맞아 주었던 소중하던 그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배신자처럼 돌아 설 때면 먼 산을 바라보며 차라리 눈물을 삼켜야 했던 순간들도 없지 않았다.
썰렁하게 비어 있는 빈자리를 바라보면 자신의 무능을 한 겨울의 눈보라보다 더 차갑게 느껴야 했었고, 바람에 성전 뒷문만 열려도 새로운 성도 하나 나타난 줄 알고 목을 내밀며 기대해 보던 안타까운 순간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오면 자신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팠고, 슬픔 속에 있는 자를 만나 상담하고 오면 자신이 슬픈 사람처럼 되어 외로움에 함께 젖어들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가슴을 목사보다 더 가진 자가 누가 또 이 이민사회에 있단 말인가?
삭막한 이민생활에서 돌처럼 굳어 있고, 사막처럼 메말라 있는 영혼을 두들겨 주고, 좌절한 삶에 오아시스처럼 생수를 공급하여 주기를 자신의 삶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은 바로 목사일 것이다. 그런데도 목사는 여전히 동네의 북이란 말인가?
필자는 작년 여름에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을 듣다가 가슴에 무엇이 날라와 못처럼 박히는 전율을 느낀 때가 있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해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던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목사님은 눈물에 목이 매이고 말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장로님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실 때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다시 깨닫고 새롭게 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런 분이 목사님이시다.
아무리 목사를 동네북처럼 두들겨도 목사는 그 영혼을 위해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그 영혼이 바르게 서게 되면 그렇게 고통을 주던 옛 일은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새롭게 된 그 기쁨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죽는 날 까지 동네북이 되어 그저 맞기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도 내가 맞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된다면 또 맞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북이 서야 할 그 동네로 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목사들의 삶이다. 어차피 땅의 것으로 만족하기를 포기한 몸이기에, 어차피 저 하늘나라에 상급을 바라보며 이 길을 들어섰기에 그렇게 동네북이 되어 오늘도 말없이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생각 없이 때리기만 하다간 큰코다치게 되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보살피고 계시니까...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과연 그 선호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굼하기만 하다. 모처럼 친구들이 모이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필라델피아에 갔었다. 모처럼 목사친구들을 만나 그동안 목회선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로 밤이 깊어 가는 것도 잊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초등학교 5학년인 친구 아들이 리빙룸에서 놀고 있길래 슬그머니 물어 보았다. “너는 앞으로 자라서 무엇이 될거니?”하고. 그랬더니 그녀석이 서슴지 않고 대답하기를, “나는 집사가 될래요”한다. 하도 신기해서 되물어 보았다. “얘, 넌 왜 하필이면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되지 않고 집사가 되겠다고 그러니?” 그녀석의 대답이 신통하다. “목사는 싫어요, 아빠를 보니 돈도 벌지 못하면서 항상 바쁘기만 해요.” 참으로 목사는 이화대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목사 아들도 싫어하게 되어버렸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목사란?”타이틀로 작문을 해 보라고 하였더니, 대뜸“목사는 동네북이라”라고 써 내었다. 왠지 씁쓸한 느낌이다. 과연 오늘날 목사는 동네북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도 그럴듯하다. 너도 나도 목사에 대해서는 세금도 내지 않고 마음대로 두들겨대는 풍조가 이민사회에서는 만연되어 있는 것 같으니 말이다.
키가 크면, ‘키만 확대장성같이 크지 어디 실속이 있어야지’하고, 반대로 키가 작으면, ‘남들 클 때 뭐하다가 키도 하나 크지 못하고 땅에 붙어서 매사 하는 일이 그렇게 능통성이 없고 답답한지...’하면서 남의 작은 키에 능통성까지 들먹거리면서 빈정된다. 살이 잘쪄서 뚱뚱하면, ‘양들은 다 굶겨 놓고 자기만 먹었나?’하고, 반대로 날씬하게 말라 있으면, ‘자기 몸 하나도 먹이지 못해서 삐쩍말라 있으면서 양들을 어떻게 살지우겠는고’라고 중얼거린다.
어쩌다 설교가 길면, ‘자기 도치에 빠져서 날세는 줄 모른다’하고, 반대로 설교가 짧으면, ‘그 실력에 뭐 더 나올게 있겠느냐?’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과연 목사는 동네북인것도 같다. 이 사람 저 사람 마음대로 두들기고 가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민사회에 이와 같은 동네북이 없으면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아마도 부부싸움이 더 잦아지던지? 병원이 더욱 분빌 것 같다. 마음대로 두드릴 대상이 없으니 결국 그 대상이 부부가 되던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여 병이 나도 잔뜩 났을테니 말이다.
낙엽이 가을을 대변하듯 스산한 바람에 나부끼는 창가를 응시해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보면 아롱진 이민목회의 슬프고 기쁜 추억들이 낙엽만큼이나 질서 없이 머리를 스친다. 한 마디의 불평도 하지 못한 채 어렵고 굿은 일들을 나 자신의 일처럼 해결해 주고도 웃으며 돌아서 오던 그 숱한 발자치들...
수 없는 욕과 누명 같은 애매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같이 욕하고 변명하지 못 한 채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죽어가야 했던 순간들이 아픈 살이 되어 박힌다. 주일이면 친 형제들보다 더 반기며 맞아 주었던 소중하던 그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배신자처럼 돌아 설 때면 먼 산을 바라보며 차라리 눈물을 삼켜야 했던 순간들도 없지 않았다.
썰렁하게 비어 있는 빈자리를 바라보면 자신의 무능을 한 겨울의 눈보라보다 더 차갑게 느껴야 했었고, 바람에 성전 뒷문만 열려도 새로운 성도 하나 나타난 줄 알고 목을 내밀며 기대해 보던 안타까운 순간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오면 자신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팠고, 슬픔 속에 있는 자를 만나 상담하고 오면 자신이 슬픈 사람처럼 되어 외로움에 함께 젖어들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가슴을 목사보다 더 가진 자가 누가 또 이 이민사회에 있단 말인가?
삭막한 이민생활에서 돌처럼 굳어 있고, 사막처럼 메말라 있는 영혼을 두들겨 주고, 좌절한 삶에 오아시스처럼 생수를 공급하여 주기를 자신의 삶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은 바로 목사일 것이다. 그런데도 목사는 여전히 동네의 북이란 말인가?
필자는 작년 여름에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을 듣다가 가슴에 무엇이 날라와 못처럼 박히는 전율을 느낀 때가 있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해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던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목사님은 눈물에 목이 매이고 말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장로님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실 때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다시 깨닫고 새롭게 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런 분이 목사님이시다.
아무리 목사를 동네북처럼 두들겨도 목사는 그 영혼을 위해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그 영혼이 바르게 서게 되면 그렇게 고통을 주던 옛 일은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새롭게 된 그 기쁨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죽는 날 까지 동네북이 되어 그저 맞기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도 내가 맞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된다면 또 맞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북이 서야 할 그 동네로 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목사들의 삶이다. 어차피 땅의 것으로 만족하기를 포기한 몸이기에, 어차피 저 하늘나라에 상급을 바라보며 이 길을 들어섰기에 그렇게 동네북이 되어 오늘도 말없이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생각 없이 때리기만 하다간 큰코다치게 되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보살피고 계시니까...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